본문내용
고 하였다.『녹문집』권5, 6면
그가 기에 나아가 이를 밝히는 방법을 택한 것은, 그래야만 이기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기에 나아가 이를 말하는 취기상언지(就氣上言之)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기동실(理氣同實), 심성일치(心性一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이기동실의 입장에서 이이의 ‘이통기국설’을 비판하였다. 이기동실의 논리에서 볼 때, 이과 기는 일원처(一原處)에서나 분수처(分殊處)에서 모두 일치된 통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통기국은 이과 기의 동실(同實)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일원처에서는 이에(理通), 분수처에서는 기에(氣局) 치우친 논리로 인식되었다. 임성주는 기존의 이일분수론에 짝하는 기일분수론을 제창하여 이일과 기일을 짝하고, 이분수와 기분수가 짝하는 새로운 이론틀을 제창하였다.
4) 노사 기정진은 임성주와 더불어 주자학자로서 일정한 사승관계 없이 독자적인 궁리와 사색을 통해 학문을 이룩하였다. 그는 이과 기의 관계를 ‘이존기비(理尊氣卑)’, ‘이주기복(理主氣僕)’ 등으로 표현하여 이(理)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이의 ‘기자이(氣自爾:기틀이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나 ‘비유사지(非有使之:시킴이 있는 것이 아니다)’를 비판하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이의 주재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노사집』권12, 23면
또한 그는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情)으로 보지 않고, 이일(理一)과 분수(分殊之理)를 원융(圓融)한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이분원융론에 입각하여 동(同)중에 이(異)가 있고 이(異)중에 동(同)이 있는 것이라 하며 호락양론을 모두 비판하였다. 즉 호론은 이(異)를 주로 하고 동(同)을 무시하였으며, 낙론은 동(同)을 주로 하고, 이(異)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理)를 지극히 높이는 입장에서 그의 학설은 대체로 유리론(唯理論), 이일원론(理一元論)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pp.241~244
<참고문헌>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편,『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예문서원, 2001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한국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0,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정재훈,『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신구문화사, 2008
http://www.toegye.ne.kr
그가 기에 나아가 이를 밝히는 방법을 택한 것은, 그래야만 이기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기에 나아가 이를 말하는 취기상언지(就氣上言之)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기동실(理氣同實), 심성일치(心性一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이기동실의 입장에서 이이의 ‘이통기국설’을 비판하였다. 이기동실의 논리에서 볼 때, 이과 기는 일원처(一原處)에서나 분수처(分殊處)에서 모두 일치된 통일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통기국은 이과 기의 동실(同實)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일원처에서는 이에(理通), 분수처에서는 기에(氣局) 치우친 논리로 인식되었다. 임성주는 기존의 이일분수론에 짝하는 기일분수론을 제창하여 이일과 기일을 짝하고, 이분수와 기분수가 짝하는 새로운 이론틀을 제창하였다.
4) 노사 기정진은 임성주와 더불어 주자학자로서 일정한 사승관계 없이 독자적인 궁리와 사색을 통해 학문을 이룩하였다. 그는 이과 기의 관계를 ‘이존기비(理尊氣卑)’, ‘이주기복(理主氣僕)’ 등으로 표현하여 이(理)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이의 ‘기자이(氣自爾:기틀이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나 ‘비유사지(非有使之:시킴이 있는 것이 아니다)’를 비판하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이연(所以然)으로서의 이의 주재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노사집』권12, 23면
또한 그는 사단과 칠정을 두 개의 정(情)으로 보지 않고, 이일(理一)과 분수(分殊之理)를 원융(圓融)한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이분원융론에 입각하여 동(同)중에 이(異)가 있고 이(異)중에 동(同)이 있는 것이라 하며 호락양론을 모두 비판하였다. 즉 호론은 이(異)를 주로 하고 동(同)을 무시하였으며, 낙론은 동(同)을 주로 하고, 이(異)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理)를 지극히 높이는 입장에서 그의 학설은 대체로 유리론(唯理論), 이일원론(理一元論)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pp.241~244
<참고문헌>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편,『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예문서원, 2001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한국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2000,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정재훈,『조선시대의 학파와 사상』,신구문화사, 2008
http://www.toegye.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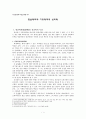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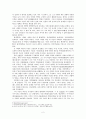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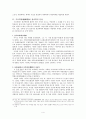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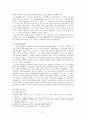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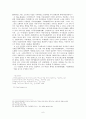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