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트렌센던스
2. 이미테이션 게임
3. 마이너리티 리포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트렌센던스
2. 이미테이션 게임
3. 마이너리티 리포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에서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다.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VR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968년부터이다. 이후 VR은 공각기동대 또는 매틀릭스 등 첨단 기술을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서 그 개념이 발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센서 기술과 실시간 그래픽 처리, 네트워킹 발전 속도가 미치지 못해서 상상 속의 기술로만 존재해야만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와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기기들이 시장에 등장했다.
VR이 특정 디스플레이와 보조 장치를 통해서 100%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AR은 현실과 가상을 믹스하는 기술이다. 해당 영화에서는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해당 증강현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VR보다 이른 시기에 상용화가 되었다.
AR도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발전하면서 수준이 높아졌고,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상이 VR과는 달라졌다. 최근 영상 또는 이미지 등의 레이어를 현실과 합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00% 새로운 세상을 구성하여 보여주는 VR과 다르게 현실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스마트폰과도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하다.
Ⅲ. 결론
카오스이론이나 복잡성 이론을 통해 인공지능의 자아의식 발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곧 마음을 갖는 새 인류가 탄생한다는 뜻으로 윤리 법적 충돌은 물론 인간과 전쟁까지 가능할 수 있다. 자아의식이 생겨난 인공지능이 자기유지와 보호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기적 존재에 대한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누가 더 똑똑하고 빠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공성(空性)을 보지 못하고 색(色)의 관점으로 과학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무아의식이 필요하다. 자아의식이 일어난 것에 대한 회의감이 일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무아를 통찰하고 공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 이타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진화로 인해서 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 지식이 없이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측을 하지 못한 변수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인간이 직접 수행을 해야 할 행위는 줄어들지만, 인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가 없는 인공지능 행동 방식을 규범화를 하고, 기술적인 진화를 이끌 수 있는 창의력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자유의지와 뇌과학 : 상호 인정 투쟁, 박은정, 한국법철학회, 2015
2. 이미테이션 게임, 2015. 02. 17
3.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07. 26
4. 트렌센던스, 2014.05.14
VR이 특정 디스플레이와 보조 장치를 통해서 100% 가상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AR은 현실과 가상을 믹스하는 기술이다. 해당 영화에서는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해당 증강현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VR보다 이른 시기에 상용화가 되었다.
AR도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발전하면서 수준이 높아졌고,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상이 VR과는 달라졌다. 최근 영상 또는 이미지 등의 레이어를 현실과 합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00% 새로운 세상을 구성하여 보여주는 VR과 다르게 현실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스마트폰과도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하다.
Ⅲ. 결론
카오스이론이나 복잡성 이론을 통해 인공지능의 자아의식 발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곧 마음을 갖는 새 인류가 탄생한다는 뜻으로 윤리 법적 충돌은 물론 인간과 전쟁까지 가능할 수 있다. 자아의식이 생겨난 인공지능이 자기유지와 보호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기적 존재에 대한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누가 더 똑똑하고 빠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공성(空性)을 보지 못하고 색(色)의 관점으로 과학을 발전시킨다면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무아의식이 필요하다. 자아의식이 일어난 것에 대한 회의감이 일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무아를 통찰하고 공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 이타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진화로 인해서 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 지식이 없이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측을 하지 못한 변수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인간이 직접 수행을 해야 할 행위는 줄어들지만, 인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의지가 없는 인공지능 행동 방식을 규범화를 하고, 기술적인 진화를 이끌 수 있는 창의력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자유의지와 뇌과학 : 상호 인정 투쟁, 박은정, 한국법철학회, 2015
2. 이미테이션 게임, 2015. 02. 17
3.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07. 26
4. 트렌센던스, 2014.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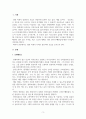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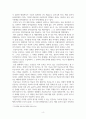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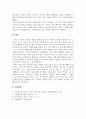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