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의 군사사상에 대한 정치와 전쟁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1)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사상
2) 몰트케의 군사사상
(2) 손자의 전승 사상이 나타나 있는 손자병법 각 편의 문구와 그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의 군사사상에 대한 정치와 전쟁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1)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사상
2) 몰트케의 군사사상
(2) 손자의 전승 사상이 나타나 있는 손자병법 각 편의 문구와 그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에 나타나는 전승 사상 역시 전쟁에 임함에 있어 최고의 방법은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공火攻편에는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히 결정하고, 우량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완전하게 유지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길이다‘라고 하여 전쟁과 불 모두 국가의 생존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으로 명군은 전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뛰어난 장수는 전쟁을 좋게 보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야 함을 뜻한다.
Ⅲ. 결론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는 분명 전쟁에 대한 정치의 역할론에 있어 견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둘 다 전쟁의 개시와 종결이 정치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전쟁에 있어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외교에 실패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는 전쟁의 발생 여부를 쥐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데 클라우제비츠의 경우는 전쟁이 정치의 도구에 불과하여 전쟁 자체가 정치에 종속되어 현장의 군사적 판단과 임무 수행을 의미 없는 행위로 보며 내각에서의 결정과 의결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반면 몰트케는 전쟁의 개전까지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전쟁이 개시된 이후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즉각적인 임무 대처 능력이 전쟁의 양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손자는 전쟁에 대한 병법을 기술하였지만, 최선의 수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가들이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승 사상으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승리하여도 괴멸적인 피해를 받게 되므로 정치가들이 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전승이라고 하였다.
Ⅳ. 참고문헌
1. 김태현, 2012,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에 대한 재인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장형익, 2014, 「독일 군사사상과 제도가 일본 육군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육군군사연구소
3. 나승균, 2010, 「군사사상 측면에서 李舜臣의 孫子兵法 적용 고찰」,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4. 온창일 외, 2006, 『군사사상사』, 황금알
화공火攻편에는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히 결정하고, 우량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완전하게 유지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길이다‘라고 하여 전쟁과 불 모두 국가의 생존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으로 명군은 전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뛰어난 장수는 전쟁을 좋게 보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야 함을 뜻한다.
Ⅲ. 결론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는 분명 전쟁에 대한 정치의 역할론에 있어 견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둘 다 전쟁의 개시와 종결이 정치에 의해 일어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전쟁에 있어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외교에 실패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는 전쟁의 발생 여부를 쥐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데 클라우제비츠의 경우는 전쟁이 정치의 도구에 불과하여 전쟁 자체가 정치에 종속되어 현장의 군사적 판단과 임무 수행을 의미 없는 행위로 보며 내각에서의 결정과 의결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반면 몰트케는 전쟁의 개전까지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전쟁이 개시된 이후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즉각적인 임무 대처 능력이 전쟁의 양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손자는 전쟁에 대한 병법을 기술하였지만, 최선의 수는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가들이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승 사상으로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승리하여도 괴멸적인 피해를 받게 되므로 정치가들이 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전승이라고 하였다.
Ⅳ. 참고문헌
1. 김태현, 2012,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에 대한 재인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장형익, 2014, 「독일 군사사상과 제도가 일본 육군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육군군사연구소
3. 나승균, 2010, 「군사사상 측면에서 李舜臣의 孫子兵法 적용 고찰」,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4. 온창일 외, 2006, 『군사사상사』, 황금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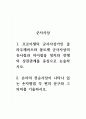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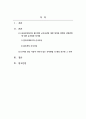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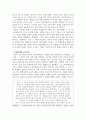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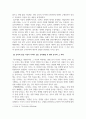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