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감정들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조건이다.
창조물과 빅터가 보여주는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적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적 고통의 극단적 형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창조물처럼 고독하고, 빅터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린다.
메리 셸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비극성을 드러냈다. 인간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독 속에서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연결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이 절망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조물과 빅터의 이야기는 또한 연민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만약 빅터가 처음부터 창조물을 받아들이고 보살폈다면, 만약 인간 사회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모든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한 괴물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태어난다. 사랑의 반대
는 증오가 아니라 냉담함이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과학 기술에 대한 경고를 넘어선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재론적 슬픔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분리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민과 치유가 가능해진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공포 소설이 아닌 슬픔의 소설이며, 경고의 이야기가 아닌 연민의 이야기다.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법을,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창조물과 빅터가 보여주는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적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적 고통의 극단적 형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창조물처럼 고독하고, 빅터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린다.
메리 셸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비극성을 드러냈다. 인간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독 속에서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연결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이 절망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조물과 빅터의 이야기는 또한 연민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만약 빅터가 처음부터 창조물을 받아들이고 보살폈다면, 만약 인간 사회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모든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한 괴물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태어난다. 사랑의 반대
는 증오가 아니라 냉담함이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과학 기술에 대한 경고를 넘어선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재론적 슬픔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분리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민과 치유가 가능해진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공포 소설이 아닌 슬픔의 소설이며, 경고의 이야기가 아닌 연민의 이야기다.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법을,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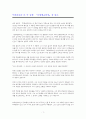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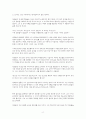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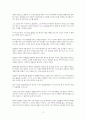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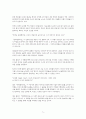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