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2.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관계
3. 법적 성격4. 대통령기록물의 유형
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1.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관리 현황
2.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Ⅲ.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1. 공개원칙
2.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Ⅳ.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과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1.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executive privilege)의 개념
2. 정보공개거부특권의 근거와 필요성
3.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인정범위와 조건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2.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관계
3. 법적 성격4. 대통령기록물의 유형
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1.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관리 현황
2.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Ⅲ.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1. 공개원칙
2.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Ⅳ.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과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1.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executive privilege)의 개념
2. 정보공개거부특권의 근거와 필요성
3.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인정범위와 조건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본문내용
것으로 헌법2조의 대통령의 권한을 해석하는 것은 작동가능한 정부라는 헌법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해 인정된 법원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한 절대적인 특권을 부인하였다. 같은 판결 707
그러면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모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있어 그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이익되는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법원의 명백한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외교적 비밀보장의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비밀보장의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정보공개거부특권은 형사사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적법절차의 근본적인 요구보다 우월할 수 없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입증되고 구체적인 필요(demonstrated, specipic need)가 있다면 특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 711, 713
즉 보좌관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도 추정적인 특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되고 구체적인 증거로서 필요한 정보라면 이러한 추정은 부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군사 및 외교관계 정보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특권이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을 거부특권을 부인하는 측에 부과함으로써 정보공개특권의 존재의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연방대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의 공개거부특권의 인정요건
(1) 입증가능하고 구체적인 비밀보호의 이익
상대적인 특권으로서의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완벽한 솔직성(candor)과 객관성(objectivity)에 바탕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라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broad, undifferentiated) 비밀유지의 이익을 상회하는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공익(demonstrable, specific public interests)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절차와 관련되며, 증거능력이 있고, 구체성을 갖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반정보공개거부특권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가 당해정보가 형사재판절차와의 관련성(relevancy)이 인정되고, 증거능력(admissibility)이 있으며, 그 정보의 공개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체성(specificity)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요건은 정보공개거부특권 자체에 부여된 요건이 아니라 증거제출명령과 관련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edings) 제17조 (c)항 “제출명령(subpoena)은 명령대상자로 하여금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거제출명령발부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억압적(oppressive)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증거제출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이 사실심재판전 혹은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된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에 기초한 것이다. 즉,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특권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증거제출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U.S. v. Nixon, 418 U.S. 683, 698-703 (1974)
다. 사법권에 의한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제한의 한계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개청구된 정보의 관리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어 진다. “증거제출명령이 발부된 이후 연방지역법원은 연방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빈번한 소송에 의해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일반인을 대하듯 대통령을 추달하는 것(proceed against)은 적절하지 않다”는 United States v. Burr 사건에서의 John Marshall 대법원장의 경구를 상기시키면서 연방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이 제출할 녹취록과 문건의 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한 구체적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판결 714-716
첫째, 비공개증거조사를 통해 증거능력(admissibility)심사와 관련성(relevancy)심사를 통과한 모든 증거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건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검사단계에서 증거제출명령에 의하여 요구된 증거를 특별검사의 대리행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지역법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비공개증거조사에서 일단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며 봉인되어 법적 관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대통령의 특권으로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인정되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이 특권의 주체라는데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특권은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현직시의 정보와 관련하여 주장될 수 있음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닉슨의 퇴임 후 Watergate 사건과 관련된 문건의 보관 등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관련녹취및문건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ion Act, 44 U.S.C.A. §2107)에 대하여 닉슨 전대통령이 대통령의 특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Nixon v. Adminstrator of General Services, 433 U.S. 425 (1977)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관련법의 제정 등에 대통령이 관여하였으며 행정부에 부당한 부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의 위반 주장을 기각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도 정보공개거부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해 법률이 특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모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있어 그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이익되는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법원의 명백한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외교적 비밀보장의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비밀보장의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정보공개거부특권은 형사사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적법절차의 근본적인 요구보다 우월할 수 없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입증되고 구체적인 필요(demonstrated, specipic need)가 있다면 특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 711, 713
즉 보좌관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도 추정적인 특권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되고 구체적인 증거로서 필요한 정보라면 이러한 추정은 부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군사 및 외교관계 정보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특권이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을 거부특권을 부인하는 측에 부과함으로써 정보공개특권의 존재의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연방대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의 공개거부특권의 인정요건
(1) 입증가능하고 구체적인 비밀보호의 이익
상대적인 특권으로서의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완벽한 솔직성(candor)과 객관성(objectivity)에 바탕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라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broad, undifferentiated) 비밀유지의 이익을 상회하는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공익(demonstrable, specific public interests)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절차와 관련되며, 증거능력이 있고, 구체성을 갖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반정보공개거부특권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가 당해정보가 형사재판절차와의 관련성(relevancy)이 인정되고, 증거능력(admissibility)이 있으며, 그 정보의 공개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체성(specificity)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요건은 정보공개거부특권 자체에 부여된 요건이 아니라 증거제출명령과 관련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edings) 제17조 (c)항 “제출명령(subpoena)은 명령대상자로 하여금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거제출명령발부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억압적(oppressive)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증거제출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이 사실심재판전 혹은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된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에 기초한 것이다. 즉,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특권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증거제출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U.S. v. Nixon, 418 U.S. 683, 698-703 (1974)
다. 사법권에 의한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제한의 한계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개청구된 정보의 관리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어 진다. “증거제출명령이 발부된 이후 연방지역법원은 연방대통령이 불필요하게 빈번한 소송에 의해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일반인을 대하듯 대통령을 추달하는 것(proceed against)은 적절하지 않다”는 United States v. Burr 사건에서의 John Marshall 대법원장의 경구를 상기시키면서 연방대법원이 닉슨 대통령이 제출할 녹취록과 문건의 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한 구체적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판결 714-716
첫째, 비공개증거조사를 통해 증거능력(admissibility)심사와 관련성(relevancy)심사를 통과한 모든 증거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건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검사단계에서 증거제출명령에 의하여 요구된 증거를 특별검사의 대리행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지역법원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비공개증거조사에서 일단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며 봉인되어 법적 관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대통령의 특권으로 정보공개거부특권이 인정되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이 특권의 주체라는데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특권은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현직시의 정보와 관련하여 주장될 수 있음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닉슨의 퇴임 후 Watergate 사건과 관련된 문건의 보관 등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관련녹취및문건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ion Act, 44 U.S.C.A. §2107)에 대하여 닉슨 전대통령이 대통령의 특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Nixon v. Adminstrator of General Services, 433 U.S. 425 (1977)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관련법의 제정 등에 대통령이 관여하였으며 행정부에 부당한 부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의 위반 주장을 기각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도 정보공개거부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해 법률이 특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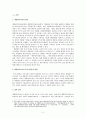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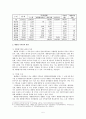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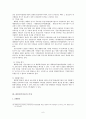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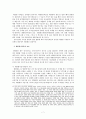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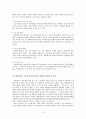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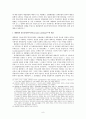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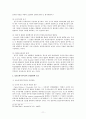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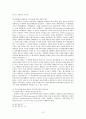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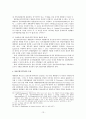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