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김동리의 문학세계
2. 무녀도 줄거리 요약
3. 샤머니즘 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충돌을 통해본 당대의 시대상
4. 인물들의 성격 및 상징성 고찰
5. 작품 속 `불`의 상징적 의미 소고
6. 운명적인 자연에의 귀의
2. 무녀도 줄거리 요약
3. 샤머니즘 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충돌을 통해본 당대의 시대상
4. 인물들의 성격 및 상징성 고찰
5. 작품 속 `불`의 상징적 의미 소고
6. 운명적인 자연에의 귀의
본문내용
증오하던 기독교는 세력이 늘어나며 아들 욱이 마저 죽게 된다. 모화의 심화는 더 이상 불길로 확대되지 않으며 “보석”에 비유되었던 눈의 광채는 이제 “이상한 광채”로 빛의 질을 달리 하고있다. 거기에 “먹같이 검”은 색깔은 그 광채가 죽음을 향해 켜진 불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모화는 육신의 숨을 멈추고 광물이 되어서 익사하고 만다.
불은 모화가 죽음에 이르는 도경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도경은 하나의 불길이 겪는 과정과 동일한 양상을 하고 있다. 불이 점화되어서 점차 커다란 불길로 발전하고 마침내 활활 타오르다가 소멸되는 그 과정이 모화의 운명 속에는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화의 운명의 불은 ‘문명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불이 아니라 반대로 원시적인 불의 성질, 즉 태워서 없애는 파괴적인 성질을 지닌 불인 것이다.
6. 운명적인 자연에의 귀의
결국 무녀도는 한국 전래의 토속적 인간과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기독교적 인간의 갈등을 그렸다. 그리고 토속적 인간이 근대화의 물결 앞에 패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닫힌 사회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무녀도는 모화를 한국의 전근대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모화와 욱이의 충돌 결과는 결국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들이 죽는 과정을 통해, 동리의 사상인 ‘자연에서 천상으로’의 유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어느 한 편만에 기울지 않는 있는 것 같다.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작가의 사상을 구현시키는 동등한 방법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화의 죽음은 단순히 서양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온 신흥종교인 기독교에 의해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작가는 또한 낭이만 남아 슬픈 운명의 비애를 계승하게 했는데 낭이는 한편으로는 어머니 모화 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라버니 욱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적 입장은 추락해 가는 토속인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국 토속과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대립시켜, 기독교 앞에 샤머니즘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패배나 파멸이 아닌, 자연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작가의 사상과 일치한다.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민간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화가 마지막 굿을 하며 물 속으로 들어 간 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운명적인 자연에의 투입이요 귀의라고 볼 수 있겠다.
불은 모화가 죽음에 이르는 도경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도경은 하나의 불길이 겪는 과정과 동일한 양상을 하고 있다. 불이 점화되어서 점차 커다란 불길로 발전하고 마침내 활활 타오르다가 소멸되는 그 과정이 모화의 운명 속에는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화의 운명의 불은 ‘문명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불이 아니라 반대로 원시적인 불의 성질, 즉 태워서 없애는 파괴적인 성질을 지닌 불인 것이다.
6. 운명적인 자연에의 귀의
결국 무녀도는 한국 전래의 토속적 인간과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기독교적 인간의 갈등을 그렸다. 그리고 토속적 인간이 근대화의 물결 앞에 패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닫힌 사회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무녀도는 모화를 한국의 전근대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모화와 욱이의 충돌 결과는 결국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들이 죽는 과정을 통해, 동리의 사상인 ‘자연에서 천상으로’의 유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어느 한 편만에 기울지 않는 있는 것 같다.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작가의 사상을 구현시키는 동등한 방법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화의 죽음은 단순히 서양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온 신흥종교인 기독교에 의해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작가는 또한 낭이만 남아 슬픈 운명의 비애를 계승하게 했는데 낭이는 한편으로는 어머니 모화 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라버니 욱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적 입장은 추락해 가는 토속인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국 토속과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대립시켜, 기독교 앞에 샤머니즘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패배나 파멸이 아닌, 자연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작가의 사상과 일치한다.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민간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화가 마지막 굿을 하며 물 속으로 들어 간 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운명적인 자연에의 투입이요 귀의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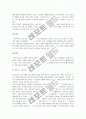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