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Ⅰ. 출생
Ⅱ. 출가와 수행
Ⅲ. 一切唯心造
Ⅳ. 파계, 그리고 대중 속으로
Ⅴ. 一心의 노래
Ⅵ. 적멸
Ⅰ. 출생
Ⅱ. 출가와 수행
Ⅲ. 一切唯心造
Ⅳ. 파계, 그리고 대중 속으로
Ⅴ. 一心의 노래
Ⅵ. 적멸
본문내용
으며, 각 분야별로 최고로 인정받는 저술을 남겼다. 특히 『대승기신론소』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대승기신론과 관련한 3대 해석서로 인정받았으며, 『금강삼매경론소』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는 ‘論’으로 존중받을 정도였다.
원효의 방대한 저술들은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한다. 원효는 나라 안팎의 투쟁과 사상 대립에 대하여 고뇌했다. 이러한 분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상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융회통(圓融會通)’, ‘화쟁(和爭)’ 사상 등의 개념으로 표출되었고, ‘일심’은 그 근거가 된다.
일심이란 중생심(衆生心)과 불심(佛心)이 결국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하나이나 다만 미혹되면 중생심이 되는 것이고, 미혹된 사실을 깨치고 그것을 걷어내면 불심이 되는 것이다. 원효에 따르면 일심에는 두 가지 체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 )이 있다. 원효는 당시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비판하였고, 이들은 각각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편입시켜 일심으로써 포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진여문이란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진여문에서 인간은 사물의 본질은 공(空)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공’은 공하기도 하지만 공하지 않은 것이다. 본래 아무 것도 없고 텅 비어있는 듯 하나, 그 안에는 온갖 것들과 감응하여 무한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멸문은 현상세계의 모습이다. 생멸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에 무명이 덮이게 되어 미혹되고, 생멸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효는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고 하며 이 두 문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실의 모든 대립들이 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보자면 정토와 예토 역시 결국 하나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부처나 보살이 사는 정토(淨土)나 속세인 예토(穢土) 는 그 경계가 각기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같이 일심의 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이 가야할 방향도 결정된다. 깨우치기 위해, 이 세상이 미혹되었음을 알기위하여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조하지만, 깨우친 후에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그곳이 바로 정토이며 극락이기 때문이다. 청원행사는 상당설법을 통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 하고 다시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다. 맨 처음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세계는 망집에 의해, 분별심에 의해 바라보는 세상이며, 생멸문의 세계이다. 그 다음의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미혹됨을 벗어난 것으로서 일체가 공함을 깨달은 단계로, 곧 진여문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돌아온다. 이것은 앞에서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세계와는 내용에 있어서 천지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이전에 가리어졌던 물화(物化)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정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심에 의한 통합이다.
Ⅵ. 적멸
방랑으로 병들었건만 꿈은 마른 들녘 헤매네. - 송미
올 때는 문득 오고
갈 때는 미련없이 가네
하늘을 후려쳐 뚫어 버리고
대지를 뒤집어엎네.
-대위
중생 사이를 떠돌던 원효는 다시 절로 들어왔다. 그 동안 원효는 군국의 기무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三國遺事』, 紀異篇, 「太宗春秋公」條
, 관음을 만나려 하기도 했고 같은 책, 塔像篇,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 기인(奇人) 사복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義解篇, 「蛇福不言」條
원효는 분황사에 칩거하며 『화엄경』의 「회향품(廻向品)」에 대한 주석을 달다가 이윽고 절필하였다. 회향이란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무애행을 끝내고 죽기 전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집필에 임했던 것이나, 절 안의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 경주 고선사에서 발견된 「誓幢和上塔碑文」에 따르자면 - 신라 신문왕 6년(686)에 경주 남산에 있는 혈사(穴寺)에서 조용히 입적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70세였다.
원효의 임종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 인간의 목숨이란 부질없으니 칠십 평생이 봄날의 꿈처럼 지나갔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상도 따지 고보면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을.. 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것을 어이할까... 저 깨치지 못한 가엾은 중생들을 어이할까.’
유사(遺事)는 원효가 죽은 뒤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설총은 그 유해를 부수어 진용(眞容)을 소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경모종천(敬慕終天)의 뜻을 표하였다. (어느 날) 설총이 예배하니 소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 원효가 거주한 적이 있는 혈사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기린다. ‘각승은 삼매경(三昧經)의 축을 열었고/ 무호(舞壺)는 마침내 만가풍에 걸었다./ 달 밝은 요석궁엔 봄 잠이 깊더니/ 묻단힌 분황사엔 고영(顧影)만이 비어있다.
※ 後記를 대신하여...
“부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묻는 그대는 누구인가?”
【주요 참고문헌】
『三國遺事』/ 이재호 번역본
원효사상전집간행위원회, 『원효, 그의 위대한 생애』, 불교춘추사, 1999
고영섭, 『원효』, 한길사, 1997
김형효 외,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공종원,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Ⅰ』, 불교춘추사. 1999
김도공, 「원효, 그 깨달음의 사상체계」,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Ⅰ』, 불교춘추사, 1999
田美姬, 「元曉의 身分과 그의 活動」, 『한국사연구』63, 1988
洪庭植, 「元曉의 思想과 生涯」, 『한국의 불교문화』, 국제문화재단, 1974
※ 원효의 저술 本文은 “www.songchol.net\"에서 DOWN 받아 이용하였음.
원효의 방대한 저술들은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한다. 원효는 나라 안팎의 투쟁과 사상 대립에 대하여 고뇌했다. 이러한 분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상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융회통(圓融會通)’, ‘화쟁(和爭)’ 사상 등의 개념으로 표출되었고, ‘일심’은 그 근거가 된다.
일심이란 중생심(衆生心)과 불심(佛心)이 결국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하나이나 다만 미혹되면 중생심이 되는 것이고, 미혹된 사실을 깨치고 그것을 걷어내면 불심이 되는 것이다. 원효에 따르면 일심에는 두 가지 체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 )이 있다. 원효는 당시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비판하였고, 이들은 각각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편입시켜 일심으로써 포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진여문이란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진여문에서 인간은 사물의 본질은 공(空)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공’은 공하기도 하지만 공하지 않은 것이다. 본래 아무 것도 없고 텅 비어있는 듯 하나, 그 안에는 온갖 것들과 감응하여 무한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멸문은 현상세계의 모습이다. 생멸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에 무명이 덮이게 되어 미혹되고, 생멸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효는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고 하며 이 두 문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실의 모든 대립들이 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보자면 정토와 예토 역시 결국 하나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부처나 보살이 사는 정토(淨土)나 속세인 예토(穢土) 는 그 경계가 각기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같이 일심의 작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이 가야할 방향도 결정된다. 깨우치기 위해, 이 세상이 미혹되었음을 알기위하여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관조하지만, 깨우친 후에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그곳이 바로 정토이며 극락이기 때문이다. 청원행사는 상당설법을 통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 하고 다시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했다. 맨 처음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세계는 망집에 의해, 분별심에 의해 바라보는 세상이며, 생멸문의 세계이다. 그 다음의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미혹됨을 벗어난 것으로서 일체가 공함을 깨달은 단계로, 곧 진여문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돌아온다. 이것은 앞에서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세계와는 내용에 있어서 천지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이전에 가리어졌던 물화(物化)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정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심에 의한 통합이다.
Ⅵ. 적멸
방랑으로 병들었건만 꿈은 마른 들녘 헤매네. - 송미
올 때는 문득 오고
갈 때는 미련없이 가네
하늘을 후려쳐 뚫어 버리고
대지를 뒤집어엎네.
-대위
중생 사이를 떠돌던 원효는 다시 절로 들어왔다. 그 동안 원효는 군국의 기무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三國遺事』, 紀異篇, 「太宗春秋公」條
, 관음을 만나려 하기도 했고 같은 책, 塔像篇,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 기인(奇人) 사복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義解篇, 「蛇福不言」條
원효는 분황사에 칩거하며 『화엄경』의 「회향품(廻向品)」에 대한 주석을 달다가 이윽고 절필하였다. 회향이란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무애행을 끝내고 죽기 전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집필에 임했던 것이나, 절 안의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 경주 고선사에서 발견된 「誓幢和上塔碑文」에 따르자면 - 신라 신문왕 6년(686)에 경주 남산에 있는 혈사(穴寺)에서 조용히 입적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70세였다.
원효의 임종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 인간의 목숨이란 부질없으니 칠십 평생이 봄날의 꿈처럼 지나갔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상도 따지 고보면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을.. 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것을 어이할까... 저 깨치지 못한 가엾은 중생들을 어이할까.’
유사(遺事)는 원효가 죽은 뒤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설총은 그 유해를 부수어 진용(眞容)을 소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경모종천(敬慕終天)의 뜻을 표하였다. (어느 날) 설총이 예배하니 소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 원효가 거주한 적이 있는 혈사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기린다. ‘각승은 삼매경(三昧經)의 축을 열었고/ 무호(舞壺)는 마침내 만가풍에 걸었다./ 달 밝은 요석궁엔 봄 잠이 깊더니/ 묻단힌 분황사엔 고영(顧影)만이 비어있다.
※ 後記를 대신하여...
“부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묻는 그대는 누구인가?”
【주요 참고문헌】
『三國遺事』/ 이재호 번역본
원효사상전집간행위원회, 『원효, 그의 위대한 생애』, 불교춘추사, 1999
고영섭, 『원효』, 한길사, 1997
김형효 외,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공종원,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Ⅰ』, 불교춘추사. 1999
김도공, 「원효, 그 깨달음의 사상체계」,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Ⅰ』, 불교춘추사, 1999
田美姬, 「元曉의 身分과 그의 活動」, 『한국사연구』63, 1988
洪庭植, 「元曉의 思想과 生涯」, 『한국의 불교문화』, 국제문화재단, 1974
※ 원효의 저술 本文은 “www.songchol.net\"에서 DOWN 받아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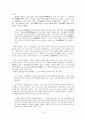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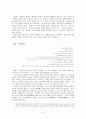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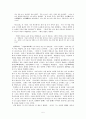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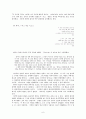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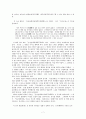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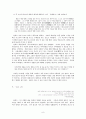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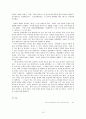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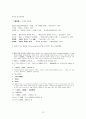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