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묵자라는 인물에 대해
2. 묵자의 출생지
3. 묵자의 출신 성분
4. 묵자의 윤리사상(倫理思想)
5. 묵자의 겸애사상에 대한 이해
6. 묵자 겸애사상의 후래적 영향
2. 묵자의 출생지
3. 묵자의 출신 성분
4. 묵자의 윤리사상(倫理思想)
5. 묵자의 겸애사상에 대한 이해
6. 묵자 겸애사상의 후래적 영향
본문내용
러나 그는 인간과 인간이 충돌이 일어나는 객관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비의(毘意)가 부족하다. 여기에 천의 권위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묵자는 우주의 주재 신으로서의 천을 종교적 열의로 신앙하였다. 천은 일체의 만물을 무차별 평등하게 전수하는 까닭에 사람도 天志에 순응하여 개인이나 국가의 차별에 구애됨이 없이 無差別 平等에 겸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묵자의 겸애는 실천존비(實踐尊卑)의 차별이 심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신분의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한 평등의 요구였으며 자신들의 삶을 해치는 지배계층에 대하여 권리와 이익 보장을 내세운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겸애교리는 그들 집단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즉 육친간의 애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간 일반에게 적용함에는 실용성(實用性)이 부족하게 된다. 그것이 겸애의 비현실성이다. 겸애의 實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묵자는 상벌에 의한 강제와 천의 의지 하에서 그 자율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겸애가 신분의 차별을 지양, 서민의 해방을 지향하여 당시의 귀족계층에 서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요구하고 평등과 박애를 이상으로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묵자는 篤行과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일찍이 그는 말하기를 군자에게 비록 학문이 높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행위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묵자는 행동과 실천을 주장하였으니 행동은 곧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며 실천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묵자는 앉으면 말하고 일어서면 행동하는 자로서 공익(公益)과 무아(無我)를 실천하는 하나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인내성 있는 노력과 자신을 버리고 대중을 위한다는 정신에 대하여는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묵자의 포부와 의지는 사실 현대 중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의 사상의 실현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에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자 겸애사상에 대하여 고찰해 왔다. 묵가의 겸애사상은 인민성을 띤 사회정치 주장과 공리성을 띤 윤리도덕관념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제자백가의 하나로 한 이후 국학의 위치를 점한 유가의 사상이 주로 상류계층의 일원들에 의한 경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면 이는 민중을 중심한 공리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묵가의 사상은 유가사상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민중과 관련되어 있고, 상류사회를 중심한 치세의 道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모순된 사회문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兼으로써 別을 바꾸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겸애로써 유가의 차별 애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천하에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진흥시키고 천하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겸애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천하의 혼란을 평정하는데 에 있었다. 그래서 묵자가 겸애를 주장한 것도 치란문제에서 착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묵자는 兼을 利로 보았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의 각박한 백성들의 생활을 바로 반영한다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묵자는 어디까지나 서민계급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사랑이란 실리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묵자는 전쟁과 공벌은 義에 옳지 않고, 利에도 소득이 없어 천하의 커다란 해로움이라 생각하였다. 군자는 천하를 위해 이익을 일으키고 손해를 제거하여야 하므로, \'공격을 비난\'(非攻)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비공론이라고 한다.
유가사상이 국학이 된 후에도 묵가사상은 제자백가의 하나로 계승되었다. 유가사상의 흥왕에 의해 점차 쇠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의 사상으로서 항상 그 명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시대사회가 바뀔 때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일어나므로 그 사회문제를 시점으로 하는 입장이나 시각은 그 무게를 전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묵자의 하늘(天)에 대한 신앙>
묵자는 고대의 ‘하늘’에 대한 신앙이 식어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시 옛 ‘하늘’에 대한 신앙을 되찾아 그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의 법도를 바탕으로 하여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즉, 그는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겸애’나 ‘근검’의 가르침을 ‘하늘의 뜻’에 결부시키고,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고질화된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다.
1) 묵자의 ‘하늘’에 대한 개념
*묵자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 ‘하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재자이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고 무소불명(無所不明)한 존재이다. 하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묵자는 「법의」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천하의 크고 작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늘의 고을이다. 사람은 어리고, 나이 많고, 귀하고 천한 구별 없이 모두가 하늘의 신하인 것이다.”
천하의 모든 나라도 ‘하늘’의 땅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하늘’의 신하이다. 그래서 하늘이 모든 것을 보전시켜 주고 있고, 모든 것을 먹여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묵자의 신앙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하늘의 의의 : 인간 생활의 기준
묵자는 늘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의(義)’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묵자는 이 ‘의’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義果自天出矣-의과자천출의, 「천지」)이라 하였다. 곧 ‘하늘’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지켜야만 할 모든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이며, 천자도 ‘하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올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묵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온 우주와 천하의 질서의 정점인 것이다. 즉, ‘하늘’은 우주의 주재자인 것이다. 따라서 묵자의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상도 이 ‘하늘’의 뜻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묵자의 겸애는 실천존비(實踐尊卑)의 차별이 심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신분의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한 평등의 요구였으며 자신들의 삶을 해치는 지배계층에 대하여 권리와 이익 보장을 내세운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겸애교리는 그들 집단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즉 육친간의 애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간 일반에게 적용함에는 실용성(實用性)이 부족하게 된다. 그것이 겸애의 비현실성이다. 겸애의 實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묵자는 상벌에 의한 강제와 천의 의지 하에서 그 자율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겸애가 신분의 차별을 지양, 서민의 해방을 지향하여 당시의 귀족계층에 서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요구하고 평등과 박애를 이상으로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묵자는 篤行과 실천을 중요시 하였다. 일찍이 그는 말하기를 군자에게 비록 학문이 높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행위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묵자는 행동과 실천을 주장하였으니 행동은 곧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며 실천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묵자는 앉으면 말하고 일어서면 행동하는 자로서 공익(公益)과 무아(無我)를 실천하는 하나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인내성 있는 노력과 자신을 버리고 대중을 위한다는 정신에 대하여는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묵자의 포부와 의지는 사실 현대 중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의 사상의 실현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에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자 겸애사상에 대하여 고찰해 왔다. 묵가의 겸애사상은 인민성을 띤 사회정치 주장과 공리성을 띤 윤리도덕관념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제자백가의 하나로 한 이후 국학의 위치를 점한 유가의 사상이 주로 상류계층의 일원들에 의한 경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면 이는 민중을 중심한 공리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묵가의 사상은 유가사상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민중과 관련되어 있고, 상류사회를 중심한 치세의 道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모순된 사회문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兼으로써 別을 바꾸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겸애로써 유가의 차별 애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천하에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진흥시키고 천하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겸애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천하의 혼란을 평정하는데 에 있었다. 그래서 묵자가 겸애를 주장한 것도 치란문제에서 착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묵자는 兼을 利로 보았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의 각박한 백성들의 생활을 바로 반영한다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묵자는 어디까지나 서민계급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사랑이란 실리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묵자는 전쟁과 공벌은 義에 옳지 않고, 利에도 소득이 없어 천하의 커다란 해로움이라 생각하였다. 군자는 천하를 위해 이익을 일으키고 손해를 제거하여야 하므로, \'공격을 비난\'(非攻)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비공론이라고 한다.
유가사상이 국학이 된 후에도 묵가사상은 제자백가의 하나로 계승되었다. 유가사상의 흥왕에 의해 점차 쇠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의 사상으로서 항상 그 명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시대사회가 바뀔 때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일어나므로 그 사회문제를 시점으로 하는 입장이나 시각은 그 무게를 전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묵자의 하늘(天)에 대한 신앙>
묵자는 고대의 ‘하늘’에 대한 신앙이 식어가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시 옛 ‘하늘’에 대한 신앙을 되찾아 그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의 법도를 바탕으로 하여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즉, 그는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겸애’나 ‘근검’의 가르침을 ‘하늘의 뜻’에 결부시키고,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고질화된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다.
1) 묵자의 ‘하늘’에 대한 개념
*묵자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 ‘하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재자이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고 무소불명(無所不明)한 존재이다. 하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묵자는 「법의」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천하의 크고 작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늘의 고을이다. 사람은 어리고, 나이 많고, 귀하고 천한 구별 없이 모두가 하늘의 신하인 것이다.”
천하의 모든 나라도 ‘하늘’의 땅이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하늘’의 신하이다. 그래서 하늘이 모든 것을 보전시켜 주고 있고, 모든 것을 먹여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묵자의 신앙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하늘의 의의 : 인간 생활의 기준
묵자는 늘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의(義)’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묵자는 이 ‘의’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義果自天出矣-의과자천출의, 「천지」)이라 하였다. 곧 ‘하늘’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지켜야만 할 모든 규범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이며, 천자도 ‘하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올바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묵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온 우주와 천하의 질서의 정점인 것이다. 즉, ‘하늘’은 우주의 주재자인 것이다. 따라서 묵자의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상도 이 ‘하늘’의 뜻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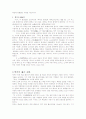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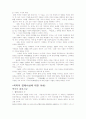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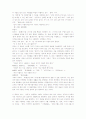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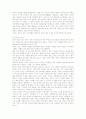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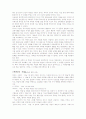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