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序論 : 傳統의 繼承과 社會의 發展
2. 內容과 形式의 論理
3. 穢德先生傳과 社會分業思想
1) 所望스러운 民衆像의 부각
2) 重農思想과 社會分業思想
4. 許生傳과 利用厚生學
1) 商工業的 職業轉換의 提案
2) 北伐政策
3) 北學과 利用厚生學
5. 兩班傳과 理想的 人間像
1) 問題의 提起
2) 정선양반의 無能力
3) 理想的 人間像
6. 結論 : 燕岩의 선비觀
7. 이 책을 읽고……
1. 序論 : 傳統의 繼承과 社會의 發展
2. 內容과 形式의 論理
3. 穢德先生傳과 社會分業思想
1) 所望스러운 民衆像의 부각
2) 重農思想과 社會分業思想
4. 許生傳과 利用厚生學
1) 商工業的 職業轉換의 提案
2) 北伐政策
3) 北學과 利用厚生學
5. 兩班傳과 理想的 人間像
1) 問題의 提起
2) 정선양반의 無能力
3) 理想的 人間像
6. 結論 : 燕岩의 선비觀
7. 이 책을 읽고……
본문내용
음을 修養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現實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자신의 학문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는 사람
-人本的이고 合理的이며 開放的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運用되고 있는 사람
7. 이 책을 읽고……
뛰어난 名門巨族이었던 朴趾源은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하였다. 그를 官界에 끌어들이려던 주위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시험을 거부했으며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양반되기를 포기한 채 양반을 그저 비난이나 하면서 은둔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반이란 어떤 것인가를 苦心해 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음을 이 책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의 「穢德先生傳」, 「許生傳」, 「兩班傳」 등에서 그가 발견한 양반의 도리 또는 참된 선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먼저 연암이 말하는 ‘敎育的 人間像으로의 선비’를 말하기에 앞서 참다운 사회와 인간상은 공동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사회적인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다. 마음을 修養함과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구분하여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실을 파악하고, 실증, 실용적인 방법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선비의 임무를 각성하길 간절히 원했다.
기존의 지배윤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안을 모색한 연암 박지원이야말로 참지식인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양반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선비로서의 본분을 다한 연암에게서 우리는 많은 사명감을 부여받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의 나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만 배우고 생각하지 않는, 연암이 풍자하고자 했던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정신의 "맑음"을 잃지 않아 부끄럽지 않는 자세. 곧 현대의 진정한 “선비”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인류문화를 兩分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를 경험하였고 이 두 사회를 동시에 우리의 것으로 가진 셈이 되며 따라서 이 두 社會를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로 統合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지니게 된다. 남은일은 그 실험의 결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실험이 앞으로의 우리의 교육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眼目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선비가 이름만의 선비가 아니요 참다운 선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연암의 뜻을 잊지 말고, 항상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교육자가 되려는 本意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이름만의 교육자가 아니요 참다운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
-人本的이고 合理的이며 開放的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運用되고 있는 사람
7. 이 책을 읽고……
뛰어난 名門巨族이었던 朴趾源은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하였다. 그를 官界에 끌어들이려던 주위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시험을 거부했으며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양반되기를 포기한 채 양반을 그저 비난이나 하면서 은둔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반이란 어떤 것인가를 苦心해 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음을 이 책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의 「穢德先生傳」, 「許生傳」, 「兩班傳」 등에서 그가 발견한 양반의 도리 또는 참된 선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먼저 연암이 말하는 ‘敎育的 人間像으로의 선비’를 말하기에 앞서 참다운 사회와 인간상은 공동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사회적인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다. 마음을 修養함과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구분하여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실을 파악하고, 실증, 실용적인 방법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선비의 임무를 각성하길 간절히 원했다.
기존의 지배윤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안을 모색한 연암 박지원이야말로 참지식인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양반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선비로서의 본분을 다한 연암에게서 우리는 많은 사명감을 부여받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의 나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만 배우고 생각하지 않는, 연암이 풍자하고자 했던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정신의 "맑음"을 잃지 않아 부끄럽지 않는 자세. 곧 현대의 진정한 “선비”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인류문화를 兩分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를 경험하였고 이 두 사회를 동시에 우리의 것으로 가진 셈이 되며 따라서 이 두 社會를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로 統合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지니게 된다. 남은일은 그 실험의 결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실험이 앞으로의 우리의 교육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眼目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선비가 이름만의 선비가 아니요 참다운 선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연암의 뜻을 잊지 말고, 항상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교육자가 되려는 本意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이름만의 교육자가 아니요 참다운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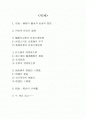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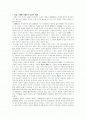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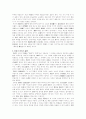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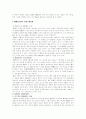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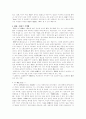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