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자 황석영
2. 작품 내용요약 및 분석
3. 황석영 문학의 세계와의 연대
4. 모성의 부재
5. 삶이 고통스러운 세 가지 원인
6. 우리 삶의 생명수, 희망
7. 맺음말
2. 작품 내용요약 및 분석
3. 황석영 문학의 세계와의 연대
4. 모성의 부재
5. 삶이 고통스러운 세 가지 원인
6. 우리 삶의 생명수, 희망
7.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말만이 가지는 진솔한 사투리의 맛이 어우러져 소설은 더욱 재미를 주는 듯하다. 아시아에서 분단국으로 사회체제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실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파키스탄의 만남이 사상과 신을 떠나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 그 속에서 죽어간 불쌍한 영혼들을 달래듯 바리는 진혼굿을 하며 여정을 펼친 듯하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희망\'이 있어 생명수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이 소설의 압권은 바리가 꿈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할머니와 칠성이와 소통하고, ‘황천무가’에서 차용했다는 지옥 장면이었다. 바리는 우리에게 과연 생명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책의 부록으로 실린 인터뷰에서 작가는 그것을 독자에게 되묻고 있다. 설화 속의 바리는 생명수를 얻어 부모를 살려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녀 바리는 생명수를 구하기난 한 것일까? 그 생명수는 과연 증오와 갈등, 죽음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21세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작가는 바리의 입을 빌어 소설에서 이렇게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란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뿐이고 희망을 유지하는 힘도 자신의 것이다. 분명히 세상엔 아직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괴로운 시간을, 전쟁을 겪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에겐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때론 세상의 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음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 것이다.
이처럼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이었다. 이 소설에서도 희망이 없었다면 바리의 험난한 여정도 영혼들과의 대화도 모두가 무의미 했을 터, 그들을 용서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바리의 생명수도 온전한 듯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터 실낱같은 희망마저 밝게 키워 가짐으로 바리의 삶 또한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아득한 먼 옛날 설화 속 주인공 ‘바리’는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널려있다. 그 모습과 상황만 다를 뿐. 그 대상이 생명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일 뿐.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구일 뿐. ‘바리’는 늘 무엇에겐가 버림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내가 된다.
7. 맺음말
바리공주처럼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을 뻔했다 하여 \'바리\'라고 이름 지어진 북한 소녀, 그 출생만큼이나 그녀의 운명 또한 기구하다.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은 없지만, 항상 역사와 세계의 직격탄을 맞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 책은 그의 전작인 손님, 그리고 심청의 연장선상에 있다. 손님이 굿의 형식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한을 잘 풀어냈다면 이번엔 역사와 함께 성숙해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좀 더 방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다. 전통 설화의 설정을 빌려온 한 여성이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내면서 성숙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심청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통 무속의 형식을 빌어 세상과의 화해를 꾀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 작품은 손님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심청의 여주인공이 19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다면, 바리데기의 여주인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손님이 개인과 개인의 화해를 통한 세계와 세계의 화해를 추구했다면 이 책은 자신과 자신의 화해를 통한 개인과 세계의 화해를 시도한다.
자신과의 화해가 곧 세계와의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결국 세계란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게 세상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물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 아니기에 더욱 가혹했을지도 모른다. 너가 그들을 뒤돌아보지 못했잖아, 너가 그들을 미워했잖아, 결국 너부터야, 라는 마치 어르신에게 혼나는 듯한 황석영의 직설적인 메시지는 참 강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온다.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가혹하지만 그게 정답으로 가는 첫 걸음임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희망적일 수 없음을 암시하며 끝내는 이 작품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나약한 개인일 뿐인 인간 개개인이 \'생명수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임을 말하기에 또한 지극히 이상적이기도 하다. 아무리 고통과 불행은 견딜만한 만큼의 양을 짊어진다지만, 가녀린 바리가 짊어진 고통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서 가져올 생명수가 한 개인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생명수를 통하여 이 세상은 화해할 수 있을까? 바리데기의 천덕꾸러기 대접이 클수록 바리공주의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민중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읽으면 매우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 매우 절망적이기도 한 이 책 안에는 결국 인간에게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황석영의 바람이 간절히 녹아 있는 듯 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힘센 자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이 이루어 낸 지옥이다.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소설의 압권은 바리가 꿈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할머니와 칠성이와 소통하고, ‘황천무가’에서 차용했다는 지옥 장면이었다. 바리는 우리에게 과연 생명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책의 부록으로 실린 인터뷰에서 작가는 그것을 독자에게 되묻고 있다. 설화 속의 바리는 생명수를 얻어 부모를 살려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녀 바리는 생명수를 구하기난 한 것일까? 그 생명수는 과연 증오와 갈등, 죽음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21세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작가는 바리의 입을 빌어 소설에서 이렇게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란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뿐이고 희망을 유지하는 힘도 자신의 것이다. 분명히 세상엔 아직도 많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괴로운 시간을, 전쟁을 겪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에겐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때론 세상의 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음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 것이다.
이처럼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이었다. 이 소설에서도 희망이 없었다면 바리의 험난한 여정도 영혼들과의 대화도 모두가 무의미 했을 터, 그들을 용서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바리의 생명수도 온전한 듯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터 실낱같은 희망마저 밝게 키워 가짐으로 바리의 삶 또한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아득한 먼 옛날 설화 속 주인공 ‘바리’는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널려있다. 그 모습과 상황만 다를 뿐. 그 대상이 생명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일 뿐.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구일 뿐. ‘바리’는 늘 무엇에겐가 버림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내가 된다.
7. 맺음말
바리공주처럼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을 뻔했다 하여 \'바리\'라고 이름 지어진 북한 소녀, 그 출생만큼이나 그녀의 운명 또한 기구하다.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은 없지만, 항상 역사와 세계의 직격탄을 맞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 책은 그의 전작인 손님, 그리고 심청의 연장선상에 있다. 손님이 굿의 형식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한을 잘 풀어냈다면 이번엔 역사와 함께 성숙해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좀 더 방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다. 전통 설화의 설정을 빌려온 한 여성이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내면서 성숙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심청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통 무속의 형식을 빌어 세상과의 화해를 꾀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 작품은 손님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심청의 여주인공이 19세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다면, 바리데기의 여주인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손님이 개인과 개인의 화해를 통한 세계와 세계의 화해를 추구했다면 이 책은 자신과 자신의 화해를 통한 개인과 세계의 화해를 시도한다.
자신과의 화해가 곧 세계와의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결국 세계란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게 세상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물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 아니기에 더욱 가혹했을지도 모른다. 너가 그들을 뒤돌아보지 못했잖아, 너가 그들을 미워했잖아, 결국 너부터야, 라는 마치 어르신에게 혼나는 듯한 황석영의 직설적인 메시지는 참 강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온다.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가혹하지만 그게 정답으로 가는 첫 걸음임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희망적일 수 없음을 암시하며 끝내는 이 작품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나약한 개인일 뿐인 인간 개개인이 \'생명수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임을 말하기에 또한 지극히 이상적이기도 하다. 아무리 고통과 불행은 견딜만한 만큼의 양을 짊어진다지만, 가녀린 바리가 짊어진 고통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서 가져올 생명수가 한 개인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생명수를 통하여 이 세상은 화해할 수 있을까? 바리데기의 천덕꾸러기 대접이 클수록 바리공주의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민중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읽으면 매우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 매우 절망적이기도 한 이 책 안에는 결국 인간에게서 희망을 보고 싶다는 황석영의 바람이 간절히 녹아 있는 듯 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힘센 자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이 이루어 낸 지옥이다.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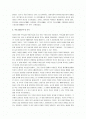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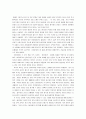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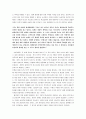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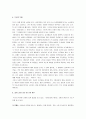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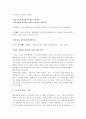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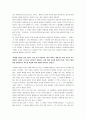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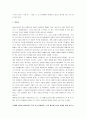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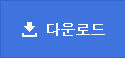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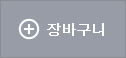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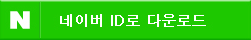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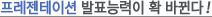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