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老子의 名
(1) 습관적 혹은 인위적 인식의 틀로부터의 자유
(2) 名의 경계를 통한 자연주의적 실존의 자유
3. 老子의 德
(1) 『老子』에서의 德의 의미와 역할
(2) 노자가 말하는 德의 맥락에서의 자유의 의미
4. 老子의 자유 개념과 자연으로서의 정치철학
5. 결론
2. 老子의 名
(1) 습관적 혹은 인위적 인식의 틀로부터의 자유
(2) 名의 경계를 통한 자연주의적 실존의 자유
3. 老子의 德
(1) 『老子』에서의 德의 의미와 역할
(2) 노자가 말하는 德의 맥락에서의 자유의 의미
4. 老子의 자유 개념과 자연으로서의 정치철학
5. 결론
본문내용
은 상태, 이름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道는 이름이 없다. 『老子』序에 의하면, 이 無名의 道를 따르는 정치야말로 이상적인 정치이다. 즉, 이상적인 정치의 근거 혹은 모델이 바로 無名인 셈이다. 오상무, 같은 논문, 253쪽.
老子의 정치철학이 名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므로 그는 온갖 인위적인 사회 체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상향이란 또 다른 名으로서의 無名의 세계가 아니다. 만약 老子가 無名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세계의 조각을 맞추려고 했다면, 그 역시 원래의 名에 새로운 名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無名의 道에 입각한 정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名이란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구분성과 규정성을 근본속성으로 한다. 이름을 통해서 구분하고 규정하는 행위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철저히 언어적이다. 그래서 無名의 정치는 不言의 정치로도 표현된다. ‘言’의 본뜻은 ‘말하다’이다. 갑골문에서 ‘言’字는 혀가 앞으로 뻗은 모양이다. 오상무, 앞의 논문, 253쪽.
그것이 ‘말’, ‘말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파생된다.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론적으로는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적 혹은 법적 규범 및 그것을 지키도록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不言이란 바로 이러한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老子』序는 이러한 언어적 행위를 부정하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고, 이를 ‘不言의 교화’라고 말한다. 그것은 통치자가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을 저절로 교화시키는 정치이다. 『老子』, 3장, “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老子』序에는 不言의 교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런데 『莊子』에는 왕태라는 전과자의 우화를 통하여 不言의 교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不言의 교화란 말로 가르치거나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암암리에 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사람, 같은 논문, 253.
道(無)의 정치론적 의미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람, 같은 논문, 253~254쪽.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자는 백성에 대한 교화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역할과 사회 규범을 온통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것들이 원래의 모습에서 왜곡되어, 즉 名에 의해 본질이 가려져서 백성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老子의 정치철학은 비판의 철학이다. 유가와 법가가 쌓아올린 名의 세계를 驅逐하여 자연을 닮은 세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老子의 정치철학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小國寡民을 국가 부정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으며, 無名으로서의 정치철학을 정치 부정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철학, 즉 儒法에 대한 일갈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정치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며, 이 이상적인 정치에는 지극히 자유로운 백성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극히 자유로운 백성이란 단순히 소극적인 자유에 머물지 않고, 自然 그 자체를 닮아감으로써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子가 비록 소극적이고, 은둔적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정치철학은 모든 백성이 본성대로 살게끔 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無名을 통해 名을 비판함으로써 名에 의한 왜곡을 바로 잡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老子의 無名이 갖는 사회적 함의이며, 정치철학적 가치이다. 유가와 법가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그 기준에 맞으면 세계는 有道한 것이고, 맞지 않으면 無道한 것이 된다. 하지만 老子에게 있어 자신의 기준이란 없으며, 오직 自然이 존재할 뿐이다. 모든 만물은 이 自然을 따름으로써 자연스레 자유를 획득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老子는 自然을 좇을 뿐이며, 그의 정치철학 역시 自然의 사회적 확장에 다름 아니다.
5. 결론
百家爭鳴은 亂世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이 중 특히 의미 있는 학파가 儒, 墨, 道, 法인데, 유독 道家의 철학만이 다른 학파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했다. 즉, 유가, 묵가, 법가는 각기 다른 주장과 이론을 펼침에도 본질적으로 닮아 있지만, 도가는 이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 묵, 법은 세계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名이라 이름 붙였으며, 규범으로 구체화시켰고, 법으로 정하였고, 이윽고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하였다. 세계를 자신들에게 맞추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道家, 특히 老子는 이들과 달랐다. 그는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저들의 名 때문이며, 모든 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老子는 名을 부정함으로써 無名을 세웠고, 人爲를 제거함으로써 無爲의 정치를 꿈꿨으며,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삭제한 그 지점에 自然을 대입시켰다.
이상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儒, 墨, 法은 作爲의 철학이다. 그래서 무엇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老子의 철학은 無作爲의 철학이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시도는 그만 두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作爲와 無作爲의 차이에서 老子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無作爲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겠노라는 그 無作爲가 아니라, 원래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無作爲이다. 無作爲함으로써 作爲, 즉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렇게 된 연후에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老子의 자유 개념은 百家의 다른 이론들과 대비됨으로써 그 성질이 규명될 수 있다. 老子는 이 자유 개념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드넓은 공적인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자유의 정치, 無爲의 정치, 自然에 입각한 정치를 꿈꿨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老子』
김충열, 『노자 강의』, 예문서원, 2004
오상무, 「『老子』의 有, 無, 道의 관계 再論」, 『동서철학연구』제36호, 2005
老子의 정치철학이 名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므로 그는 온갖 인위적인 사회 체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상향이란 또 다른 名으로서의 無名의 세계가 아니다. 만약 老子가 無名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세계의 조각을 맞추려고 했다면, 그 역시 원래의 名에 새로운 名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無名의 道에 입각한 정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名이란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구분성과 규정성을 근본속성으로 한다. 이름을 통해서 구분하고 규정하는 행위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철저히 언어적이다. 그래서 無名의 정치는 不言의 정치로도 표현된다. ‘言’의 본뜻은 ‘말하다’이다. 갑골문에서 ‘言’字는 혀가 앞으로 뻗은 모양이다. 오상무, 앞의 논문, 253쪽.
그것이 ‘말’, ‘말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파생된다.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론적으로는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적 혹은 법적 규범 및 그것을 지키도록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不言이란 바로 이러한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老子』序는 이러한 언어적 행위를 부정하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고, 이를 ‘不言의 교화’라고 말한다. 그것은 통치자가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을 저절로 교화시키는 정치이다. 『老子』, 3장, “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老子』序에는 不言의 교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런데 『莊子』에는 왕태라는 전과자의 우화를 통하여 不言의 교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不言의 교화란 말로 가르치거나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암암리에 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사람, 같은 논문, 253.
道(無)의 정치론적 의미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람, 같은 논문, 253~254쪽.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자는 백성에 대한 교화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역할과 사회 규범을 온통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것들이 원래의 모습에서 왜곡되어, 즉 名에 의해 본질이 가려져서 백성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老子의 정치철학은 비판의 철학이다. 유가와 법가가 쌓아올린 名의 세계를 驅逐하여 자연을 닮은 세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老子의 정치철학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小國寡民을 국가 부정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으며, 無名으로서의 정치철학을 정치 부정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철학, 즉 儒法에 대한 일갈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정치의 풍경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며, 이 이상적인 정치에는 지극히 자유로운 백성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극히 자유로운 백성이란 단순히 소극적인 자유에 머물지 않고, 自然 그 자체를 닮아감으로써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子가 비록 소극적이고, 은둔적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정치철학은 모든 백성이 본성대로 살게끔 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無名을 통해 名을 비판함으로써 名에 의한 왜곡을 바로 잡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老子의 無名이 갖는 사회적 함의이며, 정치철학적 가치이다. 유가와 법가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그 기준에 맞으면 세계는 有道한 것이고, 맞지 않으면 無道한 것이 된다. 하지만 老子에게 있어 자신의 기준이란 없으며, 오직 自然이 존재할 뿐이다. 모든 만물은 이 自然을 따름으로써 자연스레 자유를 획득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老子는 自然을 좇을 뿐이며, 그의 정치철학 역시 自然의 사회적 확장에 다름 아니다.
5. 결론
百家爭鳴은 亂世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이 중 특히 의미 있는 학파가 儒, 墨, 道, 法인데, 유독 道家의 철학만이 다른 학파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했다. 즉, 유가, 묵가, 법가는 각기 다른 주장과 이론을 펼침에도 본질적으로 닮아 있지만, 도가는 이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 묵, 법은 세계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名이라 이름 붙였으며, 규범으로 구체화시켰고, 법으로 정하였고, 이윽고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하였다. 세계를 자신들에게 맞추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道家, 특히 老子는 이들과 달랐다. 그는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저들의 名 때문이며, 모든 혼란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老子는 名을 부정함으로써 無名을 세웠고, 人爲를 제거함으로써 無爲의 정치를 꿈꿨으며,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삭제한 그 지점에 自然을 대입시켰다.
이상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儒, 墨, 法은 作爲의 철학이다. 그래서 무엇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老子의 철학은 無作爲의 철학이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시도는 그만 두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作爲와 無作爲의 차이에서 老子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無作爲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겠노라는 그 無作爲가 아니라, 원래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無作爲이다. 無作爲함으로써 作爲, 즉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렇게 된 연후에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老子의 자유 개념은 百家의 다른 이론들과 대비됨으로써 그 성질이 규명될 수 있다. 老子는 이 자유 개념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드넓은 공적인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자유의 정치, 無爲의 정치, 自然에 입각한 정치를 꿈꿨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老子』
김충열, 『노자 강의』, 예문서원, 2004
오상무, 「『老子』의 有, 無, 道의 관계 再論」, 『동서철학연구』제36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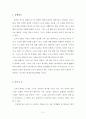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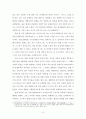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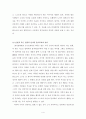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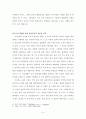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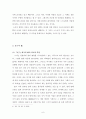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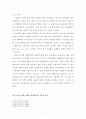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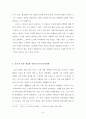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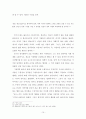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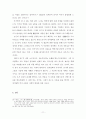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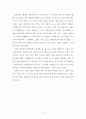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