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전쟁의 전개와 결과
3. 7세기 전쟁을 보는 관점
4. 맺음말
2. 전쟁의 전개와 결과
3. 7세기 전쟁을 보는 관점
4. 맺음말
본문내용
있으며 어떤 이유로 그것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7세기 국제전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7세기 이후의 한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이냐, 남북국 시대이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7세기 국제전의 성격 역시 삼국을 통합하기 위한 신라의 통일전쟁으로써 규정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신라는 단지 옛 고구려 영토 이남의 땅을 병합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전쟁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행 교과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사실화함과 동시에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가 정말 삼국을 통일했다면 한민족의 나라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남북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국(北國)이란 즉 발해, 고구려의 영역 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며 일어난 나라이다. 발해를 한국사의 내포영역 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신라 삼국통일설은 그러한 전제 내에서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발해를 한국사로 포함시킴과 동시에 신라의 삼국통일을 사실화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발해가 한국사가 아니든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은 발해가 우리 민족의 국가라는 역사적 근거 앞에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후학(後學)들의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내 준다.
삼국통일론을 이루는 가장 큰 근간이었던 일통삼한론, 이는 7세기 신라가 정복전쟁을 완수한 후 새로이 수립된 지배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지배계급들의 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은 곧, 하나로 통합된 한반도 내에서 그들에 반기를 드는 옛 지역의 유민들을 꺾어누르고 그들의 의식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층들에 의해 발현된 이러한 의식은 물론 옛 지역 출신의 유민들이나 피지배계급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배계급에 있어서는 피지배계급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적 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통삼한론이라는, 마치 전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상인 것처럼 과장되어 있는 역사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훗날 신라 말기에 궁예(弓睿)와 견훤(甄萱)이 각기 고구려와 백제의 계승을 표방했을 때, 이에 각지의 지방세력이 이들에게 호응하여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된다.
7세기 국제전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7세기 이후의 한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이냐, 남북국 시대이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7세기 국제전의 성격 역시 삼국을 통합하기 위한 신라의 통일전쟁으로써 규정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신라는 단지 옛 고구려 영토 이남의 땅을 병합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전쟁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행 교과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사실화함과 동시에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가 정말 삼국을 통일했다면 한민족의 나라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남북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국(北國)이란 즉 발해, 고구려의 영역 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며 일어난 나라이다. 발해를 한국사의 내포영역 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신라 삼국통일설은 그러한 전제 내에서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발해를 한국사로 포함시킴과 동시에 신라의 삼국통일을 사실화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발해가 한국사가 아니든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은 발해가 우리 민족의 국가라는 역사적 근거 앞에서 신라의 삼국통일론이 후학(後學)들의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내 준다.
삼국통일론을 이루는 가장 큰 근간이었던 일통삼한론, 이는 7세기 신라가 정복전쟁을 완수한 후 새로이 수립된 지배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지배계급들의 의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은 곧, 하나로 통합된 한반도 내에서 그들에 반기를 드는 옛 지역의 유민들을 꺾어누르고 그들의 의식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층들에 의해 발현된 이러한 의식은 물론 옛 지역 출신의 유민들이나 피지배계급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배계급에 있어서는 피지배계급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적 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통삼한론이라는, 마치 전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한 사상인 것처럼 과장되어 있는 역사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훗날 신라 말기에 궁예(弓睿)와 견훤(甄萱)이 각기 고구려와 백제의 계승을 표방했을 때, 이에 각지의 지방세력이 이들에게 호응하여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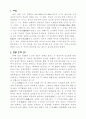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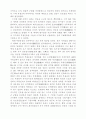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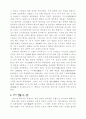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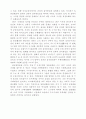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