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진 아름드리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담한 수법은 중국이나 일본등의 건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옛 장인들의 특출한 기법으로 자연과의 밀도 높은 조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8. 극 락 전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조선시대(1702년)
지정연월일 : 1986년 12월 5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35
이 건물은 조선 숙종 28년(170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多包式)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 중앙에 불상을 안치(安置)하였다.
이고주(二高柱) 오량(五樑)의 가구(架構)로 고주(高柱)위에 대량(大樑)이 걸리고 그 위는 우물반자를 가설(架設)하여 천장을 꾸몄으며, 공포는 쇠서가 뻐드러져 있고 첨차 아랫부분이 직선에 가깝게 마무리 되는등 조선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기단(基壇)으로, 보통 가구식(架構式) 기단(基壇)이라고 부르는 신라시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대(地臺), 면석(面石), 갑석(甲石)이 남아있고, 갑석(甲石)의 모퉁이는 ㄱ자형(字型)으로 만들고 꺾이는 곳에 물매를 주어서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전면(前面) 중앙에는 계단이 있고 방형(方形)의 초석(礎石)과 고막이돌, 신방석(信枋石)등도 그대로 남아있다.
9. 부 도 군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17~18세기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35
동화사 입구인 동화문을 지나 돌다리 북편에 자리한 부도밭에 모셔진 이 부도들은 금당암 앞의 도학동 석조부도 (보물 601호)에 비해 그 제작기법이나 양식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조선 후기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도군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에 걸쳐 조성된 것인데, 그 형식이 다양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부도의 주인공들을 남에서 북으로 번호를 붙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조성년대)
1호 성암당해정대사탑 (聖巖堂海淨大師塔, 1839)- 석종형, 높이 215㎝
2호 제월당대사탑 (霽月堂大師塔,1927)- 높이 332㎝
3호 기성대사탑 (箕城大師塔,1764)- 높이 234㎝
4호 성임당축존대사탑 (性任堂竺尊大師塔,1700)- 석종형, 높이 233㎝
5호 고운당 묘탑 (孤雲堂墓塔,1676)- 석종형, 높이 188㎝
6호 함우당묘탑 (涵宇堂墓塔,1720)- 높이 265㎝
7호 무명의 부도 (無名 ,?)- 높이 241㎝
8호 상봉정원대사탑 (霜峯淨源大師塔,1709)- 높이 251㎝
9호 계영당극린대사탑 (桂影堂克麟大師塔, 1692)- 높이 229㎝
10호 고한당묘탑 (孤閑堂墓塔, ?)- 높이 141㎝
10.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4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고려시대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0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124-1
염불암의 극락전 뒷쪽에 있는 염불바위의 양면에 여래상과 보살상이 좌우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서쪽면에 새겨진 여래상은 아미타여래로 추정되며 높이 4m의 좌상이다. 구름무늬 위에 새겨진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천상세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양무릎이 넓어 안정감이 있으며 머리는 소발(素髮)에 육계는 작은 편이다. 네모진 비만형의 얼굴은 치켜 올라간 긴 눈과 두툼한 코, 얇은 입술로 인해 투박한 인상을 주며, 우견편단(右肩偏袒)의 얇은 법의에는 단절된 몇겹의 옷주름이 잡혀 있다.
남쪽면에 새겨진 보살상은 관음보살로 추정되며 전체높이 4.5m의 좌상이다.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듯하나 법의가 하부로 길게 흘러 내려 양무릎을 덮고 있어 좌우의 양다리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상호는 방형으로 두볼과 턱이 통통하며 입과 코 사이가 붙어 있는 듯하여 기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살상이 천의와 군의를 걸치는데 비해 우견편단으로 입혀진 착의법은 다른 보살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이 양 불상은 조각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11. 염불암 청석탑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9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고려시대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0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124-1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인 염불암의 경내에 위치한 이 탑은 탑신이 없고 3단의 화강암 지대석 위에 옥개석만 포개져 있는 형태이다. 탑신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옥개석의 크기와 지대석의 넓이로 보아 탑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륜부는 재질이 다른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것이 아닌 듯 하다.
방형의 흑색 점판암으로 조성된 옥개석은 10층까지 남아 있으나, 아랫부분 3층과 윗부분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파손이 극심해 각층마다 낙수면에 돌을 괴어 옥개석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각 옥개석은 두께가 얇고 낙수면이 평평하며 네 귀퉁이의 끝이 위로 살짝 들어 올려져 매우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탑으로 보인다.
옥개석의 체감율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넓은 지대석 위에 놓여진 작은 탑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각 옥개석의 선각이나 단아한 낙수면의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한 청석탑의 일례로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쉽게 찾아보기 힘든 탑이다.
12. 사명대사 유물
현재 동화사에는 사명 대사가 영남도총섭으로서 승군을 지휘했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영남도총섭 인장, 승병을 지휘 할때 썼다는 소라나팔, 금강저, 수저, 요령등의 유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사명 대사는 조선 선조 때 고승으로 임진왜란때 승군을 통솔하여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분이시다.
속성은 임씨, 자는 이환, 호는 사명, 또는 송운, 시호는 자통홍제존자이다.
조사전에 봉안된 사명 대사 진영은 간결한 필선과 화려한 채색등으로 대사의 인품과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진영의 제작 시기는 가경년간(1796~1820)이라 표시되어 있다.
8. 극 락 전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조선시대(1702년)
지정연월일 : 1986년 12월 5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35
이 건물은 조선 숙종 28년(170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多包式)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 중앙에 불상을 안치(安置)하였다.
이고주(二高柱) 오량(五樑)의 가구(架構)로 고주(高柱)위에 대량(大樑)이 걸리고 그 위는 우물반자를 가설(架設)하여 천장을 꾸몄으며, 공포는 쇠서가 뻐드러져 있고 첨차 아랫부분이 직선에 가깝게 마무리 되는등 조선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기단(基壇)으로, 보통 가구식(架構式) 기단(基壇)이라고 부르는 신라시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대(地臺), 면석(面石), 갑석(甲石)이 남아있고, 갑석(甲石)의 모퉁이는 ㄱ자형(字型)으로 만들고 꺾이는 곳에 물매를 주어서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전면(前面) 중앙에는 계단이 있고 방형(方形)의 초석(礎石)과 고막이돌, 신방석(信枋石)등도 그대로 남아있다.
9. 부 도 군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17~18세기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35
동화사 입구인 동화문을 지나 돌다리 북편에 자리한 부도밭에 모셔진 이 부도들은 금당암 앞의 도학동 석조부도 (보물 601호)에 비해 그 제작기법이나 양식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조선 후기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도군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에 걸쳐 조성된 것인데, 그 형식이 다양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부도의 주인공들을 남에서 북으로 번호를 붙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조성년대)
1호 성암당해정대사탑 (聖巖堂海淨大師塔, 1839)- 석종형, 높이 215㎝
2호 제월당대사탑 (霽月堂大師塔,1927)- 높이 332㎝
3호 기성대사탑 (箕城大師塔,1764)- 높이 234㎝
4호 성임당축존대사탑 (性任堂竺尊大師塔,1700)- 석종형, 높이 233㎝
5호 고운당 묘탑 (孤雲堂墓塔,1676)- 석종형, 높이 188㎝
6호 함우당묘탑 (涵宇堂墓塔,1720)- 높이 265㎝
7호 무명의 부도 (無名 ,?)- 높이 241㎝
8호 상봉정원대사탑 (霜峯淨源大師塔,1709)- 높이 251㎝
9호 계영당극린대사탑 (桂影堂克麟大師塔, 1692)- 높이 229㎝
10호 고한당묘탑 (孤閑堂墓塔, ?)- 높이 141㎝
10.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4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고려시대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0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124-1
염불암의 극락전 뒷쪽에 있는 염불바위의 양면에 여래상과 보살상이 좌우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서쪽면에 새겨진 여래상은 아미타여래로 추정되며 높이 4m의 좌상이다. 구름무늬 위에 새겨진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천상세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양무릎이 넓어 안정감이 있으며 머리는 소발(素髮)에 육계는 작은 편이다. 네모진 비만형의 얼굴은 치켜 올라간 긴 눈과 두툼한 코, 얇은 입술로 인해 투박한 인상을 주며, 우견편단(右肩偏袒)의 얇은 법의에는 단절된 몇겹의 옷주름이 잡혀 있다.
남쪽면에 새겨진 보살상은 관음보살로 추정되며 전체높이 4.5m의 좌상이다.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듯하나 법의가 하부로 길게 흘러 내려 양무릎을 덮고 있어 좌우의 양다리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상호는 방형으로 두볼과 턱이 통통하며 입과 코 사이가 붙어 있는 듯하여 기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살상이 천의와 군의를 걸치는데 비해 우견편단으로 입혀진 착의법은 다른 보살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이 양 불상은 조각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11. 염불암 청석탑
지정번호 :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9호
소 유 자 : 동 화 사
시 대 : 고려시대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0일
소 재 지 : 동구 도학동 산 124-1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인 염불암의 경내에 위치한 이 탑은 탑신이 없고 3단의 화강암 지대석 위에 옥개석만 포개져 있는 형태이다. 탑신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옥개석의 크기와 지대석의 넓이로 보아 탑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륜부는 재질이 다른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것이 아닌 듯 하다.
방형의 흑색 점판암으로 조성된 옥개석은 10층까지 남아 있으나, 아랫부분 3층과 윗부분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파손이 극심해 각층마다 낙수면에 돌을 괴어 옥개석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각 옥개석은 두께가 얇고 낙수면이 평평하며 네 귀퉁이의 끝이 위로 살짝 들어 올려져 매우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탑으로 보인다.
옥개석의 체감율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넓은 지대석 위에 놓여진 작은 탑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각 옥개석의 선각이나 단아한 낙수면의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한 청석탑의 일례로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쉽게 찾아보기 힘든 탑이다.
12. 사명대사 유물
현재 동화사에는 사명 대사가 영남도총섭으로서 승군을 지휘했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영남도총섭 인장, 승병을 지휘 할때 썼다는 소라나팔, 금강저, 수저, 요령등의 유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사명 대사는 조선 선조 때 고승으로 임진왜란때 승군을 통솔하여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던 분이시다.
속성은 임씨, 자는 이환, 호는 사명, 또는 송운, 시호는 자통홍제존자이다.
조사전에 봉안된 사명 대사 진영은 간결한 필선과 화려한 채색등으로 대사의 인품과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진영의 제작 시기는 가경년간(1796~1820)이라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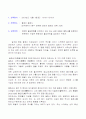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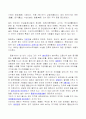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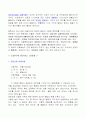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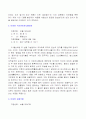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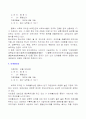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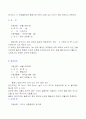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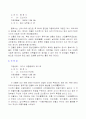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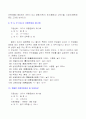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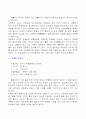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