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니체의 생애와 저서
2. 니체의 건강, 질병 그리고 세계관
3. 도덕의 부정과 反 基督敎
4. 니체와 데카당스의 변증법
5. 데카당스와 모더니티
2. 니체의 건강, 질병 그리고 세계관
3. 도덕의 부정과 反 基督敎
4. 니체와 데카당스의 변증법
5. 데카당스와 모더니티
본문내용
서 니체는 데카당스의 징조와 그 본질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에 대해 전문가가 된 것이다.
변증법이란 간단히 말해 대립자의 통일을 말한다. 니체의 경우 데카당스의 경험과 데카당스의 극복의 의지가 미묘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당스 없이 힘의 의지(권력에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5. 데카당스와 모더니티
니체의 데카당스 이론은 근대 문화와 예술의 분석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니체는 데카당스 문예사조의 일반적인 조류와는 달리 데카당스 그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전주의, 특히 괴테를 숭배하여 \"고전적인 것은 건강하고 낭만적인 것은 병적이다\" 라는 사상에 동조한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226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삶을 성장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데 일조하는 치료약과 보조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항상 고통과 고통받는 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두 종류의 고통 받는 자가 있는데, 한쪽은 삶의 과잉충만으로 인해 고통받아 삶에 대해 비극적 통찰 및 견해뿐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한 쪽은 삶의 빈곤화로 인해 고통 받는 바, 그들은 예술 및 철학에 대하여 고요, 정적, 잔잔한 바다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격앙, 발작 마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삶 그 자체에 대한 복수는 그토록 빈곤한 이들에게 가장 도발적인 일종의 격동이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227쪽에서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니체는 예술이나 철학 자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그는 삶의 성장과 소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술 내지 철학의 임무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의 임무는 고통 받는 자의 자기 성찰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니체가 일체의 가치의 전도를 주장했을 때 이미 예견된 바의 것이다. 즉 그가 \"시각을 역전시키고 가치를 전도하며 완전성 및 풍부한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의 시각에서 데카당스적 본능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꿈꾸었던 개념이다.
따라서 삶의 과잉충만으로 인해 고통받아 삶에 대해 비극적인 인식을 하는 자에게는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을 성취하게 하고 반대로 삶의 빈곤화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에는 고요와 격정의 변화 및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경우 삶이 몰락해 가는 징조로서의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부정과 혁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의 모더니티는 종래의 고정된 도덕과 가치의 부정과 절대적 생성(生成)의 욕구를 통해 새로운 예술과 철학 그리고 도덕의 창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M. 칼리니스쿠 지음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옮김, 시각과 언어, 서울 1994.
F. 니체 : 『이 사람을 보라』 박준택 번역, 박영사, 서울 1970.
F. 니체 : 『안티 크리스트』,『이 사람을 보라』중에서, 박준택 번역, 박영사, 서울 1970.
변증법이란 간단히 말해 대립자의 통일을 말한다. 니체의 경우 데카당스의 경험과 데카당스의 극복의 의지가 미묘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당스 없이 힘의 의지(권력에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5. 데카당스와 모더니티
니체의 데카당스 이론은 근대 문화와 예술의 분석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니체는 데카당스 문예사조의 일반적인 조류와는 달리 데카당스 그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전주의, 특히 괴테를 숭배하여 \"고전적인 것은 건강하고 낭만적인 것은 병적이다\" 라는 사상에 동조한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226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삶을 성장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데 일조하는 치료약과 보조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것은 항상 고통과 고통받는 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두 종류의 고통 받는 자가 있는데, 한쪽은 삶의 과잉충만으로 인해 고통받아 삶에 대해 비극적 통찰 및 견해뿐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한 쪽은 삶의 빈곤화로 인해 고통 받는 바, 그들은 예술 및 철학에 대하여 고요, 정적, 잔잔한 바다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격앙, 발작 마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삶 그 자체에 대한 복수는 그토록 빈곤한 이들에게 가장 도발적인 일종의 격동이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227쪽에서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니체는 예술이나 철학 자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그는 삶의 성장과 소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술 내지 철학의 임무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의 임무는 고통 받는 자의 자기 성찰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니체가 일체의 가치의 전도를 주장했을 때 이미 예견된 바의 것이다. 즉 그가 \"시각을 역전시키고 가치를 전도하며 완전성 및 풍부한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의 시각에서 데카당스적 본능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꿈꾸었던 개념이다.
따라서 삶의 과잉충만으로 인해 고통받아 삶에 대해 비극적인 인식을 하는 자에게는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을 성취하게 하고 반대로 삶의 빈곤화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에는 고요와 격정의 변화 및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경우 삶이 몰락해 가는 징조로서의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부정과 혁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의 모더니티는 종래의 고정된 도덕과 가치의 부정과 절대적 생성(生成)의 욕구를 통해 새로운 예술과 철학 그리고 도덕의 창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M. 칼리니스쿠 지음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옮김, 시각과 언어, 서울 1994.
F. 니체 : 『이 사람을 보라』 박준택 번역, 박영사, 서울 1970.
F. 니체 : 『안티 크리스트』,『이 사람을 보라』중에서, 박준택 번역, 박영사, 서울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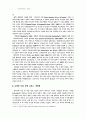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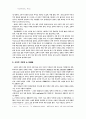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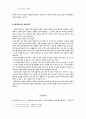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