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장 학문과 교과
Ⅰ. 교육의 함구적 논쟁
Ⅱ. 학문에의 복귀
Ⅲ. 학문중심 교육과정
6장 교과의 가치
Ⅰ. 교과의 정당화 개념으로서의 필요
Ⅱ. 교과의 내재적 정당화
Ⅲ. 필수 교육과정
7.지적 인간과 도덕적 사회
Ⅰ.지식과 합리성
Ⅱ.지적 활동의 도덕적 의미
Ⅲ. 교육과 사회의 딜레마
Ⅰ. 교육의 함구적 논쟁
Ⅱ. 학문에의 복귀
Ⅲ. 학문중심 교육과정
6장 교과의 가치
Ⅰ. 교과의 정당화 개념으로서의 필요
Ⅱ. 교과의 내재적 정당화
Ⅲ. 필수 교육과정
7.지적 인간과 도덕적 사회
Ⅰ.지식과 합리성
Ⅱ.지적 활동의 도덕적 의미
Ⅲ. 교육과 사회의 딜레마
본문내용
는 것은 정보를 그 ‘내재적 증거’에 비추어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 로키치가 열거한 ‘도덕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 신념체계 안에 모순된 신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핍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지적 발달과정에 관한 피아제의 연구는 지적능력과 도덕성 사이의 논리적 관련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곧 아동기 사고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ex)실험 : 즉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양을 고른다.
도덕성의 발달에 관한 피아제의 연구는, 도덕성은 본질상 지적 능력이 도덕적 분야에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논리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지적 능력과 도덕성 사이의 병렬관계를 더욱 산뜻하게 예시하고 있다. 처음 수준에서 하동의 도덕성은 소박한 ‘교환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둘째 수준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명령이나 기대, 또는 사회적인 규칙을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인다.
결국 저자는 ‘인간다운 삶의 형식’이라는 것은 곧 ‘이유를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의상’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현실 사이에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답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육과 사회의 딜레마
만약 도덕적인 개인이 합리적 논의 양식을 따르는 ‘개방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사회는 합리성이 풍미하는 ‘개방된 사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는 이 논리가 ‘사실상으로’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순진한 ‘낭만주의적 환상’이다. 사회적인 장면에 있어서의 완전한 ‘합리적 객관성’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는 이기심에 입각한 상호갈등이 불가피하다. 니버의 책은 사회적이 장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주로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고 있다는 풍부한 사실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니버는 이것을 주로 ‘인간 본성의 약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이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 사회적 장면의 본질에 연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과 사회 사이의 한 가지 근본적이 딜레마에 직면한다. 교육이 일상의 사회적 장면과 다른 점은 그것이 사고나 행동의 ‘정형’을 가르친다는 데에 있다. 결국 교육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헤엄쳐 나가야 좋을지 모르는 채,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길러내어, 가장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또 멀리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이 개인 혼자보다 더 오래 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이다.
인간의 지적 발달과정에 관한 피아제의 연구는 지적능력과 도덕성 사이의 논리적 관련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곧 아동기 사고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ex)실험 : 즉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양을 고른다.
도덕성의 발달에 관한 피아제의 연구는, 도덕성은 본질상 지적 능력이 도덕적 분야에 적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논리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지적 능력과 도덕성 사이의 병렬관계를 더욱 산뜻하게 예시하고 있다. 처음 수준에서 하동의 도덕성은 소박한 ‘교환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둘째 수준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명령이나 기대, 또는 사회적인 규칙을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인다.
결국 저자는 ‘인간다운 삶의 형식’이라는 것은 곧 ‘이유를 추구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의상’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현실 사이에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답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육과 사회의 딜레마
만약 도덕적인 개인이 합리적 논의 양식을 따르는 ‘개방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사회는 합리성이 풍미하는 ‘개방된 사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는 이 논리가 ‘사실상으로’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순진한 ‘낭만주의적 환상’이다. 사회적인 장면에 있어서의 완전한 ‘합리적 객관성’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는 이기심에 입각한 상호갈등이 불가피하다. 니버의 책은 사회적이 장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주로 이기적 충동에 지배되고 있다는 풍부한 사실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니버는 이것을 주로 ‘인간 본성의 약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이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 사회적 장면의 본질에 연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과 사회 사이의 한 가지 근본적이 딜레마에 직면한다. 교육이 일상의 사회적 장면과 다른 점은 그것이 사고나 행동의 ‘정형’을 가르친다는 데에 있다. 결국 교육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느 쪽으로 헤엄쳐 나가야 좋을지 모르는 채,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길러내어, 가장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또 멀리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이 개인 혼자보다 더 오래 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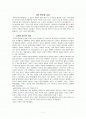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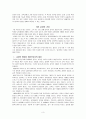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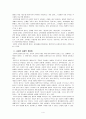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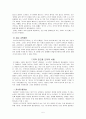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