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게 살기를 당부하였다. 끝의 두 줄은 아비 잃고 섦게 자란 손녀가 시집을 가고나면 자신의 슬픔도 덜어질 거싱라면서 부디 오래 살기를 기원하였다. 그는 10살에 조혼했던 초취부인 왕씨를 서른살에 잃었고, 이런 개인적 불행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슬픔을 극복하여 응결시킨 것이 이시의 정서다. 비록 겉으로는 사실을 나열한 듯하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깊은 슬픔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다. 그의 시를 일러 송시의 설리(說理)와 당시의 정감(情感)을 겸하여 ‘가송입당(駕宋入唐)’했다는 말은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다.
紫霞 申緯公의 墨竹(題紫霞申緯墨竹)
侍郞의 墨竹은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이 그림은 더욱 고요함을 깨뜨리네.
새 흥이 일어나 벽에 높이 걸었더니
창 너머 눈보라가 밤새 스산하구나.
떨기마다 빽빽한 옥같은 대줄기
그림자는 빈 숲 돌 위의 이끼를 쓸고
가까이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서슬 푸른 눈서리가 사람을 찌르네.
생각이 이르러 수염 걷고 붓을 잡을 때
碧盧舫에는 실비가 내리고
많은 사람 가고 공의 손자 춤출 때
사흘동안 뒤적이며 境界碑를 찾았네.
아름답고 참다운 재주로 禪을 깨닫고
맑은 글자마다 蘇東坡에 이르렀다.
응당 한 개 동쪽의 푸른 鸞새 꼬리로
백년동안 虛名을 훔치기는 싫었네.
侍郞墨竹名天下 此作尤堪破寂寥 興至新從高壁掛 隔風雪夜蕭蕭 叢叢密密千竿玉 影掃空林石上苔 却是近前看不得 霜雪鍔刺人來 想到把筆時 碧蘆吟舫雨如絲 千人倒退公孫舞 三日摩索靖碑 大雅眞才妙覺禪 淸詞字字接蘇仙 應嫌一束靑鸞尾 盜竊虛名過百年 (金澤榮全集1, 卷2, 184-5쪽)
이 시는 34살(1883, 계미년)에 지은 작품이다. 자하(紫霞) 신위(申緯)의 묵죽도(墨竹圖)를 걸어놓고 감상하며 신위의 예술과 정신적 경지를 흠모하는 내용이다.
첫 수는 참판을 지낸 신위의 대 그림은 온 세상에 유명하다고 했는데 신위는 시서화(詩書晝) 삼절로 조선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이름이 났었다. 그런 신위의 그림 중 자신이 입수한 이 그림이 더욱 빼어나다고 감탄한 다음에 감흥이 일어나 벽 위에 걸어두고 보니 마침 창밖에 밤새 눈보라가 스산하게 휘날려서 그림의 분의기를 한 층 돋운다는 것이다.
둘째 수는 묵죽도의 세부 묘사다. 떨기마다 빽빽하게 솟아오른 옥같은 대나무 줄기와 대숲 그늘 웅크린 바위에 이끼가 낀 모습을 그렸다. 그림 가까이 다가가서는 맛볼 수 없는 서릿발 같이 날카로운 눈과 서리의 차가움이 선득하게 사람을 찌리는 듯하다고 하여 대 그림에서 느끼는 숨은 홍취를 표현했다. 이렇게 묵죽도의 분위기와 세부 묘사에서 소슬한 아름다움과 그 감흥을 여운으로 느낄 수 있다. 홍취를 중시하는 여운과 함축, 그것이 이른바 신운(神韻)이다.
셋째 수는 신위가 사서화를 창작하거나 탁본 등을 고증하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신위의 서재인 벽로방(碧蘆舫)에 실같은 비가 내릴 때 창작의 구상이 잡히면 수염을 걷고 붓을 잡던 모습을 선연하게 떠올렸고, 김정희(金正喜)와 왕래하며 비문의 탁본을 고증했던 그의 고증학적 탐구의 일면을 상기시켰다.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등에 대한 고증은 사실 김정희가 한 것이고 신위는 청평(淸平)의 문수원비(文殊院碑)를 고증하였지만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마지막 수는 신위의 예술적 경지를 총평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 신위를 평하여 시화서 삼절로 세상에 이름났고, 소식을 스승으로 하여 여러 체에 능했던 광세(曠世)의 기재요, 말기의 대가라고 하였다. 金澤榮, 金澤榮全集1, 앞의 책, 484-5쪽. ‘申紫霞詩集序’ 惟申公之生 直接薑山諸家之踵 以詩晝書三絶 聞於天下 而其詩以蘇子瞻爲師 旁出入于徐陵王摩詰陸務觀之間 瑩瑩乎其悟徹也 乎其馳突也 能艶能野 能幼能實 能拙能豪 能平能險 千情萬狀 隨意牢籠 無不活動 森在目前 使讀者 目眩神醉 如萬舞之方張 五齊之力 可謂具曠世之奇才 窮一代之極變 而翩翩乎其衰晩之大家者矣
이 시에서 신위는 이러한 재주로 만년에 소동파처럼 불교에 기울어 시선일여(詩禪一如)의 경지에 들었는데 당대 조선의 일인자로 만족하지는 않았고 중화문화의 정맥(正脈)을 잇는다는 문인적 자부를 지녔다고 했다. ‘동쪽의 난새 꼬리’라는 말은 조선의 일인자로만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위의 묵죽도를 감상하면서 그 그림이 전하는 신운을 재현해 보려 하였다. 이렇게 신운 깃든 시를 지어 당시(唐詩)의 경지에 넘보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풍은 송시적 설리(說理)와 직설적 감흥을 표현한 시도 많지만 이른바 ‘가송입당(駕宋入唐)’의 특징,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唐詩)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를 쓰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김택영은 한말사가(韓末四家)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이건창의 추천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늦게 급제하여 편사국 주사가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러 역사서와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조의 마지막 한시 작가라고 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삶과 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유민(遺民)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려와 개성에 대한 애착,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겠다는 강한 포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과 역사기록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외로 망명하여 절의를 지킨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을 그의 한시 작품에 관련시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고려와 개성에 연관된 산천과 인물, 나아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유민의식을 드러내었다.
둘째, 그는 조선말기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에 대한 정감을 매우 절실하고 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만큼 그는 조선조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의식했는데, 이것은 배척받았던 개성사람이 지닌 유민의식의 한계일 것이다. 셋째, 역사에 대한 의식을 시로 표현하여 민족 수난의 역사를 증언하고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망명절의를 드러내었다.
넷째, 그의 시풍은 송시적 특징과 당시적 특징을 절충한 ‘가송입당(駕宋入唐)’,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적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끝으로 그는 한국 한시의 종장을 장식하는 시인으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중국 시인에게 손색이 없는 작품을 썼다고 할 것이다.
紫霞 申緯公의 墨竹(題紫霞申緯墨竹)
侍郞의 墨竹은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이 그림은 더욱 고요함을 깨뜨리네.
새 흥이 일어나 벽에 높이 걸었더니
창 너머 눈보라가 밤새 스산하구나.
떨기마다 빽빽한 옥같은 대줄기
그림자는 빈 숲 돌 위의 이끼를 쓸고
가까이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서슬 푸른 눈서리가 사람을 찌르네.
생각이 이르러 수염 걷고 붓을 잡을 때
碧盧舫에는 실비가 내리고
많은 사람 가고 공의 손자 춤출 때
사흘동안 뒤적이며 境界碑를 찾았네.
아름답고 참다운 재주로 禪을 깨닫고
맑은 글자마다 蘇東坡에 이르렀다.
응당 한 개 동쪽의 푸른 鸞새 꼬리로
백년동안 虛名을 훔치기는 싫었네.
侍郞墨竹名天下 此作尤堪破寂寥 興至新從高壁掛 隔風雪夜蕭蕭 叢叢密密千竿玉 影掃空林石上苔 却是近前看不得 霜雪鍔刺人來 想到把筆時 碧蘆吟舫雨如絲 千人倒退公孫舞 三日摩索靖碑 大雅眞才妙覺禪 淸詞字字接蘇仙 應嫌一束靑鸞尾 盜竊虛名過百年 (金澤榮全集1, 卷2, 184-5쪽)
이 시는 34살(1883, 계미년)에 지은 작품이다. 자하(紫霞) 신위(申緯)의 묵죽도(墨竹圖)를 걸어놓고 감상하며 신위의 예술과 정신적 경지를 흠모하는 내용이다.
첫 수는 참판을 지낸 신위의 대 그림은 온 세상에 유명하다고 했는데 신위는 시서화(詩書晝) 삼절로 조선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이름이 났었다. 그런 신위의 그림 중 자신이 입수한 이 그림이 더욱 빼어나다고 감탄한 다음에 감흥이 일어나 벽 위에 걸어두고 보니 마침 창밖에 밤새 눈보라가 스산하게 휘날려서 그림의 분의기를 한 층 돋운다는 것이다.
둘째 수는 묵죽도의 세부 묘사다. 떨기마다 빽빽하게 솟아오른 옥같은 대나무 줄기와 대숲 그늘 웅크린 바위에 이끼가 낀 모습을 그렸다. 그림 가까이 다가가서는 맛볼 수 없는 서릿발 같이 날카로운 눈과 서리의 차가움이 선득하게 사람을 찌리는 듯하다고 하여 대 그림에서 느끼는 숨은 홍취를 표현했다. 이렇게 묵죽도의 분위기와 세부 묘사에서 소슬한 아름다움과 그 감흥을 여운으로 느낄 수 있다. 홍취를 중시하는 여운과 함축, 그것이 이른바 신운(神韻)이다.
셋째 수는 신위가 사서화를 창작하거나 탁본 등을 고증하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신위의 서재인 벽로방(碧蘆舫)에 실같은 비가 내릴 때 창작의 구상이 잡히면 수염을 걷고 붓을 잡던 모습을 선연하게 떠올렸고, 김정희(金正喜)와 왕래하며 비문의 탁본을 고증했던 그의 고증학적 탐구의 일면을 상기시켰다.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등에 대한 고증은 사실 김정희가 한 것이고 신위는 청평(淸平)의 문수원비(文殊院碑)를 고증하였지만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마지막 수는 신위의 예술적 경지를 총평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 신위를 평하여 시화서 삼절로 세상에 이름났고, 소식을 스승으로 하여 여러 체에 능했던 광세(曠世)의 기재요, 말기의 대가라고 하였다. 金澤榮, 金澤榮全集1, 앞의 책, 484-5쪽. ‘申紫霞詩集序’ 惟申公之生 直接薑山諸家之踵 以詩晝書三絶 聞於天下 而其詩以蘇子瞻爲師 旁出入于徐陵王摩詰陸務觀之間 瑩瑩乎其悟徹也 乎其馳突也 能艶能野 能幼能實 能拙能豪 能平能險 千情萬狀 隨意牢籠 無不活動 森在目前 使讀者 目眩神醉 如萬舞之方張 五齊之力 可謂具曠世之奇才 窮一代之極變 而翩翩乎其衰晩之大家者矣
이 시에서 신위는 이러한 재주로 만년에 소동파처럼 불교에 기울어 시선일여(詩禪一如)의 경지에 들었는데 당대 조선의 일인자로 만족하지는 않았고 중화문화의 정맥(正脈)을 잇는다는 문인적 자부를 지녔다고 했다. ‘동쪽의 난새 꼬리’라는 말은 조선의 일인자로만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위의 묵죽도를 감상하면서 그 그림이 전하는 신운을 재현해 보려 하였다. 이렇게 신운 깃든 시를 지어 당시(唐詩)의 경지에 넘보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풍은 송시적 설리(說理)와 직설적 감흥을 표현한 시도 많지만 이른바 ‘가송입당(駕宋入唐)’의 특징,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唐詩)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를 쓰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김택영은 한말사가(韓末四家)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이건창의 추천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늦게 급제하여 편사국 주사가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러 역사서와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조의 마지막 한시 작가라고 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삶과 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유민(遺民)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려와 개성에 대한 애착,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겠다는 강한 포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과 역사기록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외로 망명하여 절의를 지킨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을 그의 한시 작품에 관련시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고려와 개성에 연관된 산천과 인물, 나아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유민의식을 드러내었다.
둘째, 그는 조선말기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에 대한 정감을 매우 절실하고 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만큼 그는 조선조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의식했는데, 이것은 배척받았던 개성사람이 지닌 유민의식의 한계일 것이다. 셋째, 역사에 대한 의식을 시로 표현하여 민족 수난의 역사를 증언하고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망명절의를 드러내었다.
넷째, 그의 시풍은 송시적 특징과 당시적 특징을 절충한 ‘가송입당(駕宋入唐)’,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적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끝으로 그는 한국 한시의 종장을 장식하는 시인으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중국 시인에게 손색이 없는 작품을 썼다고 할 것이다.
추천자료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위한의 <최척전>
조위한의 <최척전>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근대전환기의 문학가 매천(梅泉) 황현(黃玹)
근대전환기의 문학가 매천(梅泉) 황현(黃玹) 2013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칠언시)
2013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칠언시) 장르별 문학 이론 - 시(詩 - 시의 정의와 특성, 시의 요소와 갈래, 시의 운율, 시의 언어와 ...
장르별 문학 이론 - 시(詩 - 시의 정의와 특성, 시의 요소와 갈래, 시의 운율, 시의 언어와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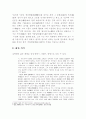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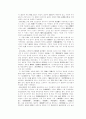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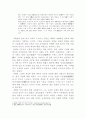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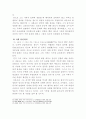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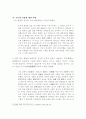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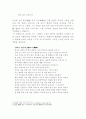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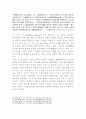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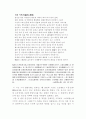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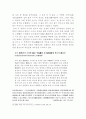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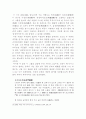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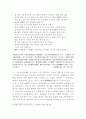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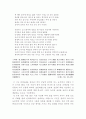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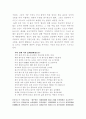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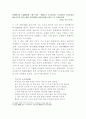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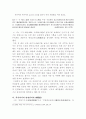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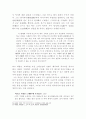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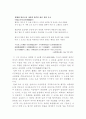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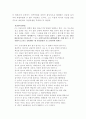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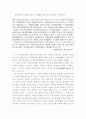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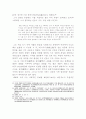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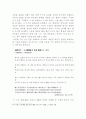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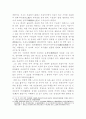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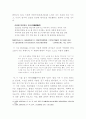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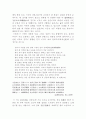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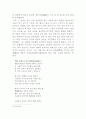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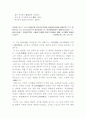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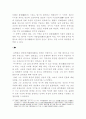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