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II. 이론적 논의
1. TV 토론 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성
2. TV 토론의 기능
3. TV 토론과 이미지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2. 분석 유목 설정
IV. 연구 결과
1. 발언 회수
2. 주장의 특성
3. 영상 언어
V. 결론
VI. 제언 및 한계
VII. 참고 문헌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II. 이론적 논의
1. TV 토론 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성
2. TV 토론의 기능
3. TV 토론과 이미지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2. 분석 유목 설정
IV. 연구 결과
1. 발언 회수
2. 주장의 특성
3. 영상 언어
V. 결론
VI. 제언 및 한계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당 정치인이 근거 없이 단순 주장형에 그치는 경우와 야당 정치인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수 집단의 참여가 숫자 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설득 지향형 주장을 하여 생산적인 논의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또한 특징적이다. SBS의 <이것이 여론이다>는 토론자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는 공론의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고, 의견의 다양성과 토론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세 번째 연구 문제였던 영상 언어 분석은 방송사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스크린 구성에 약간의 참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는 어차피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저예산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큰 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질적 분석이라 할지라도 내용 분석을 통해서는 영상 언어가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뿐, 제작자나 사회자, 또는 토론참여자의 본래 의도는 알 수 없었다.
VI. 제언 및 한계
한 번에 많은 것을 알아 보려고 하였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 연구였다. 그러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은 또한 논리성에 있어서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느꼈던 본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를 회수로만 측정한다는 것은 오차를 낳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BS의 경우에는 패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회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언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를 토론 내의 문제로 적용하자면, 개인 별로 똑같이 다섯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둘이 토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발언 회수라는 것도 그 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 주제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절대적인 수치로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네 명만 참여한 토론은 네 명 모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치인 둘, 타 집단 여섯 명 정도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정치인들의 발언 회수가 많기는 하겠지만 앞의 경우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주장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 교사 및 강사 직업군에 속하는 참여자는 정창현 교장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적인 성격이 논의 진행에 미쳤을 영향을 감안한다면, 정 교장의 주장의 특성이 교사 및 강사 직업군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취약하다고 여긴 점은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마지막 연구 문제였던 영상 언어에서는 질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의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서베이 연구 또는 인터뷰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유의미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평소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석희 교수님과 쟁점과 토론 수업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VII. 참고 문헌
김환열(200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송종길(2002),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TV토론>,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2000)
오미영 (2004), <토론 VS TV토론>, 서울:역락
이기현안동근(1998), <방송과 정치: 선거방송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이효성(1997),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서울: 나남
책임연구원 나미수(2003-01),, 서울: 한국언론재단
최영묵,김동규 (2002), <현대사회와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
하재창(1996), <하버마스입론>, 서울: 민영사
Blumer,J,G.(1970), in Halloran,J.D. ed. The Effects of Television, Panther.
Chaffee, S. H. & S. Y. Choe, (1980)
세 번째 연구 문제였던 영상 언어 분석은 방송사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스크린 구성에 약간의 참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는 어차피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저예산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큰 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질적 분석이라 할지라도 내용 분석을 통해서는 영상 언어가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뿐, 제작자나 사회자, 또는 토론참여자의 본래 의도는 알 수 없었다.
VI. 제언 및 한계
한 번에 많은 것을 알아 보려고 하였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 연구였다. 그러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은 또한 논리성에 있어서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느꼈던 본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를 회수로만 측정한다는 것은 오차를 낳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BS의 경우에는 패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회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언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를 토론 내의 문제로 적용하자면, 개인 별로 똑같이 다섯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둘이 토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발언 회수라는 것도 그 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 주제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절대적인 수치로서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네 명만 참여한 토론은 네 명 모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치인 둘, 타 집단 여섯 명 정도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정치인들의 발언 회수가 많기는 하겠지만 앞의 경우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주장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 교사 및 강사 직업군에 속하는 참여자는 정창현 교장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적인 성격이 논의 진행에 미쳤을 영향을 감안한다면, 정 교장의 주장의 특성이 교사 및 강사 직업군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취약하다고 여긴 점은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마지막 연구 문제였던 영상 언어에서는 질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의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서베이 연구 또는 인터뷰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유의미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평소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석희 교수님과 쟁점과 토론 수업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VII. 참고 문헌
김환열(2000),
송종길(2002),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TV토론>,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2000)
오미영 (2004), <토론 VS TV토론>, 서울:역락
이기현안동근(1998), <방송과 정치: 선거방송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이효성(1997),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서울: 나남
책임연구원 나미수(2003-01),
최영묵,김동규 (2002), <현대사회와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
하재창(1996), <하버마스입론>, 서울: 민영사
Blumer,J,G.(1970)
Chaffee, S. H. & S. Y. Cho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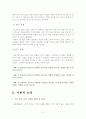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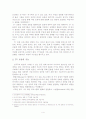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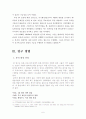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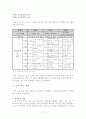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