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중화사상의 의미
1. 중화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중국(中國)'의 의미
2. 중화사상의 주체
3. 중화사상의 코드
Ⅲ. 조선 중화주의
1. 중화사상의 수용과 전파(중화사상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까지)
2. 조선 중화주의의 형성과 의의
3. 조선중화사상의 예
Ⅳ. 나가며
Ⅴ. 참고 자료
Ⅱ. 중화사상의 의미
1. 중화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중국(中國)'의 의미
2. 중화사상의 주체
3. 중화사상의 코드
Ⅲ. 조선 중화주의
1. 중화사상의 수용과 전파(중화사상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까지)
2. 조선 중화주의의 형성과 의의
3. 조선중화사상의 예
Ⅳ. 나가며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것이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랴...
<유인석이 지은 격고문>
...오직 우리나라만이 기범을 계승하고 홀로 주례(周禮)를 보유하여 의연히 변하지 않고 몇 백년을내려왔다. 이는 윤상(倫常)의 밝음과 문물의 빛남이 중국의 요,순 삼대(三代)에 비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이다. 드디어 당당한 중화예의지방(中華禮儀之邦)이 되어 천하만국에 칭송받는 바 되었으니 일천지하에 우리나라가 존재함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조선이야말로 유교의 중화문화를 이룩하여 그 이념을 실현, 이상국가가 되어 천하만국의 칭송을 듣는 예의 나라가 되었다는 자긍심에 차있다. 따라서 국가가 500년간 배양한 힘을 이제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아 배양한 사(士)의 저력을 국가위기에 당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의 표현이다. 여기까지는 조선왕조가 자신들을 키워 낸 모태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
3.3. 정조의 문화정책
조선 정조(正祖·1752∼1800) (재위기간 1777∼1800)시대는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로 통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변혁의 꿈틀거림이 마치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나는 유럽 문예부흥기의 열기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변혁의 중심축은 정조 자신이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밑에서 학문에 정진,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정조시대에 편찬된 문헌 목록집인 군서표기(群書標記)를 보면 1백40여종 4천권에 이르는 문헌이 편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황제의 재위기간 중 고작 200∼300권 남짓한 책을 낼 경우 학문의 업적을 인정받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대단한 결과물이다.
정조가 직접 편찬을 주관한 어정서(御定書)와 규장각(규장각) 각신(각신)들을 비롯한 국왕 측근의 신료들이 분담하여 편찬한 명찬서(命撰書)가 사료의 핵심이 됐다. 정조대 학문연구의 중추기관은 규장각이었다. 학문을 즐겨 신료들과 토론하기를 즐긴 정조는 정약용 등 인재들을 중용, 이곳을 자료의 수집과 정리·편찬의 산실로 삼았다. 연구서에 따르면 정조는 박학(博學)보다는 요약을, 학습보다는 실천을 강조했다. 그래서 경서의 원문만 수록한 정본(正本)이나 원문을 요약한 선본(選本), 그리고 원문의 주석을 집성한 책들이 많이 편찬됐다. 정조는 시문의 선발 작업에도 직접 가담했다. 그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조선중화주의였는데 \"우리 동국에서 태어난 이상 마땅히 우리 동국의 본색(本色)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4.진경산수화
진경 산수화는 18세기에 조선중화사상이 강화되면서 미술에도 조선 고유색이 더욱 발전하게 된 예이다. 사대부화가들이 앞장서서 조선의 진경과 풍속을 그려냄으로써 화원들도 이에 뒤따르게 되었다. 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畵風)을 확립하고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은 풍속화풍을 현재 심사정(1707~1769)이 남종문인화풍을 정립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사인(士人) 삼재(三齋)라 하여 진경산수와 풍속을 그려내어 조선 국화풍의 시조가 된 사람들이다. 특히, 겸재 정선에 의해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회화기법과 중국의 남종화기법을 종합하여 금강산준법 같은 독자적인 화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단원 김홍도는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의 새 장을 열었는데 풍속 인물뿐 아니라 도석(道釋·도교와 불교)과 고사 인물에서조차 모두 당시의 조선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 이는 철저한 조선중화의식의 단편적인 예이다. 그는 노자도 조선 노인으로, 달마대사도 조선 선승의 모습으로 그렸다. 심지어 관세음보살마저도 조선 어머니의 모습이다. 꽃과 새와 나비, 물고기 풀 등도 조선 생태의 철저한 사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Ⅳ. 나가며
중화사상을 고대의 시대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넓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고,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모방하고 담지하려는 의지를 보아서 그 중독성과 경배성이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은 더 이상 과거의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발전을 함께 이룩해 나감으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은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중화주의 자체를 중국의 속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로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된 시대정신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혹자는 조선중화사상을 비꼬아 숲 속에 호랑이가 사라지자 여우가 왕처럼 나서는 꼴이라며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편협한 견해는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나온 왜곡된 표현이며, 오히려 이등국가임을 자처하고 눌러앉는 소인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에 제시된 사례 등을 통해서 조선 즉, 조선전기가 외래사상인 성리학과 그 사상을 지닌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조선후기는 지도, 역사, 회화 등 각 방면으로 조선 고유문화를 창조하고 조선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시대정신으로 볼 수 있다 .
1880년대부터 경험한 일본 및 서양의 합리화 논리인 개화론을 부정하고 조선은 이미 문명국이고 조선만이 보존하고 있는 유교윤리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논리는 당시대에 있어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지만, 서구문명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음미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참고자료
정옥자,「(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 일지사,1998)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서울 : 일지사, 1993)
유미림,「조선 후기의 정치사상」 (서울 : 지식산업사, 2002)
이춘식,「中華思想의 理解」 (서울 : 신서원, 2002)
갈검웅,「중국통일, 중국분열」 (서울, 신서원, 1996)
Anderson, Benedict R. O\'G,「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서울 : 나남출판, 2002)
이성규, 「민족주의의 철학적 성찰 :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한국철학회, 1992)
정옥자, 「19세기 중화사상의 위상과 역사적 성격」 (한국학보 76집, 1994)
<유인석이 지은 격고문>
...오직 우리나라만이 기범을 계승하고 홀로 주례(周禮)를 보유하여 의연히 변하지 않고 몇 백년을내려왔다. 이는 윤상(倫常)의 밝음과 문물의 빛남이 중국의 요,순 삼대(三代)에 비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이다. 드디어 당당한 중화예의지방(中華禮儀之邦)이 되어 천하만국에 칭송받는 바 되었으니 일천지하에 우리나라가 존재함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조선이야말로 유교의 중화문화를 이룩하여 그 이념을 실현, 이상국가가 되어 천하만국의 칭송을 듣는 예의 나라가 되었다는 자긍심에 차있다. 따라서 국가가 500년간 배양한 힘을 이제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아 배양한 사(士)의 저력을 국가위기에 당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의 표현이다. 여기까지는 조선왕조가 자신들을 키워 낸 모태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
3.3. 정조의 문화정책
조선 정조(正祖·1752∼1800) (재위기간 1777∼1800)시대는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로 통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변혁의 꿈틀거림이 마치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나는 유럽 문예부흥기의 열기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변혁의 중심축은 정조 자신이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밑에서 학문에 정진,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정조시대에 편찬된 문헌 목록집인 군서표기(群書標記)를 보면 1백40여종 4천권에 이르는 문헌이 편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황제의 재위기간 중 고작 200∼300권 남짓한 책을 낼 경우 학문의 업적을 인정받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대단한 결과물이다.
정조가 직접 편찬을 주관한 어정서(御定書)와 규장각(규장각) 각신(각신)들을 비롯한 국왕 측근의 신료들이 분담하여 편찬한 명찬서(命撰書)가 사료의 핵심이 됐다. 정조대 학문연구의 중추기관은 규장각이었다. 학문을 즐겨 신료들과 토론하기를 즐긴 정조는 정약용 등 인재들을 중용, 이곳을 자료의 수집과 정리·편찬의 산실로 삼았다. 연구서에 따르면 정조는 박학(博學)보다는 요약을, 학습보다는 실천을 강조했다. 그래서 경서의 원문만 수록한 정본(正本)이나 원문을 요약한 선본(選本), 그리고 원문의 주석을 집성한 책들이 많이 편찬됐다. 정조는 시문의 선발 작업에도 직접 가담했다. 그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조선중화주의였는데 \"우리 동국에서 태어난 이상 마땅히 우리 동국의 본색(本色)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4.진경산수화
진경 산수화는 18세기에 조선중화사상이 강화되면서 미술에도 조선 고유색이 더욱 발전하게 된 예이다. 사대부화가들이 앞장서서 조선의 진경과 풍속을 그려냄으로써 화원들도 이에 뒤따르게 되었다. 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畵風)을 확립하고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은 풍속화풍을 현재 심사정(1707~1769)이 남종문인화풍을 정립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사인(士人) 삼재(三齋)라 하여 진경산수와 풍속을 그려내어 조선 국화풍의 시조가 된 사람들이다. 특히, 겸재 정선에 의해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회화기법과 중국의 남종화기법을 종합하여 금강산준법 같은 독자적인 화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단원 김홍도는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의 새 장을 열었는데 풍속 인물뿐 아니라 도석(道釋·도교와 불교)과 고사 인물에서조차 모두 당시의 조선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 이는 철저한 조선중화의식의 단편적인 예이다. 그는 노자도 조선 노인으로, 달마대사도 조선 선승의 모습으로 그렸다. 심지어 관세음보살마저도 조선 어머니의 모습이다. 꽃과 새와 나비, 물고기 풀 등도 조선 생태의 철저한 사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Ⅳ. 나가며
중화사상을 고대의 시대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넓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고,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모방하고 담지하려는 의지를 보아서 그 중독성과 경배성이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은 더 이상 과거의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발전을 함께 이룩해 나감으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은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중화주의 자체를 중국의 속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로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된 시대정신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혹자는 조선중화사상을 비꼬아 숲 속에 호랑이가 사라지자 여우가 왕처럼 나서는 꼴이라며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편협한 견해는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나온 왜곡된 표현이며, 오히려 이등국가임을 자처하고 눌러앉는 소인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에 제시된 사례 등을 통해서 조선 즉, 조선전기가 외래사상인 성리학과 그 사상을 지닌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조선후기는 지도, 역사, 회화 등 각 방면으로 조선 고유문화를 창조하고 조선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시대정신으로 볼 수 있다 .
1880년대부터 경험한 일본 및 서양의 합리화 논리인 개화론을 부정하고 조선은 이미 문명국이고 조선만이 보존하고 있는 유교윤리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논리는 당시대에 있어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지만, 서구문명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음미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참고자료
정옥자,「(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 일지사,1998)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서울 : 일지사, 1993)
유미림,「조선 후기의 정치사상」 (서울 : 지식산업사, 2002)
이춘식,「中華思想의 理解」 (서울 : 신서원, 2002)
갈검웅,「중국통일, 중국분열」 (서울, 신서원, 1996)
Anderson, Benedict R. O\'G,「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서울 : 나남출판, 2002)
이성규, 「민족주의의 철학적 성찰 :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한국철학회, 1992)
정옥자, 「19세기 중화사상의 위상과 역사적 성격」 (한국학보 76집,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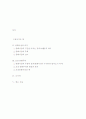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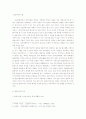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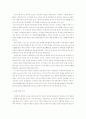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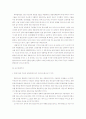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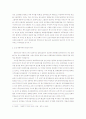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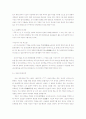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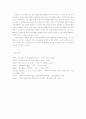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