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중요성
Ⅲ.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어원
Ⅳ.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논리
1. 청자 중심의 언어
2. 후핵언어
3. 문장 성분 이동의 자유
Ⅴ.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오염실태
1.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2.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경우
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경우
Ⅵ.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문제점
1. 외래 요소와 본애 바탕의 문제
2. 언어의 층위별 문제
3. 말의 문제와 글의 문제
4. 어문 규정의 문제
Ⅶ.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훼손 사례
1. 낱말 뜻을 잘못 알아 저지른 실수
2. 사개 뒤틀리고, 서까래 내려앉은 문장들
3. 방언․비표준어․조어(造語)의 난장판
Ⅷ.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바로쓰기 방법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Ⅱ.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중요성
Ⅲ.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어원
Ⅳ.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논리
1. 청자 중심의 언어
2. 후핵언어
3. 문장 성분 이동의 자유
Ⅴ.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오염실태
1.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2.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경우
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경우
Ⅵ.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문제점
1. 외래 요소와 본애 바탕의 문제
2. 언어의 층위별 문제
3. 말의 문제와 글의 문제
4. 어문 규정의 문제
Ⅶ.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훼손 사례
1. 낱말 뜻을 잘못 알아 저지른 실수
2. 사개 뒤틀리고, 서까래 내려앉은 문장들
3. 방언․비표준어․조어(造語)의 난장판
Ⅷ. 우리글(우리말, 한글, 국어)의 바로쓰기 방법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온 말로 꺼리고 비밀스러워 시비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끝내 버리는 것을 뜻한다.
\'도무지\'는 \'도통(都統)\', \'도시(都是)\' 등과 같은 맥락에서 \'都無知\'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18세기의 『동문유해』, 『한청문감』에는 \'도모지\'로 나와 설득력이 없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그 기원이 나오는데 \"대원군 시대에 포도청의 형졸들이 살인하기에 염증을 느껴 백지 한 장을 죄수의 얼굴에 붙이고 물을 뿌리면 죄수의 숨이 막혀 죽곤 했는데 이를 \'도모지(塗貌紙)\'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에서 \'도무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흥청거리다\'에서 \'흥청(興淸)\'은 연산군 시대에 전국에서 뽑아 놓은 기생들의 호칭이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이 서울 근교로 놀러 갈 때 왕을 따르는 흥청의 수가 천 명씩 되었고 날마다 계속되는 연회에도 이들 흥청(興淸)과 운평(運平: 연산군 때에,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둔 가무(歌舞) 기생. 이들 가운데서 대궐로 뽑혀 온 기생을 \'흥청\'이라고 함)이 동원되었다. 연산의 이러한 행각으로 \'흥청\'은 \'흥청거리다\'라는 말을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망청\'은 \'흥청\'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쓴 대구(對句)이지만, \'망(亡)\'이 선택된 배경에는 \'흥(興)하고 망(亡)하는 것이 의미상 대립을 이루며, 더욱이 연산군이 흥청거리며 쾌락에 탐닉하다가 자신을 망(亡)하게 했다는 해석도 아울러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예로 \'호락호락(忽弱忽弱)\', \'물레(文來)\', \'썰매(雪馬)\', \'대수롭다(大事롭다)\', \'벽창호(碧昌牛)\', \'잡동사니(雜同散異)\' \'화수분(河水盆)\', \'고로쇠(骨利樹)\' 무궁화(木槿花) 등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다음은 앞의 예문에서 사용된 그 밖의 한자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별안간\'은 한자어 \'瞥眼間\'에 어원이 있다. \'언뜻 보는 사이\'라는 뜻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와 뜻이 유사한 말에는 \'순식간(瞬息間)\'이나 \'찰나(刹那, 산스크리트의 \'ksana\' 즉 瞬間의 音譯)가 있다.
\'직성이 풀리다\'에서 \'직성(直星)\'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수를 맡아본다는 아홉 개의 별로 제웅직성, 토(土) 직성, 수(水) 직성, 금(金) 직성, 일(日) 직성, 화(火) 직성, 계도(計都) 직성, 월(月) 직성, 목(木) 직성의 아홉별이 차례로 도는데, 구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한다. 계도(計都) 직성은 흉(凶)하고, 목(木) 직성은 길(吉)한 별이다. 흉한 직성의 때가 끝나고 길한 직성이 찾아오면 운수가 잘 풀려 만사가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다.
\'진이 빠지다\'에서 \'진(津)\'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 등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물질 곧 진액(津液)을 뜻한다. 진이 다 빠져나가면 식물이나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진이 빠진다는 것은 곧 거의 죽을 정도로 기력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다.
옛날 과거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 대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 과거 마당의 어지러움을 일컬어 \'난장(亂場)\'이라 하였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亂場-)\'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낭패(狼狽)\'는 본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다. 낭(狼)은 뒷다리 두 개가 아주 없거나 아주 짧은 동물이고, 패(狽)는 앞다리 두 개가 아예 없거나 짧은 동물이다. 그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녀야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꾀가 부족한 대신 용맹한 낭과, 꾀가 있는 대신 겁쟁이인 패가 호흡이 잘 맞을 때는 괜찮다가도 서로 다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다. 이같이 낭과 패가 서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낭패\'라 한다. \'교활(狡猾)\'도 역시 전설상의 동물인 \'교(狡)\'와 \'활(猾)\'의 간악함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무동 태우다\'는 걸립패나 사당패의 놀이에서 여장을 한 사내아이가 사람 어깨 위에 올라 서서 아랫사람이 춤추는 대로 따라 추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때 어깨 위에 올라선 아이를 \'무동(舞童)\'이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 태우는 것을 \'무동 태우다\'라고 하게 되었다. 순 우리말로는 목뒤로 말을 태우듯이 한다고 해서 생겨난 \'목말 태우다\'라는 말이 있다.
\'단출하다\'는 한자어 홑 단(單)과 날 출(出)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거나 옷차림이나 일이 간편하고 간단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환장하다\'에서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로 마음과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는 뜻이다. 곧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답답하다\'는 머뭇머뭇 거리는 뜻을 가진 답답(沓沓)(『시경(詩經)』)에서 나온 말이고, \'억장이 무너지다\'의 \'억장\'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이라는 한자어의 준말이다. 장(丈)이 열 자이므로 \'억장지성\'은 엄청나게 높이 쌓은 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억 장이나 되는 높은 성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는 뜻이 된다.
\'비위 맞추다\'의 \'비위(脾胃)\'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지라)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胃臟)을 합쳐서 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비위 맞추다\'는 비장과 위장이 서로 협력하여야 소화가 잘 되듯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의 마음에 들게 해 주는 일을 뜻한다.
이외에 자주 쓰이는 말 가운데 \'억척\'은 \'악착(齷齪)\'에서 나왔고, 또 \'학을 떼다\'의 \'학\'은 \'학질(虐疾)\'을 뜻한다. 학질은 흔히 열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자연히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을 뗀다\'는 것은 거북하거나 어려운 일로 진땀을 뺀다는 뜻이다.
다음은 불교(佛敎)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위의 예문에서 \'점심\'은 16세기의 『순천김씨언간』에 \'
\'도무지\'는 \'도통(都統)\', \'도시(都是)\' 등과 같은 맥락에서 \'都無知\'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18세기의 『동문유해』, 『한청문감』에는 \'도모지\'로 나와 설득력이 없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그 기원이 나오는데 \"대원군 시대에 포도청의 형졸들이 살인하기에 염증을 느껴 백지 한 장을 죄수의 얼굴에 붙이고 물을 뿌리면 죄수의 숨이 막혀 죽곤 했는데 이를 \'도모지(塗貌紙)\'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뜻에서 \'도무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흥청거리다\'에서 \'흥청(興淸)\'은 연산군 시대에 전국에서 뽑아 놓은 기생들의 호칭이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이 서울 근교로 놀러 갈 때 왕을 따르는 흥청의 수가 천 명씩 되었고 날마다 계속되는 연회에도 이들 흥청(興淸)과 운평(運平: 연산군 때에,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둔 가무(歌舞) 기생. 이들 가운데서 대궐로 뽑혀 온 기생을 \'흥청\'이라고 함)이 동원되었다. 연산의 이러한 행각으로 \'흥청\'은 \'흥청거리다\'라는 말을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망청\'은 \'흥청\'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쓴 대구(對句)이지만, \'망(亡)\'이 선택된 배경에는 \'흥(興)하고 망(亡)하는 것이 의미상 대립을 이루며, 더욱이 연산군이 흥청거리며 쾌락에 탐닉하다가 자신을 망(亡)하게 했다는 해석도 아울러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예로 \'호락호락(忽弱忽弱)\', \'물레(文來)\', \'썰매(雪馬)\', \'대수롭다(大事롭다)\', \'벽창호(碧昌牛)\', \'잡동사니(雜同散異)\' \'화수분(河水盆)\', \'고로쇠(骨利樹)\' 무궁화(木槿花) 등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다음은 앞의 예문에서 사용된 그 밖의 한자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별안간\'은 한자어 \'瞥眼間\'에 어원이 있다. \'언뜻 보는 사이\'라는 뜻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와 뜻이 유사한 말에는 \'순식간(瞬息間)\'이나 \'찰나(刹那, 산스크리트의 \'ksana\' 즉 瞬間의 音譯)가 있다.
\'직성이 풀리다\'에서 \'직성(直星)\'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수를 맡아본다는 아홉 개의 별로 제웅직성, 토(土) 직성, 수(水) 직성, 금(金) 직성, 일(日) 직성, 화(火) 직성, 계도(計都) 직성, 월(月) 직성, 목(木) 직성의 아홉별이 차례로 도는데, 구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한다. 계도(計都) 직성은 흉(凶)하고, 목(木) 직성은 길(吉)한 별이다. 흉한 직성의 때가 끝나고 길한 직성이 찾아오면 운수가 잘 풀려 만사가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다.
\'진이 빠지다\'에서 \'진(津)\'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 등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물질 곧 진액(津液)을 뜻한다. 진이 다 빠져나가면 식물이나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진이 빠진다는 것은 곧 거의 죽을 정도로 기력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다.
옛날 과거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 대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 과거 마당의 어지러움을 일컬어 \'난장(亂場)\'이라 하였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亂場-)\'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낭패(狼狽)\'는 본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다. 낭(狼)은 뒷다리 두 개가 아주 없거나 아주 짧은 동물이고, 패(狽)는 앞다리 두 개가 아예 없거나 짧은 동물이다. 그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녀야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꾀가 부족한 대신 용맹한 낭과, 꾀가 있는 대신 겁쟁이인 패가 호흡이 잘 맞을 때는 괜찮다가도 서로 다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다. 이같이 낭과 패가 서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낭패\'라 한다. \'교활(狡猾)\'도 역시 전설상의 동물인 \'교(狡)\'와 \'활(猾)\'의 간악함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무동 태우다\'는 걸립패나 사당패의 놀이에서 여장을 한 사내아이가 사람 어깨 위에 올라 서서 아랫사람이 춤추는 대로 따라 추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때 어깨 위에 올라선 아이를 \'무동(舞童)\'이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 태우는 것을 \'무동 태우다\'라고 하게 되었다. 순 우리말로는 목뒤로 말을 태우듯이 한다고 해서 생겨난 \'목말 태우다\'라는 말이 있다.
\'단출하다\'는 한자어 홑 단(單)과 날 출(出)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거나 옷차림이나 일이 간편하고 간단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환장하다\'에서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로 마음과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는 뜻이다. 곧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답답하다\'는 머뭇머뭇 거리는 뜻을 가진 답답(沓沓)(『시경(詩經)』)에서 나온 말이고, \'억장이 무너지다\'의 \'억장\'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이라는 한자어의 준말이다. 장(丈)이 열 자이므로 \'억장지성\'은 엄청나게 높이 쌓은 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억 장이나 되는 높은 성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는 뜻이 된다.
\'비위 맞추다\'의 \'비위(脾胃)\'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지라)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胃臟)을 합쳐서 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비위 맞추다\'는 비장과 위장이 서로 협력하여야 소화가 잘 되듯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의 마음에 들게 해 주는 일을 뜻한다.
이외에 자주 쓰이는 말 가운데 \'억척\'은 \'악착(齷齪)\'에서 나왔고, 또 \'학을 떼다\'의 \'학\'은 \'학질(虐疾)\'을 뜻한다. 학질은 흔히 열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자연히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을 뗀다\'는 것은 거북하거나 어려운 일로 진땀을 뺀다는 뜻이다.
다음은 불교(佛敎)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위의 예문에서 \'점심\'은 16세기의 『순천김씨언간』에 \'
추천자료
 좋은 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
좋은 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정의,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어려움,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정의,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어려움, 논설문(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 [글과생각]방송대에 입학하게 된 동기와 방송대에서 하고자하는 바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한 글
[글과생각]방송대에 입학하게 된 동기와 방송대에서 하고자하는 바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한 글 일본어(일어)의 의미, 일본어(일어)의 특징, 일본어(일어)의 기초어휘, 일본어(일어)의 지시...
일본어(일어)의 의미, 일본어(일어)의 특징, 일본어(일어)의 기초어휘, 일본어(일어)의 지시... [일어][일본어]일어(일본어)의 억양, 일어(일본어)의 시점, 일어(일본어)의 외래어, 일어(일...
[일어][일본어]일어(일본어)의 억양, 일어(일본어)의 시점, 일어(일본어)의 외래어, 일어(일... [교훈글 사례, 명상, 이야기, 따뜻한 손]교훈글 사례1(명상), 교훈글 사례2(이야기), 교훈글 ...
[교훈글 사례, 명상, 이야기, 따뜻한 손]교훈글 사례1(명상), 교훈글 사례2(이야기), 교훈글 ... [교훈글 사례, 명상관련, 반성관련, 애정관련, 품성관련, 행복관련]명상관련 교훈글 사례, 반...
[교훈글 사례, 명상관련, 반성관련, 애정관련, 품성관련, 행복관련]명상관련 교훈글 사례, 반... [교훈글 사례, 지혜, 인간가치]지혜 교훈글 사례, 명상 교훈글 사례, 인간가치 교훈글 사례, ...
[교훈글 사례, 지혜, 인간가치]지혜 교훈글 사례, 명상 교훈글 사례, 인간가치 교훈글 사례, ... [교훈글 사례, 초등학교교육(아동교육), 꿈, 가족, 인성, 명상, 행운]초등학교교육(아동교육)...
[교훈글 사례, 초등학교교육(아동교육), 꿈, 가족, 인성, 명상, 행운]초등학교교육(아동교육)... [교훈글][이야기][명상][인내심][인간가치]교훈글 사례1(이야기), 교훈글 사례2(명상), 교훈...
[교훈글][이야기][명상][인내심][인간가치]교훈글 사례1(이야기), 교훈글 사례2(명상), 교훈... 그림책의 글과 그림읽기 -글과 그림과의 관계 (생쥐와 고래, 애벌레 모험, 꿈을 먹는 요정, ...
그림책의 글과 그림읽기 -글과 그림과의 관계 (생쥐와 고래, 애벌레 모험, 꿈을 먹는 요정, ... <언어적 성차별> 여성에 대한 언어적 성차별, 남성에 대한 언어적 성차별, 인터뷰, 우리말 속...
<언어적 성차별> 여성에 대한 언어적 성차별, 남성에 대한 언어적 성차별, 인터뷰, 우리말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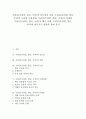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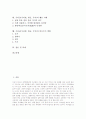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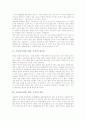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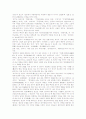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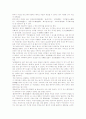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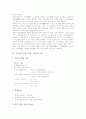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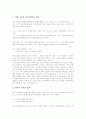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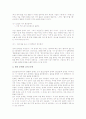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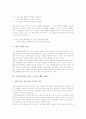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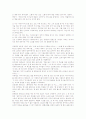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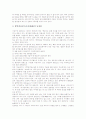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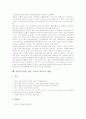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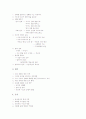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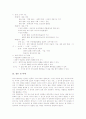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