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1. 김기림의 모더니즘 - 주지주의, 이미지즘
Ⅱ-2-1. 김기림의 시 <태양의 풍속>
Ⅱ-2-2.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
Ⅲ-1. 김광균의 모더니즘 - 이미지즘
Ⅲ-2-1. 김광균의 시 <외인촌>
Ⅲ-2-2.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
Ⅳ-1. 이상의 모더니즘 - 초현실주의
Ⅳ-2-1. 이상의 시 <오감도>
Ⅳ-2-2. 이상의 시 <거울>
Ⅴ. 결론
Ⅱ-1. 김기림의 모더니즘 - 주지주의, 이미지즘
Ⅱ-2-1. 김기림의 시 <태양의 풍속>
Ⅱ-2-2.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
Ⅲ-1. 김광균의 모더니즘 - 이미지즘
Ⅲ-2-1. 김광균의 시 <외인촌>
Ⅲ-2-2.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
Ⅳ-1. 이상의 모더니즘 - 초현실주의
Ⅳ-2-1. 이상의 시 <오감도>
Ⅳ-2-2. 이상의 시 <거울>
Ⅴ. 결론
본문내용
그리하여 그는 절망적으로 마지막 말을 덧붙인다. `13인의아해 아이, 아이를 아해라고 표기한 것은 아이라는 낱말의 일상성과 습관성을 낯설게 함으로써 자동화, 습관화된 삶을 파괴하여 신선한 감각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라고. 아무리 질주하여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질주하거나 않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음미하여 볼 만한 것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말들이다. 앞의 괄호에는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라 하였고, 뒤에서는 `길을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라 하였다. 길을 뚫려 있든 막혀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왜? 길이 어찌 되었든 어차피 상황은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에서 말하는 13인의 아이란 이상의 눈에 비친 불안한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다만 막연히 서로를 무서워하면서 불안한 삶을 질주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 따뜻한 체온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서로 불안하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그는 메마른 현대의 세계를 `13인의아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그렇게뿐이모였오\'라고 절망적으로 요약하였던 것이다.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나무, 2005, pp.154~155.
Ⅳ-2-2. 이상의 시 <거울>
이상에게 있어 자동기술은 구두점의 무시, 띄어쓰기 무시, 그리고 일상적 서술구조의 무시 등으로 드러난다. 이는 일상 세계, 의식 세계에 대한 해체적 시선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다. 의식계의 억압과 강박적 충동, 그리고 쾌락이라는 유희 본능이 무의식의 진술이랄 수 있는 자동기술을 추동하고 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거울 전문>
이 시는 중요소재인 ‘거울’을 중심으로 ‘거울 밖에 있는 나’(일상적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에 있는 나’(본질적 본래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개인의 분열되어 있는 자의식 상태를 나타낸 작품이다.
이 시에서 거울은 화자가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화자는 이 거울을 통해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찌든 나’와는 다른 ‘본연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서 거울을 통해 본연의 나와는 다른 일상적이고 세속적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을 ‘자아성찰’로 해석 한다면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물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의 특성 때문에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단절 되어있다. 이는 시속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이나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 하는 구료’라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나’와 ‘본질적인 나’ 사이의 거리감으로 인해 나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서먹서먹해 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서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나’와 거리감을 좁혀보기 위해 나는 말을 걸고 악수를 청해 보지만 끝내 거부당한다.
초현실주의는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이는 현실을 가상으로 보고 있으며, 감추어진 무의식 세계를 실체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현실주의에서 현상적인 나는 현실 자아이고 본질적인 나는 원초적 자아, 본능적 자아가 된다. 이 시는 결국 현실적 나와 원초적 나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모더니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부정을 바탕으로 하며 절망이 아닌 확신에 찬 새로운 힘의 원천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하나의 힘의 원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에서의 모더니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전위정신과 실험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최첨단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으며, 이러한 의식을 자신들의 문학작품에서 형상화하고자했다.
둘째, 파괴정신과 창조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과거는 물론 당대의 문학적 주제나 소재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했으며, 언제나 새롭게 사고 할 것, 다시 말하면 신사고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러한 신사고가 고정적인 구사고로 정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들은 언제나 새롭게 그러한 사고를 갱신하고 했다.
셋째, 개인의 소외정신과 자유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현실로부터 차단된 스스로의 소외정신과 그것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피와 탈출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자유, 즉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자유’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의미하며 그것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반 유토피아 정신과 비판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동료나 독자들에게 냉소적인 조소를 보내며 미래에 대한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세상의 잠정적인 파멸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적 장치로서 모더니즘을 강조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김태진. 『김광균 시 연구』, 보고사, 1996
김학동, 『김기림 연구』, 시문학사, 1991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 나무, 2005
문덕수, 『한국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윤호병, 『문학이라는 파르마콘』, 새미, 2006
원명수, 『모더니즘 시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정순진, 『김기림 문학연구』, 국회 자료원, 1991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라고. 아무리 질주하여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질주하거나 않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음미하여 볼 만한 것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말들이다. 앞의 괄호에는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라 하였고, 뒤에서는 `길을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라 하였다. 길을 뚫려 있든 막혀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왜? 길이 어찌 되었든 어차피 상황은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에서 말하는 13인의 아이란 이상의 눈에 비친 불안한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다만 막연히 서로를 무서워하면서 불안한 삶을 질주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 따뜻한 체온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서로 불안하고,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그는 메마른 현대의 세계를 `13인의아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그렇게뿐이모였오\'라고 절망적으로 요약하였던 것이다.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나무, 2005, pp.154~155.
Ⅳ-2-2. 이상의 시 <거울>
이상에게 있어 자동기술은 구두점의 무시, 띄어쓰기 무시, 그리고 일상적 서술구조의 무시 등으로 드러난다. 이는 일상 세계, 의식 세계에 대한 해체적 시선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다. 의식계의 억압과 강박적 충동, 그리고 쾌락이라는 유희 본능이 무의식의 진술이랄 수 있는 자동기술을 추동하고 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거울 전문>
이 시는 중요소재인 ‘거울’을 중심으로 ‘거울 밖에 있는 나’(일상적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에 있는 나’(본질적 본래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개인의 분열되어 있는 자의식 상태를 나타낸 작품이다.
이 시에서 거울은 화자가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화자는 이 거울을 통해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찌든 나’와는 다른 ‘본연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서 거울을 통해 본연의 나와는 다른 일상적이고 세속적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을 ‘자아성찰’로 해석 한다면 화자는 거울을 통해 자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물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의 특성 때문에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단절 되어있다. 이는 시속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이나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 하는 구료’라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나’와 ‘본질적인 나’ 사이의 거리감으로 인해 나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서먹서먹해 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서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나’와 거리감을 좁혀보기 위해 나는 말을 걸고 악수를 청해 보지만 끝내 거부당한다.
초현실주의는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이는 현실을 가상으로 보고 있으며, 감추어진 무의식 세계를 실체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현실주의에서 현상적인 나는 현실 자아이고 본질적인 나는 원초적 자아, 본능적 자아가 된다. 이 시는 결국 현실적 나와 원초적 나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모더니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부정을 바탕으로 하며 절망이 아닌 확신에 찬 새로운 힘의 원천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하나의 힘의 원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에서의 모더니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전위정신과 실험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최첨단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으며, 이러한 의식을 자신들의 문학작품에서 형상화하고자했다.
둘째, 파괴정신과 창조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과거는 물론 당대의 문학적 주제나 소재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했으며, 언제나 새롭게 사고 할 것, 다시 말하면 신사고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러한 신사고가 고정적인 구사고로 정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들은 언제나 새롭게 그러한 사고를 갱신하고 했다.
셋째, 개인의 소외정신과 자유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현실로부터 차단된 스스로의 소외정신과 그것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피와 탈출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자유, 즉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자유’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의미하며 그것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반 유토피아 정신과 비판정신을 들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동료나 독자들에게 냉소적인 조소를 보내며 미래에 대한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세상의 잠정적인 파멸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적 장치로서 모더니즘을 강조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김태진. 『김광균 시 연구』, 보고사, 1996
김학동, 『김기림 연구』, 시문학사, 1991
김흥규,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푸른 나무, 2005
문덕수, 『한국모더니즘 시 연구』, 시문학사, 1981
윤호병, 『문학이라는 파르마콘』, 새미, 2006
원명수, 『모더니즘 시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정순진, 『김기림 문학연구』, 국회 자료원, 1991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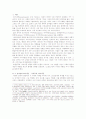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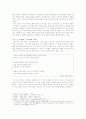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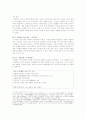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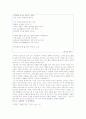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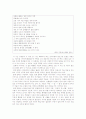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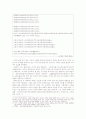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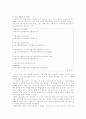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