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게오르크 뷔히너의 생애
Ⅱ. 게오르크 뷔히너와 청년독일파
1. 청년독일파
2. 뷔히너
Ⅲ. 게오르크 뷔히너의 추의 미학
1. 사랑의 미학
2. 실천의 미학
Ⅳ.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
1. 자스포르타 로베스삐에르
2. 갈루덱 당통
3. 당통
4. 드뷔쏭
Ⅴ. 게오르크 뷔히너의 보이첵
1. 역사적 배경
2. 소재의 극화
3. 원천적 소재
Ⅵ.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민중
Ⅶ. 게오르크 뷔히너의 레옹세와 레나에서 웃음의 미학
Ⅷ. 게오르크 뷔히너의 렌츠에서 현실비판적 요소
참고문헌
Ⅱ. 게오르크 뷔히너와 청년독일파
1. 청년독일파
2. 뷔히너
Ⅲ. 게오르크 뷔히너의 추의 미학
1. 사랑의 미학
2. 실천의 미학
Ⅳ.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
1. 자스포르타 로베스삐에르
2. 갈루덱 당통
3. 당통
4. 드뷔쏭
Ⅴ. 게오르크 뷔히너의 보이첵
1. 역사적 배경
2. 소재의 극화
3. 원천적 소재
Ⅵ.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민중
Ⅶ. 게오르크 뷔히너의 레옹세와 레나에서 웃음의 미학
Ⅷ. 게오르크 뷔히너의 렌츠에서 현실비판적 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단지 고차원의 있을 법한 일을 의미함과 동시에,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즉 인간다운 존재가능성에 대한 요구이다.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의 모순을 통찰하고, 그것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
렌츠는 예술에서의 사실성과 함께 생명력을 강조하며, 이것을 예술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보다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작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는 삶의 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세익스피어와, 이상주의 작가이나 쉴러 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운 괴테, 그리고 민요를 높이 평가한다.
창조된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감정이 미와 추보다도 더 앞선다. 이 감정이 예술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대하기가 우리에겐 다만 드물 뿐이다. 세익스피어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며, 민요들 속에서도, 종종 괴테에서도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귀에 울려온다.
Das Gefuhl, daB Was geschaffen sey, Leben habe, stehe uber diesen beiden, und sey das einzige Kriterium in Kunstsachen. Ubrigens begegne es uns nur selten, in Shakespeare finden wir es und in den Volksliedern tont es einem ganz, in Goethe manchmal entgegen. (SW, S. 86f)
렌츠에 의하면 생명력 있는 작품을 쓰려면 작가가 삶의 본질에 침투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예술적으로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넘어,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개 인간의 고유한 본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하잘 것 없거나 추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Man muB die Menschheit lieben, um in das eigenthumliche Wesen jedes einzudringen, es darf einem keiner zu gering, keiner zu haBlich seyn, erst dann kann man sie verstehen. (SW, S. 87)
여기서 볼 때 렌츠의 사실주의적 예술관은 인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렌츠는 예술에 있어서 사실성과 삶의 생명력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특히 하층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중요시한다. 예술가는 어느 누구도 미천하거나 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확신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이상 사회의 어떤 계층을 예술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렌츠에 의하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삶도 예술의 대상과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시도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의 삶에 침잠하여 이 삶을 재현해 보라, 그것이 경련하고 암시하는 것을, 그것의 아주 섬세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표정의 움직임을.
Man versuche es einmal und senke sich in das Leben des Geringsten und gebe es wieder, in den Zuckungen, den Andeutungen, dem ganzen feinen, kaum bemerkten Mienenspiel. (SW, S. 87)
이와 같은 렌츠의 예술적 견해는 현실의 모순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혁명가 뷔히너의 사회적 인식이 예술영역에서 투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렌츠의 예술에 대한 진술은 뷔히너의 예술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츠의 예술대화에 나타난 예술관은 작가 뷔히너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으로서,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그의 세계관의 한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렌츠가 대변하는 뷔히너의 예술원칙은 정치 사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대화’와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한스 마이어는 이 부분을 렌츠의 전체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전체와의 관련성을 완전 무시하고, 뷔히너 미학관에 대한 근거로서 독립적으로 해석하며, 벤노 폰 비제 Benno von Wiese는 이 부분을 모든 문학 외적 요소들과 연관시켜 해석한다. 또한 예술대화의 긍정적인 해석은 현실을 변용해서는 안 된다는 렌츠의 비판적 요구를 간과하는 것이며, 텍스트와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이 예술 대화부분을 전체 텍스트의 유기적 부분으로 보고 렌츠의 정신착란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술대화부분을 작품과 독립적으로 또는 전체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든지 간에, 크납의 주장대로 “예술대화에서 포괄적인 예술강령을 추론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렌츠와 카우프만의 예술에 대한 대화부분을 살펴보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예술 자체의 원칙이 아니라,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술대화에서 렌츠는 예술과 삶, 문학과 사회를 서로 관련짓는다. 그에 의하면 예술은 이념이 아닌 삶의 현실에서 출발하며, 허구가 아닌 삶의 실상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삶의 현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예술 모티브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ⅰ. 게오르그 뷔히너 저, 임호일 역, 뷔히너 문학전집, 지만지, 2008
ⅱ. 김종은,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비판,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 클럽 연설에 대한 술화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15호, 한국뷔히너학회, 2000
ⅲ. 류종영, 게오르크 뷔히너 희곡연구, 인물형상과 그 미학적 의미, 삼영사, 1988
ⅳ. 유종수, 게오르그 뷔히너 작품연구 中 제3장 Woyzeck
ⅴ. 윤세훈, 한국뷔히너학회 편, 희곡의 현대성, 뷔히너 문학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ⅵ. 한일섭 편,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렌츠는 예술에서의 사실성과 함께 생명력을 강조하며, 이것을 예술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보다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작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는 삶의 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세익스피어와, 이상주의 작가이나 쉴러 보다 훨씬 자연에 가까운 괴테, 그리고 민요를 높이 평가한다.
창조된 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감정이 미와 추보다도 더 앞선다. 이 감정이 예술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대하기가 우리에겐 다만 드물 뿐이다. 세익스피어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며, 민요들 속에서도, 종종 괴테에서도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귀에 울려온다.
Das Gefuhl, daB Was geschaffen sey, Leben habe, stehe uber diesen beiden, und sey das einzige Kriterium in Kunstsachen. Ubrigens begegne es uns nur selten, in Shakespeare finden wir es und in den Volksliedern tont es einem ganz, in Goethe manchmal entgegen. (SW, S. 86f)
렌츠에 의하면 생명력 있는 작품을 쓰려면 작가가 삶의 본질에 침투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예술적으로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넘어,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개 인간의 고유한 본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하잘 것 없거나 추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Man muB die Menschheit lieben, um in das eigenthumliche Wesen jedes einzudringen, es darf einem keiner zu gering, keiner zu haBlich seyn, erst dann kann man sie verstehen. (SW, S. 87)
여기서 볼 때 렌츠의 사실주의적 예술관은 인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렌츠는 예술에 있어서 사실성과 삶의 생명력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특히 하층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중요시한다. 예술가는 어느 누구도 미천하거나 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확신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이상 사회의 어떤 계층을 예술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렌츠에 의하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삶도 예술의 대상과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시도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의 삶에 침잠하여 이 삶을 재현해 보라, 그것이 경련하고 암시하는 것을, 그것의 아주 섬세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표정의 움직임을.
Man versuche es einmal und senke sich in das Leben des Geringsten und gebe es wieder, in den Zuckungen, den Andeutungen, dem ganzen feinen, kaum bemerkten Mienenspiel. (SW, S. 87)
이와 같은 렌츠의 예술적 견해는 현실의 모순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혁명가 뷔히너의 사회적 인식이 예술영역에서 투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렌츠의 예술에 대한 진술은 뷔히너의 예술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츠의 예술대화에 나타난 예술관은 작가 뷔히너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으로서,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그의 세계관의 한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렌츠가 대변하는 뷔히너의 예술원칙은 정치 사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대화’와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한스 마이어는 이 부분을 렌츠의 전체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텍스트 전체와의 관련성을 완전 무시하고, 뷔히너 미학관에 대한 근거로서 독립적으로 해석하며, 벤노 폰 비제 Benno von Wiese는 이 부분을 모든 문학 외적 요소들과 연관시켜 해석한다. 또한 예술대화의 긍정적인 해석은 현실을 변용해서는 안 된다는 렌츠의 비판적 요구를 간과하는 것이며, 텍스트와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이 예술 대화부분을 전체 텍스트의 유기적 부분으로 보고 렌츠의 정신착란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술대화부분을 작품과 독립적으로 또는 전체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든지 간에, 크납의 주장대로 “예술대화에서 포괄적인 예술강령을 추론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렌츠와 카우프만의 예술에 대한 대화부분을 살펴보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예술 자체의 원칙이 아니라,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술대화에서 렌츠는 예술과 삶, 문학과 사회를 서로 관련짓는다. 그에 의하면 예술은 이념이 아닌 삶의 현실에서 출발하며, 허구가 아닌 삶의 실상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삶의 현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예술 모티브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ⅰ. 게오르그 뷔히너 저, 임호일 역, 뷔히너 문학전집, 지만지, 2008
ⅱ. 김종은,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비판,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 클럽 연설에 대한 술화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15호, 한국뷔히너학회, 2000
ⅲ. 류종영, 게오르크 뷔히너 희곡연구, 인물형상과 그 미학적 의미, 삼영사, 1988
ⅳ. 유종수, 게오르그 뷔히너 작품연구 中 제3장 Woyzeck
ⅴ. 윤세훈, 한국뷔히너학회 편, 희곡
ⅵ. 한일섭 편,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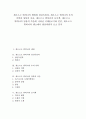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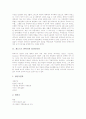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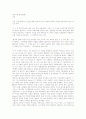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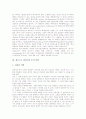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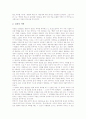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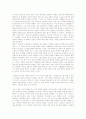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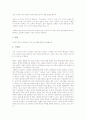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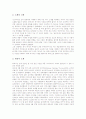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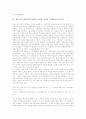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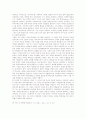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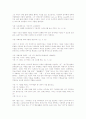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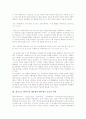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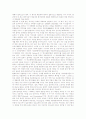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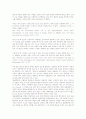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