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본존불상의 당대 이미지(Image)
Ⅲ. 본존불상의 명호
Ⅳ.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
Ⅴ. 맺음말
Ⅱ. 본존불상의 당대 이미지(Image)
Ⅲ. 본존불상의 명호
Ⅳ.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 經濟力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佛敎思想의 結集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제력을 充當하는 계층은 물론 주로 지배계층인 眞骨集團이었다. 이들은 불교미술 제작의 최대의 施主者이면서 동시에 受惠者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施主는 곧 受惠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본존불상의 제작에 동참한 施主者는 當代의 진골집단이었으며 그들이 또한 현실적으로 부처의 恩德을 가장 많이 입는 受惠者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公式의 성립은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석굴암의 본존불상을 통해서 當代의 그러한 時代精神 내지 社會心理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석굴암의 美術史的인 가치가 莫重하다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석굴암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는 실로 막중한 것이다. 지금까지 筆者는 본존불상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가치를 나름대로 살펴 보았다. 일단은 불상의 크기 면에서 고대중국의 운강석굴을 비롯한 여러 석굴불상들의 先例를 따르는 것이며, 彫刻技法的인 면에서는 당시 盛唐期 彫刻의 풍만한 樣式 및 傳統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존불상의 이미지는 王卽佛 思想의 영향으로 인해서 聖德王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이러한 전통이 고대중국의 황제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看取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無量壽 즉 현실적인 福樂의 끝없는 延長을 바라는 當代 지배계층들의 念願이 投影된 阿彌陀佛像인 것이다.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時空을 不問하고 나타나는 불교미술의 樣相은 대체로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당대의 지배계층들이 불교미술 제작의 施主者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凡夫이기에 부처의 순수한 가르침을 物質化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연히 그들은 부처에게 의지하여 자신들의 福樂을 기원하게 되는 信仰形式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부처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安危를 懇求하려는 行爲에 다름아닐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부처의 순수한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의 순수한 理想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物質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G.Deluze는 자신의 저서인 『Anti-Oedipus』에서 그러한 사실을 언급
) G.Deluze and Guattari, Anti-Oedipus, Minesota Univ. Press, 1983, pp.343-344.
한 바 있다.
석굴암 본존불상의 경우도 역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석굴암이 當代 진골집단의 願堂이었다고 한다면 本尊佛像은 그들의 願佛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실적인 所願을 한번 쯤 생각해본다면 본존불상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겠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Buddha Image의 그 Image는 프랑스의 현대철학자인 Regis Debray가 논급한 바와 같이 순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이미지가 죽음으로 인해 탄생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특히 고대세계의 이미지는 죽음을 거부하고 永生을 구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그는 藝術은 葬禮에서 탄생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祖上에 대한 禮拜에 근거한 宗敎는 특히 그 祖上들이 이미지로써 살아 남아 있기를 간절히 희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生命은 虛構的 이미지 속에 있지 현실의 身體 속에 있지 않다
) 레지스 드브레 지음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 언어, 1994.
고 하였다.
筆者가 석굴암 본존불상의 이미지를 현실적으로는 景德王의 父親인 聖德王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Regis Debray의 見解를 따른 緣由에서 이다. 그것은 또한 통일신라 中代 불교문화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도 當代人들의 뇌리에는 불교가 수입되기 이전의 샤마니즘적 신앙의 잔영이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祖上崇拜의 한 행위로 祭祀를 지냈기 때문이다
) 한국 고대의 東夷族의 종교는 太陽神 신앙에 입각한 샤마니즘으로 고대 한국의 原始道敎의 원리와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샤마니즘적 관념이 古新羅代 아미타신앙이 유포될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西方淨土에의 往生을 巫敎的 神仙思想에 입각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高翊晋, 前揭書, pp.7-17, 84-85.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오로지 佛敎一色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視覺인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샤만적 의식은 불교와 같은 高等宗敎가 등장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當代人들의 意識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샤만(Shaman)은 불교라는 형식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것은 일반민중들에게 있어서는 고등종교철학의 流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新羅의 國王들도 불교라는 高度의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民衆이 가진 샤만적 의식을 政治的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석굴암의 본존불상도 바로 이러한 當代人들의 샤만적 의식의 延長線上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샤만적 의식은 長生을 기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곧 샤만적 長生이 불교의 無量壽와 결합된 것이다. 또한 샤마니즘은 祖上崇拜라는 命題를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종교는 祖上崇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스펜서(Spencer)의 견해와 모든 종교는 그 원초적 형태에 있어서 샤마니즘적 衝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金容沃의 견해
)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통나무, 1997, pp. 96-97.
를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視覺 위에서 생각한다면 필자가 논급한 석굴암 본존불상의 이미지는 聖德王과 같은 帝王的 이미지와 무량수불인 阿彌陀佛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점에 석굴암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가 막중함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석굴암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는 실로 막중한 것이다. 지금까지 筆者는 본존불상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가치를 나름대로 살펴 보았다. 일단은 불상의 크기 면에서 고대중국의 운강석굴을 비롯한 여러 석굴불상들의 先例를 따르는 것이며, 彫刻技法的인 면에서는 당시 盛唐期 彫刻의 풍만한 樣式 및 傳統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존불상의 이미지는 王卽佛 思想의 영향으로 인해서 聖德王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이러한 전통이 고대중국의 황제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看取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無量壽 즉 현실적인 福樂의 끝없는 延長을 바라는 當代 지배계층들의 念願이 投影된 阿彌陀佛像인 것이다.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時空을 不問하고 나타나는 불교미술의 樣相은 대체로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당대의 지배계층들이 불교미술 제작의 施主者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凡夫이기에 부처의 순수한 가르침을 物質化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연히 그들은 부처에게 의지하여 자신들의 福樂을 기원하게 되는 信仰形式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부처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安危를 懇求하려는 行爲에 다름아닐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부처의 순수한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의 순수한 理想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物質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G.Deluze는 자신의 저서인 『Anti-Oedipus』에서 그러한 사실을 언급
) G.Deluze and Guattari, Anti-Oedipus, Minesota Univ. Press, 1983, pp.343-344.
한 바 있다.
석굴암 본존불상의 경우도 역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석굴암이 當代 진골집단의 願堂이었다고 한다면 本尊佛像은 그들의 願佛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현실적인 所願을 한번 쯤 생각해본다면 본존불상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겠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Buddha Image의 그 Image는 프랑스의 현대철학자인 Regis Debray가 논급한 바와 같이 순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이미지가 죽음으로 인해 탄생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특히 고대세계의 이미지는 죽음을 거부하고 永生을 구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그는 藝術은 葬禮에서 탄생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祖上에 대한 禮拜에 근거한 宗敎는 특히 그 祖上들이 이미지로써 살아 남아 있기를 간절히 희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生命은 虛構的 이미지 속에 있지 현실의 身體 속에 있지 않다
) 레지스 드브레 지음 정진국 옮김, 『이미지의 삶과 죽음』, 시각과 언어, 1994.
고 하였다.
筆者가 석굴암 본존불상의 이미지를 현실적으로는 景德王의 父親인 聖德王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Regis Debray의 見解를 따른 緣由에서 이다. 그것은 또한 통일신라 中代 불교문화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도 當代人들의 뇌리에는 불교가 수입되기 이전의 샤마니즘적 신앙의 잔영이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祖上崇拜의 한 행위로 祭祀를 지냈기 때문이다
) 한국 고대의 東夷族의 종교는 太陽神 신앙에 입각한 샤마니즘으로 고대 한국의 原始道敎의 원리와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샤마니즘적 관념이 古新羅代 아미타신앙이 유포될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西方淨土에의 往生을 巫敎的 神仙思想에 입각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高翊晋, 前揭書, pp.7-17, 84-85.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오로지 佛敎一色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視覺인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샤만적 의식은 불교와 같은 高等宗敎가 등장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當代人들의 意識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샤만(Shaman)은 불교라는 형식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것은 일반민중들에게 있어서는 고등종교철학의 流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新羅의 國王들도 불교라는 高度의 철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民衆이 가진 샤만적 의식을 政治的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석굴암의 본존불상도 바로 이러한 當代人들의 샤만적 의식의 延長線上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샤만적 의식은 長生을 기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곧 샤만적 長生이 불교의 無量壽와 결합된 것이다. 또한 샤마니즘은 祖上崇拜라는 命題를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종교는 祖上崇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스펜서(Spencer)의 견해와 모든 종교는 그 원초적 형태에 있어서 샤마니즘적 衝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金容沃의 견해
)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통나무, 1997, pp. 96-97.
를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視覺 위에서 생각한다면 필자가 논급한 석굴암 본존불상의 이미지는 聖德王과 같은 帝王的 이미지와 무량수불인 阿彌陀佛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점에 석굴암 본존불상의 미술사적 가치가 막중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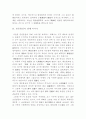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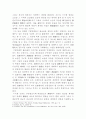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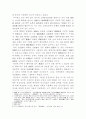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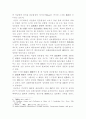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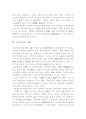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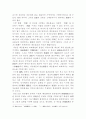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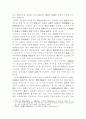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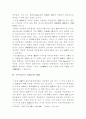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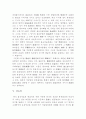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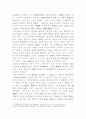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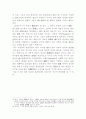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