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목차
3회 부친의 중병을 근심하여 조칙평[조보]에게 의탁하며 숙군위가 이경달을 대패시키다.
제 4회 자금산의 당의 영채가 다 전복당하고 와교관에서 항복하러 나오다
제 4회 자금산의 당의 영채가 다 전복당하고 와교관에서 항복하러 나오다
본문내용
오한질병이 발생하여 본래 첫 여름의 기후는 솜옷을 입고도 따뜻하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서도 병이 온전히 낫지 않아서 하루에 이틀 누워서 손행우는 첩보가 이미 이르니 요나라 자사 이재흠을 압송해 바쳤다.
周主抱病升帳,見左右入囚犯,便問他願降願死.
주주포병승장 견좌우방입수범 변문타원항원사.
주나라 군주는 병을 앓아도 장막에 올라서 좌우에 묶여온 죄수범인을 보며 곧 그에게 항복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在欽瞋 瞋(부릅뜰 진; -총15획; chen)
目道:“要殺就殺,何必多言!”
재흠각전목도 요살취살 하필다언?
이재흠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죽이려면 곧 죽이지 하필 말이 많은가?”
周主便喝令梟首。
주주변갈령효수.
주나라 군주는 호령해 효수하라고 했다.
自覺頭暈目眩,急忙退入寢室。
자각두훈목현 급망퇴입침실.
주나라 군주는 머리가 핑 돌고 눈이 아찔하다고 느껴서 급히 침실로 들어갔다.
又越兩日,疾仍未 (나을. 줄다 추; -총16획; chou)
,諸將欲請駕還都,因恐觸動 觸動:자극(刺戟)하여 움직임, 또는 자극(刺戟)되어 움직임
主怒,未敢請奏。
우월양일 질잉미추 제장욕청가환도 인공촉동주노 미감청주.
또 2일이 지나도 질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여러 장수가 어가를 도읍으로 돌아가라 청하려고 하여도 군주의 분노를 발동할까 두려워 감히 아직 주청하지 못했다.
匡胤獨奮然道:“主疾未愈,長此羈留 羈(굴레 기; -총24획; j)留: 붙들어 매어짐
,或遼兵大至,反爲不美,待我入請還(길 치울, 임금의 거동, 한발로 서다 필; -총18획; bi)
便了。”
광윤독분연도 주질미유 장차기류 당혹료병대지 반위불미 대아입청환필변료.
조광윤 홀로 분연히 말했다. 주상의 질병이 아직 낫지 않으니 이에 오래 머무르면 혹시 요나라 병사가 크게 이르면 반대로 불미스럽게 되니 내가 주청하여 어가를 돌리게 하면 편합니다.“
乃徑入周主寢門,力請還駕。正是:
내경입주주침문 력청환가 정시.
조광윤은 곧장 주나라 군주의 침실문에 들어가 힘주어 어가를 돌리게 청하니 다음과 같다.
雄主一生期掃虜,老臣片語足回天 回天:제왕(帝王)의 뜻을 돌이키게 함. 나라의 형세(形勢)나 국면(局面)을 크게 바꿈
。
웅주일생기소로 노신편어족회천.
영웅군주의 일생이 오랑캐를 소탕하길 바라니 늙은 신하의 한 말로 족히
未知周主曾否邀准,且看下回表明。
미지주주증비료회 차간하회표명.
아직 주나라 군주가 일찍이 비준할지 여부를 모르니 잠시 아래 회부분의 표명을 들어보자.
周世宗爲五季 五季 :중국(中國)의 '후오대(後五代)'를 다섯 왕조(王朝)가 자주 갈린 말세
英主,而拓疆略地 略地 :①땅을 빼앗음 ②경계(境界)를 순시(巡視)하여 조사(調査)함
之功,多出匡胤之力,史家記載特詳,雖未免有溢美 溢(넘칠 일; -총13획; yi)美[yimi] :과분하게 칭찬하다.
之辭,而後此受禪以後,除韓通諸人外,未聞與抗,是必其平日威望 威望 :위세(威勢)와 명망(名望)
,足以制人,故取周祚如反掌耳。
주세종위오계영주 이척강략지지공 다출광윤지력 사가기재특상 수미면유일미지사 이후차수선이후 제한통제인외 미문여항 시필기평일위망 족이제인 고취주조여반장이.
주나라 세종은 후오대의 영명한 군주로 국경을 개척하고 땅을 공략한 공로가 있고 많이 조광윤의 힘에서 나오니 역사가들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하나 비록 넘치는 찬미의 말을 하여도 이후에 이는 선양을 받은 이후에 한통의 여러 사람을 제외하고 더불어 항거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이는 필시 평일에 위엄과 명망이 족히 다른 사람을 제압할만하므로 주나라 왕조를 취함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웠을 뿐이다.
本回匡胤破紫金山,降瓦橋關,寫得聲容突兀 突兀 [twu] : 1.[형용사] 돌올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2.[형용사] 갑작스럽다. 뜻밖이다.
,如火如 如火如:如:같을 여, 火:불 화, 如:같을 여, :씀바귀 도; 기세가 충천하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출전: 국어
,且妙在與前數回戰仗,筆不同,令閱者賞心 賞心 :①경치(景致)를 줄기는 마음 ②즐겁고 기쁜 마음
豁目 爽心豁目:心神爽朗,眼界
。
본회서광윤파자금산 항와교관 사득성용돌올 여화여도 차묘재여전수회전장 서필부동 령열자상심할목.
본 4회는 조광윤이 자금산의 적을 격파하고 와교관의 군사를 항복시켜 명성의 모습이 우뚝하길 하늘을 찌르는 듯하니 오묘함은 앞 몇회의 전장과 함께 서술함이 같지 않으니 보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게 함이다.
至若舊小說中捏造杜撰 杜撰:전거가 불확실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시문을 가리키는 말.
송(宋)나라 왕무(王楙)의 《야객총서(野客叢書)》에 \'두묵이 시를 짓는데 율(律)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그 때문에 일이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두찬이라 한다(杜默爲詩 多不合律 故言事不合格者 爲杜撰).\'는 내용이 있다. 송대에 구양수(毆陽修) 등과 시작 활동을 하던 두묵이란 사람의 시가 율과 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그후로 무엇이든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두찬이라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왕무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두(杜)라는 자는 두전(杜田), 두원(杜園)의 예에서처럼 고래로 나쁘다든가 덜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빚은 맛없는 술을 두주(杜酒)라고 하는데, 임시 대용품이나 엉터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왕무 자신도 두찬이란 말 자체의 전거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다. 통속편(通俗篇)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도장(道藏)》에 수록된 5000여 권 가운데 《도덕경(道德經)》 2권만 진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당말 오대(五代) 때의 도사(道士)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후부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뜬 위작(僞作)을 두찬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명(明)나라 서위(徐渭)의 시화 《청등산인로사(靑藤山人路史)》에 \'두(杜)라는 글자의 본시 음은 토(土)와 같은데, 후에 토 대신 두를 쓰게 되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알고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토기(土氣)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杜)이다.\'
,不采入,無征不信,着書人固不敢妄作也。
지약구소설중랄조두찬 개불채입 무정불신 착서인고불감망작야.
고대 소설중에 날조하고 격식에 맞지 않으면 모두 채집해 들이지 않아서 정벌이 없고 믿을 수 없으니 글읽는 사람이 감히 망령되게 지을 수 없다.
周主抱病升帳,見左右入囚犯,便問他願降願死.
주주포병승장 견좌우방입수범 변문타원항원사.
주나라 군주는 병을 앓아도 장막에 올라서 좌우에 묶여온 죄수범인을 보며 곧 그에게 항복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在欽瞋 瞋(부릅뜰 진; -총15획; chen)
目道:“要殺就殺,何必多言!”
재흠각전목도 요살취살 하필다언?
이재흠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죽이려면 곧 죽이지 하필 말이 많은가?”
周主便喝令梟首。
주주변갈령효수.
주나라 군주는 호령해 효수하라고 했다.
自覺頭暈目眩,急忙退入寢室。
자각두훈목현 급망퇴입침실.
주나라 군주는 머리가 핑 돌고 눈이 아찔하다고 느껴서 급히 침실로 들어갔다.
又越兩日,疾仍未 (나을. 줄다 추; -총16획; chou)
,諸將欲請駕還都,因恐觸動 觸動:자극(刺戟)하여 움직임, 또는 자극(刺戟)되어 움직임
主怒,未敢請奏。
우월양일 질잉미추 제장욕청가환도 인공촉동주노 미감청주.
또 2일이 지나도 질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여러 장수가 어가를 도읍으로 돌아가라 청하려고 하여도 군주의 분노를 발동할까 두려워 감히 아직 주청하지 못했다.
匡胤獨奮然道:“主疾未愈,長此羈留 羈(굴레 기; -총24획; j)留: 붙들어 매어짐
,或遼兵大至,反爲不美,待我入請還(길 치울, 임금의 거동, 한발로 서다 필; -총18획; bi)
便了。”
광윤독분연도 주질미유 장차기류 당혹료병대지 반위불미 대아입청환필변료.
조광윤 홀로 분연히 말했다. 주상의 질병이 아직 낫지 않으니 이에 오래 머무르면 혹시 요나라 병사가 크게 이르면 반대로 불미스럽게 되니 내가 주청하여 어가를 돌리게 하면 편합니다.“
乃徑入周主寢門,力請還駕。正是:
내경입주주침문 력청환가 정시.
조광윤은 곧장 주나라 군주의 침실문에 들어가 힘주어 어가를 돌리게 청하니 다음과 같다.
雄主一生期掃虜,老臣片語足回天 回天:제왕(帝王)의 뜻을 돌이키게 함. 나라의 형세(形勢)나 국면(局面)을 크게 바꿈
。
웅주일생기소로 노신편어족회천.
영웅군주의 일생이 오랑캐를 소탕하길 바라니 늙은 신하의 한 말로 족히
未知周主曾否邀准,且看下回表明。
미지주주증비료회 차간하회표명.
아직 주나라 군주가 일찍이 비준할지 여부를 모르니 잠시 아래 회부분의 표명을 들어보자.
周世宗爲五季 五季 :중국(中國)의 '후오대(後五代)'를 다섯 왕조(王朝)가 자주 갈린 말세
英主,而拓疆略地 略地 :①땅을 빼앗음 ②경계(境界)를 순시(巡視)하여 조사(調査)함
之功,多出匡胤之力,史家記載特詳,雖未免有溢美 溢(넘칠 일; -총13획; yi)美[yimi] :과분하게 칭찬하다.
之辭,而後此受禪以後,除韓通諸人外,未聞與抗,是必其平日威望 威望 :위세(威勢)와 명망(名望)
,足以制人,故取周祚如反掌耳。
주세종위오계영주 이척강략지지공 다출광윤지력 사가기재특상 수미면유일미지사 이후차수선이후 제한통제인외 미문여항 시필기평일위망 족이제인 고취주조여반장이.
주나라 세종은 후오대의 영명한 군주로 국경을 개척하고 땅을 공략한 공로가 있고 많이 조광윤의 힘에서 나오니 역사가들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하나 비록 넘치는 찬미의 말을 하여도 이후에 이는 선양을 받은 이후에 한통의 여러 사람을 제외하고 더불어 항거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이는 필시 평일에 위엄과 명망이 족히 다른 사람을 제압할만하므로 주나라 왕조를 취함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웠을 뿐이다.
本回匡胤破紫金山,降瓦橋關,寫得聲容突兀 突兀 [twu] : 1.[형용사] 돌올하다. 높이 솟아 우뚝하다. 2.[형용사] 갑작스럽다. 뜻밖이다.
,如火如 如火如:如:같을 여, 火:불 화, 如:같을 여, :씀바귀 도; 기세가 충천하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출전: 국어
,且妙在與前數回戰仗,筆不同,令閱者賞心 賞心 :①경치(景致)를 줄기는 마음 ②즐겁고 기쁜 마음
豁目 爽心豁目:心神爽朗,眼界
。
본회서광윤파자금산 항와교관 사득성용돌올 여화여도 차묘재여전수회전장 서필부동 령열자상심할목.
본 4회는 조광윤이 자금산의 적을 격파하고 와교관의 군사를 항복시켜 명성의 모습이 우뚝하길 하늘을 찌르는 듯하니 오묘함은 앞 몇회의 전장과 함께 서술함이 같지 않으니 보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게 함이다.
至若舊小說中捏造杜撰 杜撰:전거가 불확실하거나 격식에 맞지 않는 시문을 가리키는 말.
송(宋)나라 왕무(王楙)의 《야객총서(野客叢書)》에 \'두묵이 시를 짓는데 율(律)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그 때문에 일이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두찬이라 한다(杜默爲詩 多不合律 故言事不合格者 爲杜撰).\'는 내용이 있다. 송대에 구양수(毆陽修) 등과 시작 활동을 하던 두묵이란 사람의 시가 율과 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그후로 무엇이든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두찬이라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왕무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두(杜)라는 자는 두전(杜田), 두원(杜園)의 예에서처럼 고래로 나쁘다든가 덜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집에서 빚은 맛없는 술을 두주(杜酒)라고 하는데, 임시 대용품이나 엉터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왕무 자신도 두찬이란 말 자체의 전거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다. 통속편(通俗篇)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도장(道藏)》에 수록된 5000여 권 가운데 《도덕경(道德經)》 2권만 진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당말 오대(五代) 때의 도사(道士)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후부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뜬 위작(僞作)을 두찬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명(明)나라 서위(徐渭)의 시화 《청등산인로사(靑藤山人路史)》에 \'두(杜)라는 글자의 본시 음은 토(土)와 같은데, 후에 토 대신 두를 쓰게 되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알고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토기(土氣)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杜)이다.\'
,不采入,無征不信,着書人固不敢妄作也。
지약구소설중랄조두찬 개불채입 무정불신 착서인고불감망작야.
고대 소설중에 날조하고 격식에 맞지 않으면 모두 채집해 들이지 않아서 정벌이 없고 믿을 수 없으니 글읽는 사람이 감히 망령되게 지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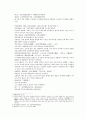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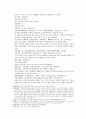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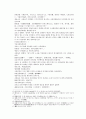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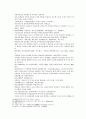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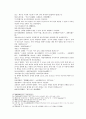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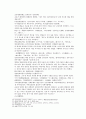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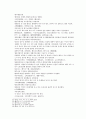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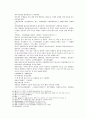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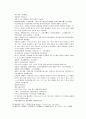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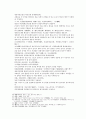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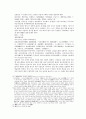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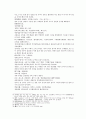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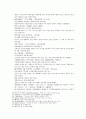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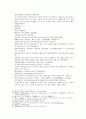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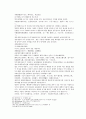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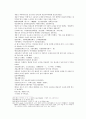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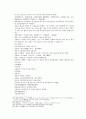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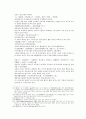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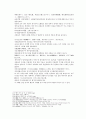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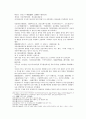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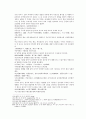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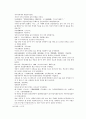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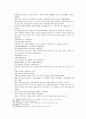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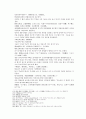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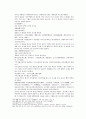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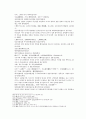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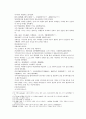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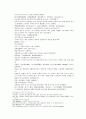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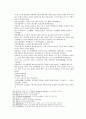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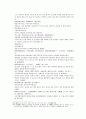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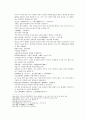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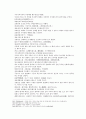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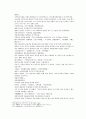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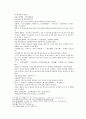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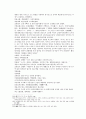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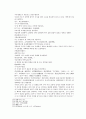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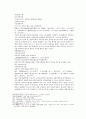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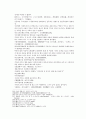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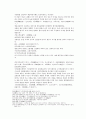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