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기 기록영화의 개념과 상황
2. 초기 기록영화의 속성
3. 초기 기록영화와 서사
2. 초기 기록영화의 속성
3. 초기 기록영화와 서사
본문내용
인 특징이다. 고르도에 의하면 영화가 그 탄생부터 이야기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진 것은 바로 쇼트가 가진 단순한 서사의 특성 때문이다. 한편 거대 서사는 우리가 흔히 영화의 서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미세서사와 거대서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영화의 두가지 움직임을 생각하면 된다. 미세서사는 재현하는 대상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만일 쇼트가 재현하는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후관계의 부재를 말하며 결국 미세 서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거대서사는 시공간 단위의 움직임, 즉 쇼트의 연결을 의미한다. 거대서사는 이미지의 단순한 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쇼트의 병치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영화의 서사는 이 두가지 서사, 혹은 서사의 두가지 단계의 결합이다. 그러나 영화의 서사를 결정짓는 것은 두번째, 거대 서사의 차원이다. 서사의 두 단계는 동시에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그러나 거대서사가 미세서사의 단계를 장악함으로써 영화의 서사는 작동하는 것이다. 거대서사는 미세서사가 합쳐져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세서사의 구성을 부인함으로써 구성된다.
고르도의 관점에 따르면 초기 기록영화, 특히 단일 쇼트의 영화에는 거대서사의 단계가 부재한다. 그것은 단순한 서사에 의해 그저 제시(monstrate)할 뿐이다. 다시말하면 초기 기록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모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서사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다시말하면 서술자(narrator)와, 그의 행위인 서술(narration)이 부재하는 것이다. 고르도는 영화에서 서술과 서술자의 존재는 20세기를 맞는 시점에 일련의 쇼트를 병치하는 관습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그 이전의 영화, 초기 기록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는 적어도 통합된 서술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고르도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초기 영화에서 현실의 객관적인 기록과 연출된 상황의 기록, 즉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이분법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초기 기록영화가 극영화와 의식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초기영화의 논점은 오히려 개별 쇼트의 독자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트의 불연속성을 무시하고 시퀀스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세우려는 노력, 즉 쇼트의 병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명하는데 있다.
미세서사와 거대서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영화의 두가지 움직임을 생각하면 된다. 미세서사는 재현하는 대상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만일 쇼트가 재현하는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후관계의 부재를 말하며 결국 미세 서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거대서사는 시공간 단위의 움직임, 즉 쇼트의 연결을 의미한다. 거대서사는 이미지의 단순한 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쇼트의 병치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영화의 서사는 이 두가지 서사, 혹은 서사의 두가지 단계의 결합이다. 그러나 영화의 서사를 결정짓는 것은 두번째, 거대 서사의 차원이다. 서사의 두 단계는 동시에 발생한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그러나 거대서사가 미세서사의 단계를 장악함으로써 영화의 서사는 작동하는 것이다. 거대서사는 미세서사가 합쳐져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세서사의 구성을 부인함으로써 구성된다.
고르도의 관점에 따르면 초기 기록영화, 특히 단일 쇼트의 영화에는 거대서사의 단계가 부재한다. 그것은 단순한 서사에 의해 그저 제시(monstrate)할 뿐이다. 다시말하면 초기 기록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모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서사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다시말하면 서술자(narrator)와, 그의 행위인 서술(narration)이 부재하는 것이다. 고르도는 영화에서 서술과 서술자의 존재는 20세기를 맞는 시점에 일련의 쇼트를 병치하는 관습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그 이전의 영화, 초기 기록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는 적어도 통합된 서술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고르도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초기 영화에서 현실의 객관적인 기록과 연출된 상황의 기록, 즉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이분법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초기 기록영화가 극영화와 의식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초기영화의 논점은 오히려 개별 쇼트의 독자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트의 불연속성을 무시하고 시퀀스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세우려는 노력, 즉 쇼트의 병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명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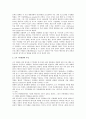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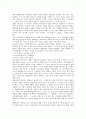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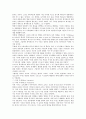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