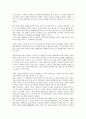목차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
1.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1.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본문내용
뇌사판정 또는 확인시가 죽음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의 판단기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죽음의 시점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 뇌사설은 죽음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맥박종지설보다 미흡하다.
셋째, 외국의 예를 볼 때 뇌사설은 전뇌사설에 대한 예외의 인정도 요구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뇌아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지금 뇌사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대뇌사설의 채택쪽으로 접근하게 될 것까지를 인용하는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같은 새로운 관념의 채택은 臟器賣買에 대한 거부감 역시 희석시키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종래의 맥박종지설은 사람의 終期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여전히 타당하다고 해야한다.
셋째, 외국의 예를 볼 때 뇌사설은 전뇌사설에 대한 예외의 인정도 요구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뇌아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지금 뇌사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대뇌사설의 채택쪽으로 접근하게 될 것까지를 인용하는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같은 새로운 관념의 채택은 臟器賣買에 대한 거부감 역시 희석시키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종래의 맥박종지설은 사람의 終期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여전히 타당하다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