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품격
실학파(實學派) :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미(實美)의 예술관
문인 예술의 이념 : 방경고졸(方經高拙)의 미
고대 신화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
신화 : 고대인들의 색채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백색(白色)
단군 신화에서 ‘백(白)’자가 등장 : 본시 태백(太白)에서 나온 말로, 태양과 밝음을 의미
태백산 : 환웅(桓雄)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온 곳으로 신시(神市)의 터전이다.
태백 : 지상(地上)과 천상(天上)을 이어주는 성스러움의 상징
건국신화의 특성 : 난생신화(卵生神話)
주몽신화, 혁거세 신화, 김수로 신화, 석탈해 신화는 각기 신성동물(神聖動物) 의 상징이 다르기는 하나 그 공통된 모티브는 모두 난생(卵生)
난형(卵形) : 존재의 비밀이 담겨진 근원적인 형태이며, 특수한 미적 매력을 맛보게 하는 형태 둥근 알이라는 형태는 우리 민족의 종족사고와 미의식의 기반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
고전미의 규범 : ‘단정미’
박혁거세 신화 :알을 깨고서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는 모양 단정하고 아름다웠다〔形儀端美〕
석탈해 신화 : 가운데 궤를 열어 보니 단정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有端正男子〕
단미(端美)는 신라인이 생각한 하나의 미의 전형(典型)
‘형의단미(形儀端美)’, ‘유단정남자(有端正男子)’ 등의 표현으로부터 인간의 용모, 자태에 관련된 선인들의 미의식의 한 전형이 단정, 단아의 미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의 고전미
‘웅건청신’(雄健淸新)의 의기(意氣)
백운(白雲), 이규보(李奎報, 1168-1241)
민족적 예술정신의 독자성에 근본한 예술사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성에 중점을 둔 그의 체계적 문예이론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백운 이규보는 그의 시 작품에서 청신준일(淸新俊逸)한 세계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시론(詩論)에서도 신의(新意), 신어(新語)와 같이 독창성을 중시하였다.
작품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창작이론에서도 위용(偉容) 있는 개성이 발하는 웅건(雄建)함과 참신한 기백(氣魄)이 발하는 청신(淸新)함이 미적 가치의 척도로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연성의 존중 : ‘평담’의 맛
조선시대 : 평담(平淡), 자연(自然), 천진(天眞) 등에 대한 미적 취향이 고조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는 미의식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동인시화』(東人詩話) :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뚜렷하게 명시된 최초의 사례
“도은(陶隱) 이숭인의 시문은 갈고 다듬어서 정밀하고 아름다우며, 양촌 권근의 시문은 평담온후(平淡溫厚)하여 자연스럽다. 이숭인의 갈고 다듬은 솜씨는 권근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근의 천기(天機)는 이숭인으로서는 암만해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온유돈후(溫柔敦厚)의 품격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
「도산십이곡」발문(跋文)
“ 우리나라 노래 곡조는 대부분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없다.『한림별곡』(翰林別曲) 같은 유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고, 겸하여 비루하게 희롱하고 친압하며, 더욱 군자(君子)가 마 땅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鼈)의 6가(歌)가 세상에 성하게 전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보다 좋다고는 하나 역시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不恭)한 뜻만 있고 온유돈후한 내용이 적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온유돈후는 퇴계의 경공부에서 이룩된 서정(抒情), 즉 성정(性情)의 순정(醇正)
‘실미(實美)’의 예술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들은 예술에서 뚜렷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미의 예술관’ 우선 연암은 예술이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근거하는 진취(眞趣)예술을 창조
나에게 있어서의 참이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만이 새로운 것이요, 그 새로운 것을 형상화할 때 새로운 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이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먼 과거 중국의 시문, 즉 한?당의 고문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풍속을 담은 지금의 현실의 글을 쓰는 것이 작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경고졸’ (方勁古拙)의 미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존고적(尊古的)인 학예태도, 서예의 원류인 전예(篆隸)를 체득
“예서는 서법의 근본이니, 만약 서도에 마음을 두고자 한다면 예서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서를 쓰는 법은 반드시 방경고졸(方勁古拙)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졸박한 곳은 또한 쉽게 얻을 수 없다. 한(漢)나라 예서의 신묘함은 오로지 졸박한 곳에 있는 것이니 사신비(史晨碑)가 정말 좋고, 이 밖에는 또한 예기?공화?공주 등의 비가 있단다. 그러나 촉 지방의 여러 석각은 심히 예스러워서 반드시 먼저 이로부터 좇아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 뒤에야 가히 속되지 않을 수 있다.”
‘모질고 굳세며 예스럽고 졸박한것’〔方勁古拙〕: 원숙
미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의 미의식과 미학사상의 특징 규정
보편성, 초월성
미 :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
걸작 :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인간을 감동
특수성
미는 시대·민족·환경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상이한 모습
거시적 시점 :동양과 서양의 미의식,
미시적 시점 :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로 구분
한국인의 미의식 : 시대, 연령, 신분에 따라 상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온 성격
첫째,
외적이고 감각적인 미 < 내면적인 심성의 미>
미와 예술의 현상 = 인격성
예술창작 : 언어의 조탁 < 작가의 의(意)와 기(氣)>
둘째,
창작자나 향수자의 자기만족 < 현실적 역할과 관련>
참다운 예술은 인간의 성정(性情)을 순화하고 현실
세계를 교화 미는 그 독자적인 성격이 부각되기보다는 인간의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
셋째,
화려함이나 현란함 < 수수함·소박함·덤덤함>과 같은 자연스러움
웅건·고졸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정의 이념미(理念美)를 지향
실학파(實學派) :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미(實美)의 예술관
문인 예술의 이념 : 방경고졸(方經高拙)의 미
고대 신화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
신화 : 고대인들의 색채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백색(白色)
단군 신화에서 ‘백(白)’자가 등장 : 본시 태백(太白)에서 나온 말로, 태양과 밝음을 의미
태백산 : 환웅(桓雄)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온 곳으로 신시(神市)의 터전이다.
태백 : 지상(地上)과 천상(天上)을 이어주는 성스러움의 상징
건국신화의 특성 : 난생신화(卵生神話)
주몽신화, 혁거세 신화, 김수로 신화, 석탈해 신화는 각기 신성동물(神聖動物) 의 상징이 다르기는 하나 그 공통된 모티브는 모두 난생(卵生)
난형(卵形) : 존재의 비밀이 담겨진 근원적인 형태이며, 특수한 미적 매력을 맛보게 하는 형태 둥근 알이라는 형태는 우리 민족의 종족사고와 미의식의 기반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
고전미의 규범 : ‘단정미’
박혁거세 신화 :알을 깨고서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는 모양 단정하고 아름다웠다〔形儀端美〕
석탈해 신화 : 가운데 궤를 열어 보니 단정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有端正男子〕
단미(端美)는 신라인이 생각한 하나의 미의 전형(典型)
‘형의단미(形儀端美)’, ‘유단정남자(有端正男子)’ 등의 표현으로부터 인간의 용모, 자태에 관련된 선인들의 미의식의 한 전형이 단정, 단아의 미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의 고전미
‘웅건청신’(雄健淸新)의 의기(意氣)
백운(白雲), 이규보(李奎報, 1168-1241)
민족적 예술정신의 독자성에 근본한 예술사적 전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성에 중점을 둔 그의 체계적 문예이론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백운 이규보는 그의 시 작품에서 청신준일(淸新俊逸)한 세계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시론(詩論)에서도 신의(新意), 신어(新語)와 같이 독창성을 중시하였다.
작품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창작이론에서도 위용(偉容) 있는 개성이 발하는 웅건(雄建)함과 참신한 기백(氣魄)이 발하는 청신(淸新)함이 미적 가치의 척도로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연성의 존중 : ‘평담’의 맛
조선시대 : 평담(平淡), 자연(自然), 천진(天眞) 등에 대한 미적 취향이 고조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는 미의식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동인시화』(東人詩話) :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뚜렷하게 명시된 최초의 사례
“도은(陶隱) 이숭인의 시문은 갈고 다듬어서 정밀하고 아름다우며, 양촌 권근의 시문은 평담온후(平淡溫厚)하여 자연스럽다. 이숭인의 갈고 다듬은 솜씨는 권근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이나, 권근의 천기(天機)는 이숭인으로서는 암만해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온유돈후(溫柔敦厚)의 품격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
「도산십이곡」발문(跋文)
“ 우리나라 노래 곡조는 대부분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없다.『한림별곡』(翰林別曲) 같은 유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고, 겸하여 비루하게 희롱하고 친압하며, 더욱 군자(君子)가 마 땅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鼈)의 6가(歌)가 세상에 성하게 전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보다 좋다고는 하나 역시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不恭)한 뜻만 있고 온유돈후한 내용이 적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온유돈후는 퇴계의 경공부에서 이룩된 서정(抒情), 즉 성정(性情)의 순정(醇正)
‘실미(實美)’의 예술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들은 예술에서 뚜렷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미의 예술관’ 우선 연암은 예술이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근거하는 진취(眞趣)예술을 창조
나에게 있어서의 참이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만이 새로운 것이요, 그 새로운 것을 형상화할 때 새로운 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이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먼 과거 중국의 시문, 즉 한?당의 고문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풍속을 담은 지금의 현실의 글을 쓰는 것이 작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경고졸’ (方勁古拙)의 미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존고적(尊古的)인 학예태도, 서예의 원류인 전예(篆隸)를 체득
“예서는 서법의 근본이니, 만약 서도에 마음을 두고자 한다면 예서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예서를 쓰는 법은 반드시 방경고졸(方勁古拙)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졸박한 곳은 또한 쉽게 얻을 수 없다. 한(漢)나라 예서의 신묘함은 오로지 졸박한 곳에 있는 것이니 사신비(史晨碑)가 정말 좋고, 이 밖에는 또한 예기?공화?공주 등의 비가 있단다. 그러나 촉 지방의 여러 석각은 심히 예스러워서 반드시 먼저 이로부터 좇아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 뒤에야 가히 속되지 않을 수 있다.”
‘모질고 굳세며 예스럽고 졸박한것’〔方勁古拙〕: 원숙
미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의 미의식과 미학사상의 특징 규정
보편성, 초월성
미 :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
걸작 :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인간을 감동
특수성
미는 시대·민족·환경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상이한 모습
거시적 시점 :동양과 서양의 미의식,
미시적 시점 :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로 구분
한국인의 미의식 : 시대, 연령, 신분에 따라 상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온 성격
첫째,
외적이고 감각적인 미 < 내면적인 심성의 미>
미와 예술의 현상 = 인격성
예술창작 : 언어의 조탁 < 작가의 의(意)와 기(氣)>
둘째,
창작자나 향수자의 자기만족 < 현실적 역할과 관련>
참다운 예술은 인간의 성정(性情)을 순화하고 현실
세계를 교화 미는 그 독자적인 성격이 부각되기보다는 인간의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
셋째,
화려함이나 현란함 < 수수함·소박함·덤덤함>과 같은 자연스러움
웅건·고졸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정의 이념미(理念美)를 지향
추천자료
 작가 이상의 분석
작가 이상의 분석 미술 전시회 관람 감상문
미술 전시회 관람 감상문 발자크의 <미지(未知)의 걸작> 작가및작품분석
발자크의 <미지(未知)의 걸작> 작가및작품분석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선험을 읽고
선험을 읽고 황영성 작가에 대하여,,
황영성 작가에 대하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비평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비평문 [걸리버여행기] 걸리버여행기 감상문, 작가 스위프트, 작품내용 요약, 등장인물 분석
[걸리버여행기] 걸리버여행기 감상문, 작가 스위프트, 작품내용 요약, 등장인물 분석 [인문과학] 논란의 작가 권터그라스
[인문과학] 논란의 작가 권터그라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최순덕 성령 충만기 소설 분석
최순덕 성령 충만기 소설 분석 김유정(소설가)의 생애, 김유정(소설가)의 작품세계, 김유정(소설가)의 작품특징, 김유정(소...
김유정(소설가)의 생애, 김유정(소설가)의 작품세계, 김유정(소설가)의 작품특징, 김유정(소... 도시인의 소외와 고독 <서울 1964년 겨울> _ 김승옥 저
도시인의 소외와 고독 <서울 1964년 겨울> _ 김승옥 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과 민족」- - 김남천,『1945년 8 &#8228; 15』-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과 민족」- - 김남천,『1945년 8 &#822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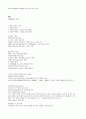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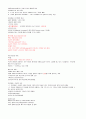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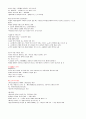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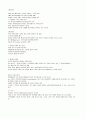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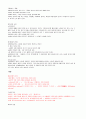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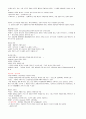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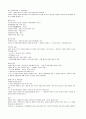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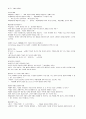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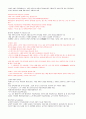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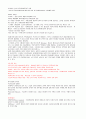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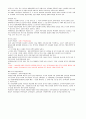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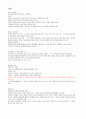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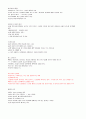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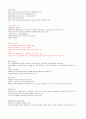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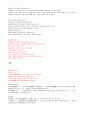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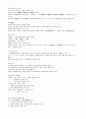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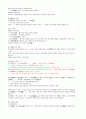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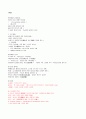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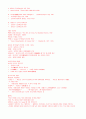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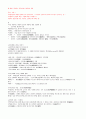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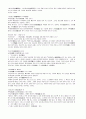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