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덕여왕대에 이르러서야 건물들과 탑이 모두 제격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경주 황룡사터의 탑자리에는 사방으로 계단을 올린 기단 위로 사방 일곱 칸에 해당하는 탑신의 기둥을 세웠던 수십 개의 육중한 주춧돌들이 남아있어 황룡사구층목탑의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도 불탑의 주류를 이루었던 목탑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신라에서도 7세기에 들어 석탑이 선보이게 된다. 현재 경주에 일부가 남아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은 선덕여왕 3년에 조성된 것으로, 이 탑은 목탑을 모델로 한 백제의 석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중국의 전탑을 모방하여 일일이 돌을 멱돌처럼 잘라서 이를 포개고 짜 맞추어 세운 것이다.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으나 원래는 5층탑으로 여겨지며 규모가 제법 큰 탑에 속하고 있다. 탑의 기단 위에는 네모퉁이에 돌사자를 배치하고 1층탑신의 네 벽에는 돌로 문틀을 짜고 널찍한 돌로 출입문도 달아 내부로 통할 수 있게 하였는데. 문의 양옆에는 인왕상이 조각되어 험상궂은 표정으로 문을 지키고 있다. 또 벽돌모양의 석재로 탑을 만들다보니 탑에는 전혀 기둥이 없고 처마 밑과 지붕 위의 경사면은 자연히 층이 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탑을 모방한 모전석탑이 신라에서 처음석탑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마. 통일신라시대의 특징
이 시기의 탑 건립은 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며 전형적인 양식의 정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 방형의 평면에 상하 층 기단(基壇)을 마련하고 그 위에 탑신을 쌓고 정상부에는 노반(露盤)위에 상륜을 장식하는 양식이다. 신라 중대(8세기 중반) 이후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특수양식의 이형탑이 등장하게 되었다.
A. 전형석탑
특징을 들면
① 기단부는 2층으로 하고,
② 갑석(甲石)은 상하층 기단마다 두고 상층기단 갑석의 밑면에는 직각을 이룬 1단의 부연(副 椽)을 각출(刻出)하고
③ 상하 갑석은 상면 중앙에 2단의 각형(角形)이나 호각형(弧角形)의 괴임대를 만들며,
④ 기단부의 하대 중석과 상대 중석에 각각 2~3개, 2개씩의 탱주(柱)를 모각(模刻)했다.
⑤ 탑신부 각 옥개석의 옥개받침은 5단이다.
⑥ 옥개석 상면의 낙수면(落水面)은 급격하지 않고 처마의 곡선도 거의 수평을 이루다가 우동 (隅棟)마루의 합각(合刻)에 이르러 약간 반전한다.
⑦ 옥개석 상단의 탑신괴임은 2단의 각형이다.
이 시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탑으로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세운 경북 경주군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지(感恩寺址) 동서 3층 석탑(국보 112호, 682년 완공), 경주시 압곡동 고선사지(高仙寺址) 3층 석탑(국보 38호, 7세기 후반 조성, 국립경주박물관 소재), 경북 경주군 현곡면 나원리(羅原理) 5층 석탑(국보 33호, 7세기 말), 경주시 구황동(九黃洞)소재 3층 석탑(국보 37호) 등이 있는데 통일신라탑의 모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주 불국사(佛國寺) 3층 석탑(속칭 無影塔, 국보 21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신라 하대 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선종(禪宗)의 대두로 예술도 힘찬 기상을 잃고 섬약해감에 따라 조형미술품도 그 규모가 작아지고 각부 양식도 간략, 혹은 생략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나타나는 변화로는
① 2층 기단이 단층기단으로 된다.
② 하층 기단의 탱주(柱)가 2주(柱)에서 1주로 줄어든다.
③ 옥개받침이 5단에서 3~4단으로 간략화되고 추녀전각이 심해진다. 이 시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탑으로는 충북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塔坪理) 7층 석탑(국보 6호, 8세기 말),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鳳德理) 보림사(寶林寺) 남북 3층 석탑(국보 44호, 810년 조성), 경남 창녕군 창녕면 술정리(亭理) 동3층 석탑(국보 34호, 8세기 중엽) 등 많은 탑들이 남아있다.
B. 특수형 석탑
탑의 건조 양식이나 각 부재의 결구방법이 전형적인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외관상으로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석탑이다. 신라 하대(9세기)에 이르러 선종의 대두로 사찰이 지방과 산간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축소되면서 장식화 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① 이형적인 석탑으로 전형적인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관상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특수양식 계열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난 이형탑으로는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多寶塔, 국보 20호, 8세기 중엽),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 4사자 3층 석탑(국보 35호, 8세기 중엽), 경북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 정혜사지(淨惠寺址) 13층 석탑(국보 40호, 9세기)등을 들 수 있다.
② 장식적인 석탑으로 외형은 신라시대 양식의 전형인 방형(方形)중층(重層)의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나 기단 및 탑신부의 각면에 천인상과 안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사방불(四方佛), 보살상, 인왕상 등 여러 상을 조각하여 표면장식이 화려하며 중중하다. 경북 경주군 외동면 원원사지(遠願寺址) 3층 석탑(사적 46호, 8세기 후반), 전남 구례군 화엄사 서 5층 석탑(보물 133호), 경주 남산리 서 3층 석탑(보물 124호), 강원도 야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陳田寺址) 3층 석탑(국보 122호, 8세기 후반), 전북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 실상사 백장암(實相寺 百丈庵) 3층 석탑(국보 10호, 9세기 후반), 강원도 양양군 남면 황이리 선림원지(禪林院址) 3층 석탑(보물 444호), 경북 영천군 금호면 신월리(新月理) 3층 석탑(보물 465호, 9세기) 등이 유명하다.
③ 탑신부는 방형 중층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나 기반부에는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석탑인데 이 형식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견우리 도피안사(到彼岸寺) 3층 석탑(보물 223호, 9세기), 경북 경주군 양북면 범곡리 석울암 3층 석탑 등이 있다.
④ 모전 석탑류(模塼石塔類)가 등장한다. 모전탑으로 건조한 것은 아니나 작은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여러 개를 쌓아 결구하여 외형으로 보아 모전 석탑의 형태와 비스
마. 통일신라시대의 특징
이 시기의 탑 건립은 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며 전형적인 양식의 정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 방형의 평면에 상하 층 기단(基壇)을 마련하고 그 위에 탑신을 쌓고 정상부에는 노반(露盤)위에 상륜을 장식하는 양식이다. 신라 중대(8세기 중반) 이후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특수양식의 이형탑이 등장하게 되었다.
A. 전형석탑
특징을 들면
① 기단부는 2층으로 하고,
② 갑석(甲石)은 상하층 기단마다 두고 상층기단 갑석의 밑면에는 직각을 이룬 1단의 부연(副 椽)을 각출(刻出)하고
③ 상하 갑석은 상면 중앙에 2단의 각형(角形)이나 호각형(弧角形)의 괴임대를 만들며,
④ 기단부의 하대 중석과 상대 중석에 각각 2~3개, 2개씩의 탱주(柱)를 모각(模刻)했다.
⑤ 탑신부 각 옥개석의 옥개받침은 5단이다.
⑥ 옥개석 상면의 낙수면(落水面)은 급격하지 않고 처마의 곡선도 거의 수평을 이루다가 우동 (隅棟)마루의 합각(合刻)에 이르러 약간 반전한다.
⑦ 옥개석 상단의 탑신괴임은 2단의 각형이다.
이 시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탑으로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세운 경북 경주군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지(感恩寺址) 동서 3층 석탑(국보 112호, 682년 완공), 경주시 압곡동 고선사지(高仙寺址) 3층 석탑(국보 38호, 7세기 후반 조성, 국립경주박물관 소재), 경북 경주군 현곡면 나원리(羅原理) 5층 석탑(국보 33호, 7세기 말), 경주시 구황동(九黃洞)소재 3층 석탑(국보 37호) 등이 있는데 통일신라탑의 모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주 불국사(佛國寺) 3층 석탑(속칭 無影塔, 국보 21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신라 하대 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선종(禪宗)의 대두로 예술도 힘찬 기상을 잃고 섬약해감에 따라 조형미술품도 그 규모가 작아지고 각부 양식도 간략, 혹은 생략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나타나는 변화로는
① 2층 기단이 단층기단으로 된다.
② 하층 기단의 탱주(柱)가 2주(柱)에서 1주로 줄어든다.
③ 옥개받침이 5단에서 3~4단으로 간략화되고 추녀전각이 심해진다. 이 시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탑으로는 충북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塔坪理) 7층 석탑(국보 6호, 8세기 말),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鳳德理) 보림사(寶林寺) 남북 3층 석탑(국보 44호, 810년 조성), 경남 창녕군 창녕면 술정리(亭理) 동3층 석탑(국보 34호, 8세기 중엽) 등 많은 탑들이 남아있다.
B. 특수형 석탑
탑의 건조 양식이나 각 부재의 결구방법이 전형적인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외관상으로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석탑이다. 신라 하대(9세기)에 이르러 선종의 대두로 사찰이 지방과 산간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축소되면서 장식화 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① 이형적인 석탑으로 전형적인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관상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특수양식 계열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난 이형탑으로는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多寶塔, 국보 20호, 8세기 중엽),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 4사자 3층 석탑(국보 35호, 8세기 중엽), 경북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 정혜사지(淨惠寺址) 13층 석탑(국보 40호, 9세기)등을 들 수 있다.
② 장식적인 석탑으로 외형은 신라시대 양식의 전형인 방형(方形)중층(重層)의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나 기단 및 탑신부의 각면에 천인상과 안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사방불(四方佛), 보살상, 인왕상 등 여러 상을 조각하여 표면장식이 화려하며 중중하다. 경북 경주군 외동면 원원사지(遠願寺址) 3층 석탑(사적 46호, 8세기 후반), 전남 구례군 화엄사 서 5층 석탑(보물 133호), 경주 남산리 서 3층 석탑(보물 124호), 강원도 야양군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陳田寺址) 3층 석탑(국보 122호, 8세기 후반), 전북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 실상사 백장암(實相寺 百丈庵) 3층 석탑(국보 10호, 9세기 후반), 강원도 양양군 남면 황이리 선림원지(禪林院址) 3층 석탑(보물 444호), 경북 영천군 금호면 신월리(新月理) 3층 석탑(보물 465호, 9세기) 등이 유명하다.
③ 탑신부는 방형 중층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나 기반부에는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석탑인데 이 형식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견우리 도피안사(到彼岸寺) 3층 석탑(보물 223호, 9세기), 경북 경주군 양북면 범곡리 석울암 3층 석탑 등이 있다.
④ 모전 석탑류(模塼石塔類)가 등장한다. 모전탑으로 건조한 것은 아니나 작은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여러 개를 쌓아 결구하여 외형으로 보아 모전 석탑의 형태와 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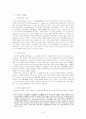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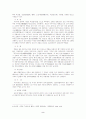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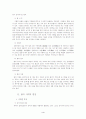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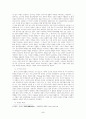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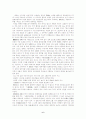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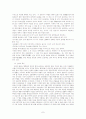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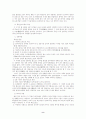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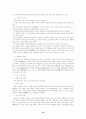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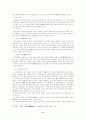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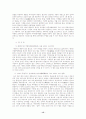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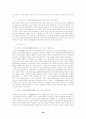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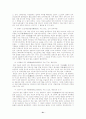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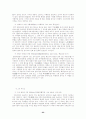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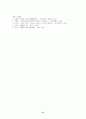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