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고대사 입문
조사 주제: 김무력과 그의 가문
목차
서론
본론
1. 김무력과 그의 활동
2. 왕족과의 혼인과 그 이면
3. 김서현과 김유신
4. 반란의 진압과 김유신의 활동
5. 김유신의 사후, 그 가문의 몰락
-자료 출전
결론
조사 주제: 김무력과 그의 가문
목차
서론
본론
1. 김무력과 그의 활동
2. 왕족과의 혼인과 그 이면
3. 김서현과 김유신
4. 반란의 진압과 김유신의 활동
5. 김유신의 사후, 그 가문의 몰락
-자료 출전
결론
본문내용
렇다면, 당시 김유신이 말하는 경술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삼국사기에는 짤막하게 경술년 가을 8월에 대아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목 베여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기술되어있다. 따라서 김융이 김유신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근거로는 위의 증언 외에도 혜공왕 4년의 반란에 비해서 짧은 기록과 완만한 처사에 주목을 해야 한다. 혜공왕 2년 가을 7월에 일길찬 대공이 아우 아찬 대렴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에워쌌으나 결국에는 그들의 9족을 목 베어 죽였는 반면에 김융의 반란에 대해서는 오로지 김융만 목을 베어 죽였다고 기록되어있는 점과 김암이 779년(혜공왕 14)에는 왕명에 따라 사신으로 일본에 간 점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편 김유신의 가족 편 중 -대력 14년 기미에 암이 왕명을 받고 일본국에 사신으로 갔다
을 고려한다면, 김융의 반란의 실체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더 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융이 김유신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나, 삼국사기 김유신 전에서는 김유신의 서손인 김암과 현손인 김장청 장청과 암의 관계 역시 조사 결과에서 무어라 단정할 수가 없었다. , 실상 김암은 혜공왕대의 사람이나, 김장청의 경우 집사랑을 지냈다고 하는데, 집사랑은 경덕왕 때의 호칭으로 후대인 혜공왕이 집사사로 다시 되돌린다. 거기에 현손과 서손이란 단어의 사전적 뜻으로 찾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확정하기 힘들어진다.
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록되어있으나, 정작 김융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김융이 김유신의 후손일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
또한 김융의 반란으로 김암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김암과 김장청의 벼슬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은 당시 신라의 귀족들의 견제로 인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당시 김암과 장청의 관직은 어떠했을까? 김암의 경우 집사부 시랑을 맡았기 때문에 그 관등이 나마에서 아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양주 강주 한주 세 지방의 태수를 역임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보이는 그의 벼슬은 오늘날의 황해도 평산에 패강진을 두어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지역을 군정방식으로 다스렸는데, 두상대감은 그 장관이었다. 혹은 군주라고도 한 듯하다. 급찬 이상 사중아찬의 관등이 주로 임명되었고, 육두품이 차지할수 있는 최고의 외관직이다.
두상으로 패강진 일대의 장관을 역임했으나 이 장관직 역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니 그 가문이 진골이 아닌 6두품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김유신의 행록을 기록한 김장청 역시 집사랑을 역임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김융이 실제로 김유신의 후손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성덕왕 때의 일을 고려한다면, 굳이 김융의 반란이 아니라도 김유신의 집안의 몰락하게 된 것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김무력을 시작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 신라 내에서 중추적인 가문 중 하나가 되었던 가야계의 신김씨 집안은 혜공왕 대에 이르러 그 정치적 세력이 와해되어 몰락하게 된다. 후에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고는 하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편 김유신의 가족 편 참조, 삼국 유사에서는 경명왕 때라고 한다.
, 그로 인해서 김유신의 집안이 재기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결론-
비록 김무력과 김유신이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가문의 최후는 그 역할에 비해서 비참했다. 기존의 귀족 세력들에게 그들이 배척을 받은 이유는 신라에 투항한 가야계 왕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존의 신라의 귀족세력이 가야계 세력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신라의 폐쇄성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김무력은 이를 이겨내고, 신라 사회 내에 새로이 신 김씨의 세력을 구축하고 김유신 대에는 왕에 버금가는 권위를 누려서 투항한 가야계로써는 최고의 권위를 누렸으나.
최후에는 기존의 신라 귀족들의 반발 속에 몰락하여 4~6두품화 되었지만, 신라에서 그들이 미친 영향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이다.
자료 출전-
삼국사기- 고전연구실 편저
도화녀와 비형랑 편 미추왕과 죽엽군 편 참조,
한국 금석문 종합영상 정보 제공 시스템,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제 1권 수로왕에서 월광태자까지
- 김태식 지음 / 푸른 역사 펴냄 김무력, 서현, 김유신 (261P~ 274P) 참조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사 -편저 부산 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529P~539P 참조
한국민족대백과 참조
을 고려한다면, 김융의 반란의 실체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더 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융이 김유신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나, 삼국사기 김유신 전에서는 김유신의 서손인 김암과 현손인 김장청 장청과 암의 관계 역시 조사 결과에서 무어라 단정할 수가 없었다. , 실상 김암은 혜공왕대의 사람이나, 김장청의 경우 집사랑을 지냈다고 하는데, 집사랑은 경덕왕 때의 호칭으로 후대인 혜공왕이 집사사로 다시 되돌린다. 거기에 현손과 서손이란 단어의 사전적 뜻으로 찾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확정하기 힘들어진다.
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록되어있으나, 정작 김융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김융이 김유신의 후손일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
또한 김융의 반란으로 김암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김암과 김장청의 벼슬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은 당시 신라의 귀족들의 견제로 인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당시 김암과 장청의 관직은 어떠했을까? 김암의 경우 집사부 시랑을 맡았기 때문에 그 관등이 나마에서 아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양주 강주 한주 세 지방의 태수를 역임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보이는 그의 벼슬은 오늘날의 황해도 평산에 패강진을 두어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지역을 군정방식으로 다스렸는데, 두상대감은 그 장관이었다. 혹은 군주라고도 한 듯하다. 급찬 이상 사중아찬의 관등이 주로 임명되었고, 육두품이 차지할수 있는 최고의 외관직이다.
두상으로 패강진 일대의 장관을 역임했으나 이 장관직 역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이니 그 가문이 진골이 아닌 6두품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김유신의 행록을 기록한 김장청 역시 집사랑을 역임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김융이 실제로 김유신의 후손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성덕왕 때의 일을 고려한다면, 굳이 김융의 반란이 아니라도 김유신의 집안의 몰락하게 된 것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김무력을 시작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 신라 내에서 중추적인 가문 중 하나가 되었던 가야계의 신김씨 집안은 혜공왕 대에 이르러 그 정치적 세력이 와해되어 몰락하게 된다. 후에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고는 하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편 김유신의 가족 편 참조, 삼국 유사에서는 경명왕 때라고 한다.
, 그로 인해서 김유신의 집안이 재기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결론-
비록 김무력과 김유신이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가문의 최후는 그 역할에 비해서 비참했다. 기존의 귀족 세력들에게 그들이 배척을 받은 이유는 신라에 투항한 가야계 왕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존의 신라의 귀족세력이 가야계 세력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신라의 폐쇄성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김무력은 이를 이겨내고, 신라 사회 내에 새로이 신 김씨의 세력을 구축하고 김유신 대에는 왕에 버금가는 권위를 누려서 투항한 가야계로써는 최고의 권위를 누렸으나.
최후에는 기존의 신라 귀족들의 반발 속에 몰락하여 4~6두품화 되었지만, 신라에서 그들이 미친 영향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이다.
자료 출전-
삼국사기- 고전연구실 편저
도화녀와 비형랑 편 미추왕과 죽엽군 편 참조,
한국 금석문 종합영상 정보 제공 시스템,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제 1권 수로왕에서 월광태자까지
- 김태식 지음 / 푸른 역사 펴냄 김무력, 서현, 김유신 (261P~ 274P) 참조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사 -편저 부산 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529P~539P 참조
한국민족대백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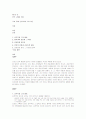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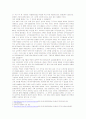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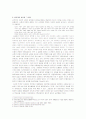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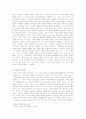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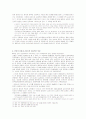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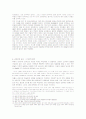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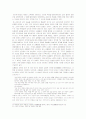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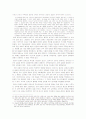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