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式) 옷주름에 기원을 둔 두 가닥의 옷주름 표현으로 손모양과 함께 인도양식(印度樣式)이 많이 나타나 있다.
본존불(本尊佛) 주위에 5구(五軀)의 협시상(脇侍像)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고 광배(光背)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상(像)과 대좌(臺座), 천개(天蓋)들이 높은 돋을새김과 투각기법(透刻技法)으로 새겨져 있는데 원근법적(遠近法的)인 공간감(空間感)과 입체감(立體感)을 놀라울 정도로 잘 나타내었다.
왼쪽 불감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普賢菩薩), 오른쪽 불감에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있는데 본존의 불감과 같은 수법이다.
이 문수·보현보살의 표현으로 보아 본존불의 석가불(釋迦佛)이 분명하므로 석가삼존불(釋迦三尊佛)을 봉안(奉安)한 불감으로 크게 주목된다.
본존불(本尊佛) 주위에 5구(五軀)의 협시상(脇侍像)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고 광배(光背)가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상(像)과 대좌(臺座), 천개(天蓋)들이 높은 돋을새김과 투각기법(透刻技法)으로 새겨져 있는데 원근법적(遠近法的)인 공간감(空間感)과 입체감(立體感)을 놀라울 정도로 잘 나타내었다.
왼쪽 불감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普賢菩薩), 오른쪽 불감에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있는데 본존의 불감과 같은 수법이다.
이 문수·보현보살의 표현으로 보아 본존불의 석가불(釋迦佛)이 분명하므로 석가삼존불(釋迦三尊佛)을 봉안(奉安)한 불감으로 크게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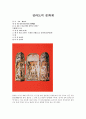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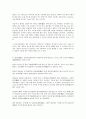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