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본체로 받아들임으로서 ’나‘를 죽이는 행위이다. 이웃을 사랑하라함은 이웃의 안에 모셔진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함으로서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에 불과하다. 즉 사랑이란 하나님이외의 인간의 본체를 부정하고 ’나‘와 ’너‘라는 물질세계의 악마적 권세의 주체를 하나님 앞에서 희생시키는 행위이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만이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다. 여기에 공리라는 개념이 끼어들 수 있는가? 5) 상황주의는 ‘물질적-육적 사랑’을 중심으로 함으로서 ‘영적 사랑’을 간과한 듯하다. 또한 인간중심의 상황을 고려함으로 사랑을 주관화 시키고 상대화 되게 함으로서 공허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리라는 개념을 삽입함으로 일관성을 유지 시키려 하고 있다. 상황윤리에서 사랑은 특정시점에서 다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다. 율법주의가 규범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을 목적으로 율법을 수단으로 고착화시켜 수단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서 율법을 ‘위태로운 고집’ 정도로 비하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 수단도 정당화 시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사랑이 상황에 의해서 규정된다면 하나님은 실체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사랑을 위한 살해, 간음, 매춘, 자살, 낙태가 성립 될 수 있다면 죄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적 사랑의 개념이 이렇게 까지 갈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으나 기독교 윤리로서 성립될 수 없다. 윤리학로서 판단규범의 한 종류로서, 인간의 물적 사랑차원에서 공리를 주장한다면 상당히 흥미있는 이론으로 읽어 줄 수 있다. 상황윤리는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중간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무법주의이다. 사랑이 상황과 공리 사이에 태어나는 사생아는 아니다. 사랑을 빙자해 사랑을 파괴하는 이론이다. 내 안에 모셔진 하나님과 이웃의 안에 모셔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뜻입니자 올려 놓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연설명합니자. 원죄로 인간안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파괴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참아인 하나님은 가아인 '나'에게 가리워져 있으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인 것이며 누구나가 볼때 하나의 계명이 맞다라는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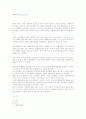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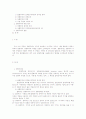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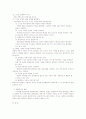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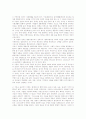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