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악사가 뒤따른다. 양반이 사당과 무동·꼽새 등을 불러들여 논 다음 사자를 불러들인다. 사자춤에서는 상좌중이 함께 춤을 춘다. 사자가 여러 가지 춤추는 재주를 부리다가 쓰러진다. 양반은 대사를 불러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외우나 움직이지 않자 의원이 침을 놓아 일어난다. 꺾쇠가 사자에게 토끼를 먹이니 사자는 기운이 나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양반이 기뻐서 사자 한 마리를 더 불러 춤을 추게 하고 사당춤과 상좌의 승무가 한데 어울리고 사자는 퇴장하자 마을사람들이 <신고산타령> 등을 부르면서 군무(群舞)를 추고 끝낸다. 북청사자놀음은 사자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꾼이 나와 저마다 춤을 추는데 춤의 종류는 사자춤·애원성춤·사당춤·거사춤·승무춤·꼽추춤·무동춤·넋두리춤·칼춤 따위가 추어지며, 춤의 반주음악에 쓰이는 악기는 퉁소·장구·소고·북·꽹가리·징이다. 퉁소는 2개를 쓰나 많이 쓸 때 6개까지 쓴다. 해서(海西)나 경기지방의 탈놀이가 삼현육각(三絃六角)의 반주로 되어 있고, 영남지방 탈놀음이 매구풍장(농악)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북청사자놀음만이 퉁소풍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반주음악의 장단은 대개 춤곡에 따라 3분박 좀 느린 4박자나 좀 빠른 4박자로 서양악보로는 8분의 12박자로 적을 수 있는데 굿거리장단에 맞는다. 북청사자놀음에 쓰이는 가면은 사자·양반·꺽쇠·꼽추·사령 등이다. 우리나라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북청사자놀음의 사자춤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춤사위가 있어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꾼이 딸리고 여러 종류의 춤을 곁들이는 점에서도 가장 뛰어난 놀음이라 할 수 있다. 이두현(李杜鉉)이 연희자 윤영춘(尹迎春)·마희수(馬羲秀) 등의 구술을 토대로 채록한 대사 채록본이 있다.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대표적인 남자 어린이 놀이로 분류된다. 한자로 연을 鳶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리개\'를 뜻한다. 연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중국이나 그리스 등 고대문명을 자랑하는 지역에서는 기원 전부터 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여 그 긴 역사를 말해준다.
우리 문헌에서는《삼국사기》 에 최초로 연을 날린 기록이 나온다. 신라 진덕여왕 때,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왕이 사는 월성에 떨어지자, 당시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유혈이 있다\'고 하여 왕을 폐하려던 이들은 환호하고, 왕을 지키는 군사들의 사기는 침체되었다. 이때 김유신이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여기에 불을 붙여 하늘에 날려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적을 무찔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연 날리기가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말 최영이 제주도 난을 평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이용하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되어 단지 놀이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연은 \'액막이\'로도 쓰였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연 뒤에다가 \'집안식구 모년 모월 생 몸의 액을 없애버린다(家口某生身厄消滅)\'고 쓰고, 해질 무렵까지 띄우다가 연줄을 끊어 버림으로써 액을 막는다.
이때 연을 날리다가 연이 추락된 집은 그 해에 재앙이 있다는 속신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 연은 재앙을 점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연으로 하는 놀이로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연싸움이 있다. 높이 띄우기는 연줄이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높이 띄우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며, 재주 부리기는 부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상하좌우, 급전, 급강하, 급상승 등의 공중곡예를 부리는 것이다. 또, 연싸움은 연줄을 서로 대어 끊는 놀이로, 연줄의 세기와 함께 연의 조종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때 연줄을 튼튼하게 하려고 돌가루나 구리가루 혹은 아교나 사기가루를 섞어 바르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연싸움을 잘 하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에 가끔 불려가 연 날리는 시범을 보였으며, 매년 정월 13일과 14일에는 수표교 근처 개울[청계천]을 따라 연싸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았으며, 이후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 하여 욕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연은 대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연\'과 마름모꼴의 \'가오리연\'으로 나뉜다. 만드는 방법은 대를 가늘게 쪼개 뼈대를 만들고, 종이를 모양새에 맞게 오린 다음 그곳에 대를 교차하여 붙인다.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그리거나 색칠하여 연을 꾸미고, 귀퉁이와 가운데 댓가지에 줄을 달아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추어 매듭을 짓는다.
연줄은 예전에는 주로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나일론실을 많이 쓴다. 연을 조정하는 얼레는 실을 감는 기둥의 수에 따라서 납작 얼레(2모 얼레), 4모 얼레, 6모 얼레, 8모 얼레, 둥근 얼레가 있다.
가야진사 제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전해오는 국가의식의 하나였던 양산시 가야진사 제례를 바탕으로 형성된 민속놀이이다. 처음에는 제물을 차려 천신, 지신, 용신에게 빌고 노래와 춤으로써 잔 치를 벌였던 것이 점차 변형되어 부정굿, 칙사영접굿, 용신제, 용소풀이, 사신풀이 등으로 구분 하여 제사와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진용신제는 마을과 가야진사 제당을 돌면서 칙사 맞을 준비인 제당과 마을을 청소하고 부정을 막는 금줄을 치며 황토를 뿌리고, 칙사 영접길에 선창자가 길을 밟는 지신풀이를 한다. 나머지 일행들은 길을 고르면서 뒤따른다. 가야진사를 모시고 제단으로 돌아오면 제단을 한 바퀴 돌며 강신제라는 신 내림굿을 한다. 이어 집례관이 주관하여 용신제를 올린다. 제를 마치고 용이 있다는 용소로 출발하기 전에 부정을 사르는 풍물패는 송막에 불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태우기 까지 한다. 제관들은 제물로 사용할 산 돼지를 뱃머리에 싣고 용소에 도착한 뒤 술을 부어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절을 하며 용왕에게 제물을 바친다. 용소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제단에서 제의 끝맺음을 고하고 칙사가 관복을 벗는것으로 의식은 끝이 난다. 가야진용신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대표적인 남자 어린이 놀이로 분류된다. 한자로 연을 鳶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리개\'를 뜻한다. 연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중국이나 그리스 등 고대문명을 자랑하는 지역에서는 기원 전부터 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여 그 긴 역사를 말해준다.
우리 문헌에서는《삼국사기》 에 최초로 연을 날린 기록이 나온다. 신라 진덕여왕 때,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왕이 사는 월성에 떨어지자, 당시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유혈이 있다\'고 하여 왕을 폐하려던 이들은 환호하고, 왕을 지키는 군사들의 사기는 침체되었다. 이때 김유신이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여기에 불을 붙여 하늘에 날려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적을 무찔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연 날리기가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말 최영이 제주도 난을 평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이용하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되어 단지 놀이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연은 \'액막이\'로도 쓰였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아이들이 연 뒤에다가 \'집안식구 모년 모월 생 몸의 액을 없애버린다(家口某生身厄消滅)\'고 쓰고, 해질 무렵까지 띄우다가 연줄을 끊어 버림으로써 액을 막는다.
이때 연을 날리다가 연이 추락된 집은 그 해에 재앙이 있다는 속신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 연은 재앙을 점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연으로 하는 놀이로는 높이 띄우기, 재주 부리기, 연싸움이 있다. 높이 띄우기는 연줄이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높이 띄우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며, 재주 부리기는 부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상하좌우, 급전, 급강하, 급상승 등의 공중곡예를 부리는 것이다. 또, 연싸움은 연줄을 서로 대어 끊는 놀이로, 연줄의 세기와 함께 연의 조종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때 연줄을 튼튼하게 하려고 돌가루나 구리가루 혹은 아교나 사기가루를 섞어 바르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연싸움을 잘 하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에 가끔 불려가 연 날리는 시범을 보였으며, 매년 정월 13일과 14일에는 수표교 근처 개울[청계천]을 따라 연싸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았으며, 이후로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 하여 욕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연은 대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연\'과 마름모꼴의 \'가오리연\'으로 나뉜다. 만드는 방법은 대를 가늘게 쪼개 뼈대를 만들고, 종이를 모양새에 맞게 오린 다음 그곳에 대를 교차하여 붙인다.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그리거나 색칠하여 연을 꾸미고, 귀퉁이와 가운데 댓가지에 줄을 달아 가운데에서 균형을 맞추어 매듭을 짓는다.
연줄은 예전에는 주로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나일론실을 많이 쓴다. 연을 조정하는 얼레는 실을 감는 기둥의 수에 따라서 납작 얼레(2모 얼레), 4모 얼레, 6모 얼레, 8모 얼레, 둥근 얼레가 있다.
가야진사 제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전해오는 국가의식의 하나였던 양산시 가야진사 제례를 바탕으로 형성된 민속놀이이다. 처음에는 제물을 차려 천신, 지신, 용신에게 빌고 노래와 춤으로써 잔 치를 벌였던 것이 점차 변형되어 부정굿, 칙사영접굿, 용신제, 용소풀이, 사신풀이 등으로 구분 하여 제사와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진용신제는 마을과 가야진사 제당을 돌면서 칙사 맞을 준비인 제당과 마을을 청소하고 부정을 막는 금줄을 치며 황토를 뿌리고, 칙사 영접길에 선창자가 길을 밟는 지신풀이를 한다. 나머지 일행들은 길을 고르면서 뒤따른다. 가야진사를 모시고 제단으로 돌아오면 제단을 한 바퀴 돌며 강신제라는 신 내림굿을 한다. 이어 집례관이 주관하여 용신제를 올린다. 제를 마치고 용이 있다는 용소로 출발하기 전에 부정을 사르는 풍물패는 송막에 불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태우기 까지 한다. 제관들은 제물로 사용할 산 돼지를 뱃머리에 싣고 용소에 도착한 뒤 술을 부어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절을 하며 용왕에게 제물을 바친다. 용소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제단에서 제의 끝맺음을 고하고 칙사가 관복을 벗는것으로 의식은 끝이 난다. 가야진용신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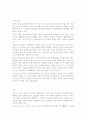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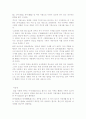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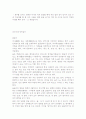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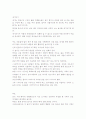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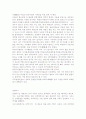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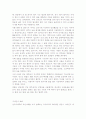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