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그들이 있는 한, 그들 축에 기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다(그래도 역시 부러운 건 사실이지만... 아니다,아니야, 뭘로 보나 지하 세계 쪽이 훨씬 낫다!) 거기서는 적어도.... 제기랄, 난 또 허튼 소리를 하고 있구나! 허튼 소리고말고! 왜냐하면 지하생활이 가장 좋은 건 절대 아니고, 내가 갈망하는 건 뭔가 다른 것이라는 걸 2*2=4만큼이나 분명히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알긴 하면서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하생활 같은 건 귀신에게나 줘버려라!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저는 이 소설 내지는 수기에 무척 몰입하여 읽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2부에 가서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지하생활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시도하면 할수록,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려 시도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에서 미끄러져 나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찌질한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2부의 주인공 역시도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수록 더욱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무시만 받고 마는 무척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려 하지만 결국 애인(이 될뻔한 사람)에게 본심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사실은 그것 역시 자신의 본심이 아닐 수 없다는 비극적인 상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의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러한 인물 유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 비약시켜 말하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통받는 그런 자의식이나 어떤 사상과 같은 것은 하나의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도무지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훗날 제가 앞서 소개한 아포리아는 기독교적인 구원과 같은 모티프로 쉽게 이행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너무나 쉽게 신앙에 회의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닌, 일종의 팽팽한 긴장감을 시종일관 유지하는대 그것이 그의 문학적 대단함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조리와 역설 그리고 아포리아로 가득찬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읽으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소설속에서나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는 독자에게서나 무언가 상황은 나아진 구석이 전혀 없는 데도 소설 말미에 가서는 독자는 어딘가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죄와 벌과 같은 소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아무래도 철학과 연결시킨다면, 철학의 언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제적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언어라는, 비트겐슈타인적인 언명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문제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언어 속에서 무언가가 해소된다는 성찰인데, 그러한 성찰을 혹시나 도스토예프스키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따져볼만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저는 이 소설 내지는 수기에 무척 몰입하여 읽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2부에 가서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지하생활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시도하면 할수록,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려 시도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에서 미끄러져 나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찌질한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2부의 주인공 역시도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수록 더욱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무시만 받고 마는 무척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려 하지만 결국 애인(이 될뻔한 사람)에게 본심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사실은 그것 역시 자신의 본심이 아닐 수 없다는 비극적인 상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의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러한 인물 유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 비약시켜 말하자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통받는 그런 자의식이나 어떤 사상과 같은 것은 하나의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도무지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훗날 제가 앞서 소개한 아포리아는 기독교적인 구원과 같은 모티프로 쉽게 이행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너무나 쉽게 신앙에 회의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닌, 일종의 팽팽한 긴장감을 시종일관 유지하는대 그것이 그의 문학적 대단함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조리와 역설 그리고 아포리아로 가득찬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읽으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소설속에서나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는 독자에게서나 무언가 상황은 나아진 구석이 전혀 없는 데도 소설 말미에 가서는 독자는 어딘가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죄와 벌과 같은 소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아무래도 철학과 연결시킨다면, 철학의 언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제적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언어라는, 비트겐슈타인적인 언명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문제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언어 속에서 무언가가 해소된다는 성찰인데, 그러한 성찰을 혹시나 도스토예프스키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따져볼만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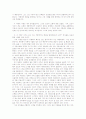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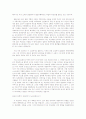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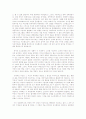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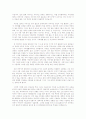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