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데올로기 양상을 띄는 시 소개
1. 일제강점기 - 신석정『꽃덤불』 , 김광균 『와사등』
1) 신석정『꽃덤불』
2) 김광균 『와사등』
2. 민주화, 4.19혁명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고은 『화살』
1)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2)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3) 고은 『화살』
3. 산업화, 근대화 - 신경림 『농무』
Ⅲ. 결론
Ⅱ. 이데올로기 양상을 띄는 시 소개
1. 일제강점기 - 신석정『꽃덤불』 , 김광균 『와사등』
1) 신석정『꽃덤불』
2) 김광균 『와사등』
2. 민주화, 4.19혁명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고은 『화살』
1)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2)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3) 고은 『화살』
3. 산업화, 근대화 - 신경림 『농무』
Ⅲ. 결론
본문내용
1973년 발표한 시집 《농무》의 발문에서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아 마땅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이 시집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부터 그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73년 제1회 만해문학상, 1981년 제8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였다.
(2) 시의 성격: 비판적, 사실적, 자조적
(3) 표현: 역설법, 반어법
(4) 주제: 농민들의 한과 고뇌의 삶
(5) 작품의 시대적 배경: 1960~70년대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공간이었으며, 농민들의 삶 또한 몹시 곤궁하고 비참하다. 겉으로는 농무를 추며 흥겨운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농사를 지어 봤자 비료 값도 안 나오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과 울분을 느끼고 있다.
(6) \'농무\'의 의미: 무너진 농촌의 현실에 울분을 느끼는 \'우리\'는 꽹과리를 앞장세워 거리 농무를 시작하고 도수장에 이르러 점점 신명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신명은 울분의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의 농무는 단순한 연희가 아니라, 삶의 한을 풀어내는 집단적인 신명 풀이로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극복 의지를 상징한다.
(7)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설무대에서의 농무가 끝나고 농민들이 흩어지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농무에 신명에 느끼지 못하는 구경꾼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은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들의 공허한 가슴을 잘 표현해 준다. 다음으로 거리 농무의 과정이 재현된다. 이 때, \'우리\'의 농무는 농촌의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통렬한 비판과 울분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즉, \'우리\'의 농무는 신명나는 춤이 아니라 울분과 한을 분출하는 춤인 것이다.
이쯤에서 처음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는 구절을 되새겨 보면, 그것은 풍요롭고 전원적인 농촌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것을 예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점점 신명이 난다\'고 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허탈감, 허무감, 반항감, 울분 등의 감정을, 빨라지는 장단과 함께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마치 어떤 농촌의 농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농촌 현실과 농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수작이라 하겠다.
(8) 시 선정 이유: 1970년대 급격한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도 농촌은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농가부채 증가, 인구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총각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는 등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차별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 또 다른 위기에 처하고 있어 1970년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Ⅲ. 결론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들은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 광복에 대한 기쁨과 그동안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암울했던 시대사를 조명함과 동시에 광명을 찾은 조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세계의 건설과 희망을 노래한 , 역사적 사명을 담은 시들이 많다.
1970년대 유신 정권의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시인의 민주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대이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투쟁했던 사람 즉, 민주화 투쟁의 전위를 상징한다. 폭압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순국의 의지를 표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 시대의 시인들은 민중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역사와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거짓된 모든 것, 부패한 것, 억압된 것, 외세와 반민족적인 세력을 상징으로 시를 썼다. 진실한 것, 부패하지 않은 것, 외래사상에 물들지 않은 것, 민족정신을 지닌 민중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며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비추는 작품들이 많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1910년 일제강점부터는 일본의 군수기지로서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농촌의 삶은 잊혀져갔다. 시인 신경림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했다. 시는 다소 우리들에게 어렵게 보여지는 상징들이라 생각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들로 다가온다.
(2) 시의 성격: 비판적, 사실적, 자조적
(3) 표현: 역설법, 반어법
(4) 주제: 농민들의 한과 고뇌의 삶
(5) 작품의 시대적 배경: 1960~70년대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공간이었으며, 농민들의 삶 또한 몹시 곤궁하고 비참하다. 겉으로는 농무를 추며 흥겨운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농사를 지어 봤자 비료 값도 안 나오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과 울분을 느끼고 있다.
(6) \'농무\'의 의미: 무너진 농촌의 현실에 울분을 느끼는 \'우리\'는 꽹과리를 앞장세워 거리 농무를 시작하고 도수장에 이르러 점점 신명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신명은 울분의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의 농무는 단순한 연희가 아니라, 삶의 한을 풀어내는 집단적인 신명 풀이로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극복 의지를 상징한다.
(7)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설무대에서의 농무가 끝나고 농민들이 흩어지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농무에 신명에 느끼지 못하는 구경꾼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은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들의 공허한 가슴을 잘 표현해 준다. 다음으로 거리 농무의 과정이 재현된다. 이 때, \'우리\'의 농무는 농촌의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통렬한 비판과 울분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즉, \'우리\'의 농무는 신명나는 춤이 아니라 울분과 한을 분출하는 춤인 것이다.
이쯤에서 처음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는 구절을 되새겨 보면, 그것은 풍요롭고 전원적인 농촌 시대의 막이 내렸다는 것을 예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점점 신명이 난다\'고 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허탈감, 허무감, 반항감, 울분 등의 감정을, 빨라지는 장단과 함께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마치 어떤 농촌의 농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농촌 현실과 농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수작이라 하겠다.
(8) 시 선정 이유: 1970년대 급격한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도 농촌은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농가부채 증가, 인구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총각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는 등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차별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 또 다른 위기에 처하고 있어 1970년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Ⅲ. 결론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들은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 광복에 대한 기쁨과 그동안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암울했던 시대사를 조명함과 동시에 광명을 찾은 조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세계의 건설과 희망을 노래한 , 역사적 사명을 담은 시들이 많다.
1970년대 유신 정권의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시인의 민주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대이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투쟁했던 사람 즉, 민주화 투쟁의 전위를 상징한다. 폭압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순국의 의지를 표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 시대의 시인들은 민중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역사와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거짓된 모든 것, 부패한 것, 억압된 것, 외세와 반민족적인 세력을 상징으로 시를 썼다. 진실한 것, 부패하지 않은 것, 외래사상에 물들지 않은 것, 민족정신을 지닌 민중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며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비추는 작품들이 많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1910년 일제강점부터는 일본의 군수기지로서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농촌의 삶은 잊혀져갔다. 시인 신경림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했다. 시는 다소 우리들에게 어렵게 보여지는 상징들이라 생각되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들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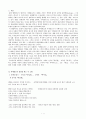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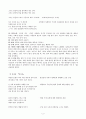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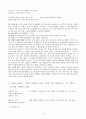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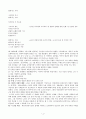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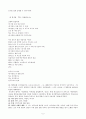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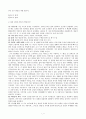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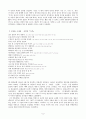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