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신들의 삶만큼이나 아슬아슬한 곤도라 위에서 사회구조에 떠밀림 당해 투신해 버린다. 그러나 그들은 희곡에서도 영화에서도 죽지 않는다. 이러한 결말 구조는 칠수와 만수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현실이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그들을 구속하는 거대한 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준다.
물론 그들의 자살은 이번에 올려 진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초기 작품이 그들의 자살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말하면서 슬픔을 주는 반면에 같은 결말이라 할지라도 이번 작품에서는 희안하게도 희망을 주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출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작품 끝에 쓰인 배경 음악 탓일 것이다. 들국화의 "사노라면"은 작품 결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 나오며 관객들이 그 가사에 빠져들게끔 한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평생인데~"라는 가사는 물질만능주의에 삶 자체가 피폐해진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과 희망을 들려준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공간은 그래도 살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칠수와 만수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굶주리고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만수가 아무리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껴도 그의 꿈은 손쉽게 성취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배경음악을 통해 연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칠수와 만수도 저렇게 웃으며 사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라고 말이다.
* 주제를 부곽시키고 있는 소재
- 무언가를 꿈꾼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반면 꿈이 깨어진다는 것은 추락의 이미지와 꿈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의 냉혹함을 환기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두 작품의 철탑 장면은 상승하려는 꿈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로의 추락을 상징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진다. 곤도라 위에서 잠시 상승의 꿈을 꾸는 것조차, 잠깐 세상을 껌 쪼가리 씹듯 곱씹어 보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가야 한다.
7. 결론- 왜 아직도 재창작되고 있는가.
희곡이 만들어 진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약 20여년의 시간 동안 철수와 만수가 그리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대부분의 면이나 읍이 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해를 더할수록 지역마다 혹은 계층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1986년 이후로 영영 아듀 했던가. 그렇지 않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시간은 흘러 사회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와 오늘날의 사회문제가 혼재 되어 있는 형태를 낳게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더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칠수와 만수’ 라는 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칠수와 만수’ 같은 작품에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품 자체가 가지는 유머와 위트,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유지하는 풍자성이 외적인 요소라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비판의식, 모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곤도라 위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와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내적인 요소라고 보여 진다.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 연장선상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조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수록 다가오는 문제들 역시 이제 라면이 아닌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해서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그들의 자살은 이번에 올려 진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초기 작품이 그들의 자살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말하면서 슬픔을 주는 반면에 같은 결말이라 할지라도 이번 작품에서는 희안하게도 희망을 주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출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작품 끝에 쓰인 배경 음악 탓일 것이다. 들국화의 "사노라면"은 작품 결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 나오며 관객들이 그 가사에 빠져들게끔 한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평생인데~"라는 가사는 물질만능주의에 삶 자체가 피폐해진 우리에게 그나마 위안과 희망을 들려준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공간은 그래도 살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칠수와 만수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굶주리고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만수가 아무리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껴도 그의 꿈은 손쉽게 성취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배경음악을 통해 연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칠수와 만수도 저렇게 웃으며 사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라고 말이다.
* 주제를 부곽시키고 있는 소재
- 무언가를 꿈꾼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반면 꿈이 깨어진다는 것은 추락의 이미지와 꿈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의 냉혹함을 환기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두 작품의 철탑 장면은 상승하려는 꿈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로의 추락을 상징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진다. 곤도라 위에서 잠시 상승의 꿈을 꾸는 것조차, 잠깐 세상을 껌 쪼가리 씹듯 곱씹어 보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가야 한다.
7. 결론- 왜 아직도 재창작되고 있는가.
희곡이 만들어 진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약 20여년의 시간 동안 철수와 만수가 그리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대부분의 면이나 읍이 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해를 더할수록 지역마다 혹은 계층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1986년 이후로 영영 아듀 했던가. 그렇지 않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은 채 시간은 흘러 사회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고,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와 오늘날의 사회문제가 혼재 되어 있는 형태를 낳게 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더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칠수와 만수’ 라는 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칠수와 만수’ 같은 작품에 여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품 자체가 가지는 유머와 위트,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유지하는 풍자성이 외적인 요소라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비판의식, 모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곤도라 위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와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내적인 요소라고 보여 진다.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 연장선상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구조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수록 다가오는 문제들 역시 이제 라면이 아닌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해서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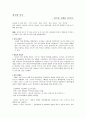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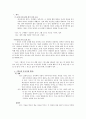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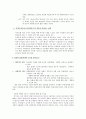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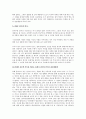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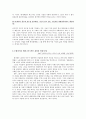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