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전시과제도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 공전·사전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2) 공전의 유형
(3) 공전과 사전의 운영
4. 민전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3) 민전의 경영 형태와 조세 수취
5. 결론
2. 전시과제도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 공전·사전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2) 공전의 유형
(3) 공전과 사전의 운영
4. 민전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3) 민전의 경영 형태와 조세 수취
5. 결론
본문내용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 현종 13년 기사이다. 《고려사》 현종 13년에 호부가 올린 주문 “민전을 抽減(추감)하여 宮庄(궁장)에 소속시킴으로써 민이 征稅(정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에서 ‘민전’이 최초로 등장한다. 신라시대에도 민전과 비슷한 개념인 연수유답전(烟受有田·畓)이 존재했고, 이러한 형태의 민전은 현종 이후 고려 말은 물론 조선시대까지 출현했다. 민전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으며, 특수 행정 구역에도 존재했다. 민전은 토지사유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민전 소유권이란 민전의 매매·증여·상속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사유지의 매매는 신라시대부터 존재한 관행이었으며, 증여는 개인에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 등 기관 또는 집단에게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상속의 경우, ‘조업전, 세업전, 부조전, 부모전’ 등은 조상 대대로 세전된 민전의 다른 이름들이며, 소유권 역시 대대로 전승된다.
민전은 소유 규모에 제한은 없었다. 따라서 세력가는 개간, 탈점, 매득 등으로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고, 빈농은 소작농으로 전락해갔다. 귀족·토호층은 광대한 민전을 소유하고, 농민·천민층은 소규모의 민전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민전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신라시대 이래로 각종 토지에 대해 양전을 실시하고 양안(量案)을 작성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왔다. 개인 민전을 포함한 모든 사유지에는 수조권이 설정 되었으며,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음. 민전주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동시에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항목
설명
자호(字號)
5결(結)을 1자(字)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전의 단위를 <천자문> 순서로 나타냈다.
지번(地番)
각 자(字) 안에서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양전 방향
토지의 방위에 따라 ‘남범(南犯)’ ‘북범(北犯)’ 등으로 표시하였다.
토지의 등급
토지의 비척도(肥瘠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지형
방답(方畓)·직답(直畓)·제답(梯畓)·규답(圭畓) 등으로 구분하였다.
척수
토지의 실제 길이를 양전척으로 측량하여 표시하였다.
사표(四標)
토지의 인접지역 형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표시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진기(陳起)
경작 여부를 밝힌 것.
결부수(結負數)
실제 토지 면적을 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계산한 전답의 넓이.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었다.
주(主)
소유자 표시 : 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기주 起主)가 양반일 경우에는 성명과 함께 그 품계와 직함을 적고, 그에 딸린 가노(家奴)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였다. 평민의 경우에는 직역(職役)과 성명, 천민일 경우에는 천역(賤役) 명칭과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재 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고, 군·현 양안에는 소유주만을 기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나, 소유자와 경작인(또는 소작인)을 함께 기재하기도 하였다.
3) 민전의 경영 형태와 조세 수취
식읍과 녹읍의 경작 형태는 크게 자기경영과 전호제 경영으로 나뉜다. 자기경영의 경우에는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고 생산물을 모두 민전주가 차지한다. 자기경영은 다시 민전주와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 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의 형태로 나뉜다. 자기경영과 달리 전호제 경영은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 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소작농의 형태를 하고 있다.
경작 형태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변천을 겪어왔다. 신라 중대까지는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 형성했으며, 따라서 백정 농민이 민전의 주된 소유계층이었다. 그러나 신라 말부터 대토지를 소유해온 중앙 귀족층과 지방 토호층의 농장이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약한 백정농민들은 매매를 통해 소유지를 팔고 소작농화하여 지주 전호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신라 하대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전호제 경영은 신라 말 이래로 확대 추세를 보여왔다. 고려 전기에 와서도 민전의 전호제 경영은 계속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인하는 제도였다. 이 시기에는 국·공유지에도 전호제 경영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외거노비에게 내장전을 경작시키고 납세하게 했다. 전호 대부분은 일반 백정농민이었으나, 국·공유지의 사례를 통해 외거노비인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고려 전기에는 작게나마 자기 소유의 민전을 가지고 부족한 자작지를 보충하기 위해 타인의 민전을 소작하는 영세 자소작 농민이 많았을 것이나, 후기로 갈수록 소유지를 잃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호제에 의해 경작되는 민전에서의 수조율은 고려 초기부터 분반수취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분반수취는 전체 생산량의 1/2을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여 거두는 조세는 경영 형태와 무관하게 민전주가 1/10 부담하는 십일조법을 따랐으며, 개인수조지인 민전에서의 수조율도 1/10로 동일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였다. 각종 용어들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쟁점이 다양하나,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수록하지 못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들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하고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들을 한 데 모아 정리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토지제도는 국가의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전근대 사회의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고려시대 경제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본고가 일조하기를 기원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시과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재명,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재명, 「공전·사전과 민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박용운, 「토지제도」,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6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민전 소유권이란 민전의 매매·증여·상속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사유지의 매매는 신라시대부터 존재한 관행이었으며, 증여는 개인에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 등 기관 또는 집단에게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상속의 경우, ‘조업전, 세업전, 부조전, 부모전’ 등은 조상 대대로 세전된 민전의 다른 이름들이며, 소유권 역시 대대로 전승된다.
민전은 소유 규모에 제한은 없었다. 따라서 세력가는 개간, 탈점, 매득 등으로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고, 빈농은 소작농으로 전락해갔다. 귀족·토호층은 광대한 민전을 소유하고, 농민·천민층은 소규모의 민전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민전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신라시대 이래로 각종 토지에 대해 양전을 실시하고 양안(量案)을 작성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왔다. 개인 민전을 포함한 모든 사유지에는 수조권이 설정 되었으며,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음. 민전주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동시에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항목
설명
자호(字號)
5결(結)을 1자(字)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전의 단위를 <천자문> 순서로 나타냈다.
지번(地番)
각 자(字) 안에서 필지(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양전 방향
토지의 방위에 따라 ‘남범(南犯)’ ‘북범(北犯)’ 등으로 표시하였다.
토지의 등급
토지의 비척도(肥瘠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지형
방답(方畓)·직답(直畓)·제답(梯畓)·규답(圭畓) 등으로 구분하였다.
척수
토지의 실제 길이를 양전척으로 측량하여 표시하였다.
사표(四標)
토지의 인접지역 형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표시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진기(陳起)
경작 여부를 밝힌 것.
결부수(結負數)
실제 토지 면적을 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계산한 전답의 넓이.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었다.
주(主)
소유자 표시 : 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기주 起主)가 양반일 경우에는 성명과 함께 그 품계와 직함을 적고, 그에 딸린 가노(家奴)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였다. 평민의 경우에는 직역(職役)과 성명, 천민일 경우에는 천역(賤役) 명칭과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재 형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고, 군·현 양안에는 소유주만을 기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나, 소유자와 경작인(또는 소작인)을 함께 기재하기도 하였다.
3) 민전의 경영 형태와 조세 수취
식읍과 녹읍의 경작 형태는 크게 자기경영과 전호제 경영으로 나뉜다. 자기경영의 경우에는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고 생산물을 모두 민전주가 차지한다. 자기경영은 다시 민전주와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 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의 형태로 나뉜다. 자기경영과 달리 전호제 경영은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 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소작농의 형태를 하고 있다.
경작 형태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변천을 겪어왔다. 신라 중대까지는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 형성했으며, 따라서 백정 농민이 민전의 주된 소유계층이었다. 그러나 신라 말부터 대토지를 소유해온 중앙 귀족층과 지방 토호층의 농장이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약한 백정농민들은 매매를 통해 소유지를 팔고 소작농화하여 지주 전호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신라 하대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전호제 경영은 신라 말 이래로 확대 추세를 보여왔다. 고려 전기에 와서도 민전의 전호제 경영은 계속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인하는 제도였다. 이 시기에는 국·공유지에도 전호제 경영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외거노비에게 내장전을 경작시키고 납세하게 했다. 전호 대부분은 일반 백정농민이었으나, 국·공유지의 사례를 통해 외거노비인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고려 전기에는 작게나마 자기 소유의 민전을 가지고 부족한 자작지를 보충하기 위해 타인의 민전을 소작하는 영세 자소작 농민이 많았을 것이나, 후기로 갈수록 소유지를 잃고 토지가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호제에 의해 경작되는 민전에서의 수조율은 고려 초기부터 분반수취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분반수취는 전체 생산량의 1/2을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여 거두는 조세는 경영 형태와 무관하게 민전주가 1/10 부담하는 십일조법을 따랐으며, 개인수조지인 민전에서의 수조율도 1/10로 동일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였다. 각종 용어들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쟁점이 다양하나,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수록하지 못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들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하고 토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들을 한 데 모아 정리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토지제도는 국가의 조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전근대 사회의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고려시대 경제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본고가 일조하기를 기원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시과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재명,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재명, 「공전·사전과 민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박용운, 「토지제도」,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6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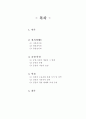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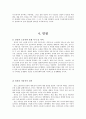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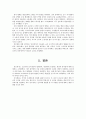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