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병의 형성과 도방
Ⅱ. 교정도감
Ⅲ. 정방
Ⅳ. 서방
Ⅴ. 마별초
Ⅵ. 삼별초
Ⅱ. 교정도감
Ⅲ. 정방
Ⅳ. 서방
Ⅴ. 마별초
Ⅵ. 삼별초
본문내용
아 그 끝이 불분명하다.
Ⅵ. 삼별초
삼별초를 처음 조직한 사람은 무인집정인 최우이며, 그 명칭은 야별초였다. 이 야별초에 대해 편년이 분명한 것으로는 고종 19년 강화로의 천도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김세충의 지위가 ‘야별초지유’였다는 데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우의 집권이 고종 6년이었다는 점과 이를 함께 생각하여 보면 야별초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역시 고종 6년부터 동 19년 사이의 어느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삼별초는 도적을 잡고 폭행을 금지시키는 치안의 유지를 위한 경찰군의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한데 이후 삼별초의 활동을 보면 도성의 수비와 친위대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과 싸우는 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몽고침략군과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종래의 국군이 유명무실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데에 대하여 삼별초가 그 같은 일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그들을 국가의 공병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이들에 대한 보수가 국고로부터 지급된 것 역시 그들이 그런 성격의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삼별초는 중앙군이었다. 이들은 물론 각 지방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그의 조직·소속은 어디까지나 경군에 해당하는 군대였다. 삼별초를 따로이 경별초라 부른 것도 그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별초군은 중앙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조직되고 있었다. 실로 다양한 명칭을 띤 각종 부대들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이들 역시 주로 몽고군과의 전투를 담당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그들의 편성은 아마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며 차츰 상비적인 성격을 지닌 부대들이 생겨났으리라 추측된다.
삼별초 등의 끈질긴 항쟁에도 몽고의 침입군으로 인해 여러모로 시달림을 받았던 고려 조정은 원종 때에 이르러 저들과의 강화를 급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몽고는 그 전제 조건의 하나로 출륙환도를 강력히 요구하였거니와, 몽고 조정에 친조했던 원종은 이를 수락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모두들 환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삼별초는 이에 불복하고 부고를 멋대로 열어 젖혔다. 이른바 삼별초의 난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를 접한 원종은 그들을 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마침내 단호한 조처를 취하여 삼별초를 혁파하고, 이들의 명부를 압수하였다. 이에 배중손과 노영희 등에 지도된 삼별초는 일제히 일어나 개경정부와 몽고에 함께 대항하며 왕족인 승화후 온을 국왕으로 받들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세를 감안하여 본거지를 남해의 요충인 진도로 옮기고는 주변의 거제·제주 등 여러 섬을 지배하는 한편 남방 주민의 호응을 얻어 한때는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1년만에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도는 함락되고, 남은 무리들은 제주로 옮겨 항거하다가 원종 14년에 모두 평정되고 만다.
참고자료
- 최씨정권시대와 대몽항쟁 | 김주찬 저 | 한국파스퇴르 2014
- 고려시대사 | 박용운 | 일지사 2008
-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 윤용혁 저 | 일지사 2000
Ⅵ. 삼별초
삼별초를 처음 조직한 사람은 무인집정인 최우이며, 그 명칭은 야별초였다. 이 야별초에 대해 편년이 분명한 것으로는 고종 19년 강화로의 천도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김세충의 지위가 ‘야별초지유’였다는 데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우의 집권이 고종 6년이었다는 점과 이를 함께 생각하여 보면 야별초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역시 고종 6년부터 동 19년 사이의 어느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삼별초는 도적을 잡고 폭행을 금지시키는 치안의 유지를 위한 경찰군의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한데 이후 삼별초의 활동을 보면 도성의 수비와 친위대로서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과 싸우는 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몽고침략군과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종래의 국군이 유명무실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데에 대하여 삼별초가 그 같은 일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그들을 국가의 공병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이들에 대한 보수가 국고로부터 지급된 것 역시 그들이 그런 성격의 군대였기 때문이었다.
삼별초는 중앙군이었다. 이들은 물론 각 지방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그의 조직·소속은 어디까지나 경군에 해당하는 군대였다. 삼별초를 따로이 경별초라 부른 것도 그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별초군은 중앙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조직되고 있었다. 실로 다양한 명칭을 띤 각종 부대들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이들 역시 주로 몽고군과의 전투를 담당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그들의 편성은 아마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며 차츰 상비적인 성격을 지닌 부대들이 생겨났으리라 추측된다.
삼별초 등의 끈질긴 항쟁에도 몽고의 침입군으로 인해 여러모로 시달림을 받았던 고려 조정은 원종 때에 이르러 저들과의 강화를 급속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몽고는 그 전제 조건의 하나로 출륙환도를 강력히 요구하였거니와, 몽고 조정에 친조했던 원종은 이를 수락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모두들 환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삼별초는 이에 불복하고 부고를 멋대로 열어 젖혔다. 이른바 삼별초의 난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를 접한 원종은 그들을 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마침내 단호한 조처를 취하여 삼별초를 혁파하고, 이들의 명부를 압수하였다. 이에 배중손과 노영희 등에 지도된 삼별초는 일제히 일어나 개경정부와 몽고에 함께 대항하며 왕족인 승화후 온을 국왕으로 받들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세를 감안하여 본거지를 남해의 요충인 진도로 옮기고는 주변의 거제·제주 등 여러 섬을 지배하는 한편 남방 주민의 호응을 얻어 한때는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1년만에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도는 함락되고, 남은 무리들은 제주로 옮겨 항거하다가 원종 14년에 모두 평정되고 만다.
참고자료
- 최씨정권시대와 대몽항쟁 | 김주찬 저 | 한국파스퇴르 2014
- 고려시대사 | 박용운 | 일지사 2008
-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 윤용혁 저 | 일지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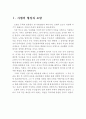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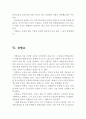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