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먼지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天地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至人은 자기 마음의 거울을 보고 거울의 삶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至人不留行焉」, 즉 至人은 행동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라고 했다.
빈배의 比喩
거울의 삶을 터득한 至人은 자아관념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자유로운 동일성의 세계에서 산다. 이 자유스러운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용시켜 자아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아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울이 지닌 精性의 자유자재한 운동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 지식이 아닌 삶 그 자체의 세계속으로 녹아든다. 그래서 自我(ego) 형태로부터 無我(non-ego)로의 자기 변형이 불교와 도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장자의 다음 비유는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빈배가 그의 배에 와 부딪히면 그가 비록 성급한 사람이라도 성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배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에게 소리칠 것이다. 한 번 소리쳐 듣지 않고 세 번까지 부르게 되면 반드시 나쁜 소리를 하며 따라갈 것이다. 먼저 번에 는 성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성을 내는 것은 먼저 번에는 빈배였다가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아관념없이 (虛己) 세상에 처한다면 누가 그를 해치겠는 가?
이 빈배의 바유는 虛己를 비유한 것이다. 즉 자아로부터 자유스러워졌을 때 - 장자는 이를 虛己, 無己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가 될 수 있다. 형태지어진 관념이 사라지고 비어 있음, 즉 虛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장자의 태도는 결코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전존재가 변형된 이후의 최고 수준의 내적 평온에서 솟아나오는 고유한 순응이다.
물의 比喩
老子의 물의 비유는 유명하다. 道德經 제 8장에서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줄 뿐 일체 다투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으므로 거의 道와 가까운 존재」라고 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하였다.
물은 자아를 고집하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 넣으면 둥글게 되고 각진 그릇에 담으면 각지게 된다. 그러나 물은 작은 냇가를 흐르거나 넓은 강을 흐르거나 물이다. 물은 이와 같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지만 언제나 자기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춰볼 수가 없고 고요한 물에나 비춰보아야 한다. 오직 고요한 것 만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表現上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공평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정적인 마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단지 마음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동적이 과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어느 때는 깨끗하고 어느 때는 흙탕물이 되고, 어느 때는 잔잔하고 어느 때는 소용돌이 치기도 한다.
壯子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고요한 물(止水)란 집착하거나 오염됨이 없이 사물을 본다는 뜻이다. 우리의 언제나 흐르는 마음은 깨끗함과 흙탕, 잔잔함과 소용돌이를 끊임없이 계속한다. 반면 흐르는 마음의 배후에는 不可言表의 궁극적인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가장 내적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수의식의 자연스러운 깨우침이다. 그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空時을 초월하는 절대 순간의 의미심장함을 보여준다.
2. 逍遙로 가는 길
도가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明, 즉 본체론적 통찰과 靜, 즉 고요함(quiescence)의 두 통로가 잇다. 전자는 직관, 즉 불교도들이 Prajna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며, 후자는 禪定 즉 dhyana에 집중한다. 禪定에의 집중은 흔히 점진적인 깨달음의 방법(漸修)이라고 불려지며 직관에의 강조는 홀연한 깨달음의 방법(頓悟)이라고 불린다. 이 두가지 방법들은 道家의 서적들 속에 설명되어 있다. 장자도 이 두가지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스승과 明
직관적 앎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깊숙한 곳의 존재에 대한 개인적 자각이다. 다시 말해서, 직관적인 앎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근본적인 통찰을 통한 순수한 자기 의식(pure self-consciousness)이다. 직관적인 앎은 파생적, 추록적 내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다. 이 직관적 앎은 따라서 일반적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 사고 방식이란 장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지적인 분석과 분석적인 推論이다. 이러한 지식의 가치는 변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며 종속적이다. 일반적 지식의 획득 과정에서는 아는 자와 그 대상은 사로 분리된다. 이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장자가 天運編에 전하는 老子와 孔子 사이의 대화는 직관적인 앎 즉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근본적인 통찰을 통한 開悟의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도를 얻지 못한 공자가 남쪽으로 가서 老子를 만났을 때, 노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북쪽으로부터 온 현명한 사람이라 들었소, 당신은 그래 도를 얻었나요?” 孔子가 대답했다. “아 직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를 찾은 것이요?” “나는 의식과 관례에서 찾은 지 5년 이 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서 찾았소?” “나는 그것을 음양에 서 찾았으나 그 후 12년이 되었어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老子가 설명했다. “ 도가 전해질 수 없었던 이우는 바로 이것이요. 만약 안에 통찰하는 중심이 없으면 도가 거기 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요.” 老子는 계속했다. “다행이오.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와 만나 지 못한 것은 당신이 말하는 六經은 단지 先王들의 진부한 발자취일 뿐이요. 발자취는 신발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신발 그 자체는 아니요. 매(hawks)들은 서로 바라보며 눈동자 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새끼를 배게되는 것이요. 벌레는 숫놈이 짹
빈배의 比喩
거울의 삶을 터득한 至人은 자아관념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자유로운 동일성의 세계에서 산다. 이 자유스러운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용시켜 자아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아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울이 지닌 精性의 자유자재한 운동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미지의 세계, 지식이 아닌 삶 그 자체의 세계속으로 녹아든다. 그래서 自我(ego) 형태로부터 無我(non-ego)로의 자기 변형이 불교와 도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장자의 다음 비유는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빈배가 그의 배에 와 부딪히면 그가 비록 성급한 사람이라도 성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배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에게 소리칠 것이다. 한 번 소리쳐 듣지 않고 세 번까지 부르게 되면 반드시 나쁜 소리를 하며 따라갈 것이다. 먼저 번에 는 성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성을 내는 것은 먼저 번에는 빈배였다가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아관념없이 (虛己) 세상에 처한다면 누가 그를 해치겠는 가?
이 빈배의 바유는 虛己를 비유한 것이다. 즉 자아로부터 자유스러워졌을 때 - 장자는 이를 虛己, 無己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가 될 수 있다. 형태지어진 관념이 사라지고 비어 있음, 즉 虛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장자의 태도는 결코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전존재가 변형된 이후의 최고 수준의 내적 평온에서 솟아나오는 고유한 순응이다.
물의 比喩
老子의 물의 비유는 유명하다. 道德經 제 8장에서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줄 뿐 일체 다투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으므로 거의 道와 가까운 존재」라고 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하였다.
물은 자아를 고집하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 넣으면 둥글게 되고 각진 그릇에 담으면 각지게 된다. 그러나 물은 작은 냇가를 흐르거나 넓은 강을 흐르거나 물이다. 물은 이와 같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지만 언제나 자기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춰볼 수가 없고 고요한 물에나 비춰보아야 한다. 오직 고요한 것 만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表現上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공평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정적인 마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단지 마음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동적이 과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어느 때는 깨끗하고 어느 때는 흙탕물이 되고, 어느 때는 잔잔하고 어느 때는 소용돌이 치기도 한다.
壯子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고요한 물(止水)란 집착하거나 오염됨이 없이 사물을 본다는 뜻이다. 우리의 언제나 흐르는 마음은 깨끗함과 흙탕, 잔잔함과 소용돌이를 끊임없이 계속한다. 반면 흐르는 마음의 배후에는 不可言表의 궁극적인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가장 내적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수의식의 자연스러운 깨우침이다. 그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空時을 초월하는 절대 순간의 의미심장함을 보여준다.
2. 逍遙로 가는 길
도가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明, 즉 본체론적 통찰과 靜, 즉 고요함(quiescence)의 두 통로가 잇다. 전자는 직관, 즉 불교도들이 Prajna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하며, 후자는 禪定 즉 dhyana에 집중한다. 禪定에의 집중은 흔히 점진적인 깨달음의 방법(漸修)이라고 불려지며 직관에의 강조는 홀연한 깨달음의 방법(頓悟)이라고 불린다. 이 두가지 방법들은 道家의 서적들 속에 설명되어 있다. 장자도 이 두가지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스승과 明
직관적 앎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깊숙한 곳의 존재에 대한 개인적 자각이다. 다시 말해서, 직관적인 앎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근본적인 통찰을 통한 순수한 자기 의식(pure self-consciousness)이다. 직관적인 앎은 파생적, 추록적 내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다. 이 직관적 앎은 따라서 일반적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 사고 방식이란 장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지적인 분석과 분석적인 推論이다. 이러한 지식의 가치는 변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며 종속적이다. 일반적 지식의 획득 과정에서는 아는 자와 그 대상은 사로 분리된다. 이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장자가 天運編에 전하는 老子와 孔子 사이의 대화는 직관적인 앎 즉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근본적인 통찰을 통한 開悟의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도를 얻지 못한 공자가 남쪽으로 가서 老子를 만났을 때, 노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북쪽으로부터 온 현명한 사람이라 들었소, 당신은 그래 도를 얻었나요?” 孔子가 대답했다. “아 직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를 찾은 것이요?” “나는 의식과 관례에서 찾은 지 5년 이 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서 찾았소?” “나는 그것을 음양에 서 찾았으나 그 후 12년이 되었어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老子가 설명했다. “ 도가 전해질 수 없었던 이우는 바로 이것이요. 만약 안에 통찰하는 중심이 없으면 도가 거기 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요.” 老子는 계속했다. “다행이오.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와 만나 지 못한 것은 당신이 말하는 六經은 단지 先王들의 진부한 발자취일 뿐이요. 발자취는 신발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신발 그 자체는 아니요. 매(hawks)들은 서로 바라보며 눈동자 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새끼를 배게되는 것이요. 벌레는 숫놈이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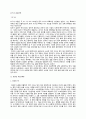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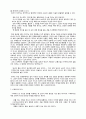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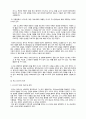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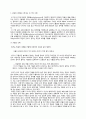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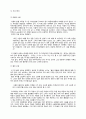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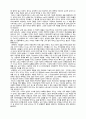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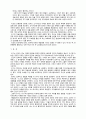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