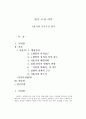
|
계우’의 혼란된 표기로, 「악장가사」에는 ‘계우’로 바로 쓰였다. 「악 학궤범」소재 <처용가>의 다른 곳에도 ‘계우’로 표기되었다. (예:우리옷 계우면 큰 죄 닙고 <월석 2:72>)
- 동사어간 ‘기울’에 선행어미 ‘거’의 ‘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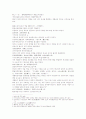
|
遽 遽(갑자기 거; -총17획; ju)
問曰:「仲父言識鬼者乃汝乎?」
거문왈 중부언식귀자내여호?
제환공이 급하게 물으니 “중부[관중]께서 귀신을 아는 사람이 너라고 했는가?”
對曰:「公則自傷耳,鬼安能傷公?」
대왈 공즉자상이 귀안능상
|
|

|
그러기 위해 <용비어천가>, <희문>, <계우>, <혁정>등을 지었다.
3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 실려 있는 윤희의 <봉황음>, 작자 미상의 <유림가>·<북전>, 상진의 <감군은> 등은 고려 속악을 정리하고 새
악장, 악장의 문학적 성격,
|
|

|
계우정난으로 사육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작가는 고독하고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을 직접 배경으로 삼아 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난세의 상황을 작가가 능히 알고 있었을 바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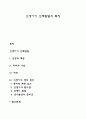
|
계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부모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죽기 전 여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연사 영아들에게서 발견되는 위험 요인들은 대개 미숙아를 출산하였거나 10대의 어머니로부터 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