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자’하면 내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 아내의 죽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그것이다. 어찌 아내의 죽음에 노래냐는 친구의 물음에 그는 답한다.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아무 것도 거리낄 것 없는 즐거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찌 울고불고 하고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죽음을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대인의 풍모가 내가 장자에 들어가기 전의 편견 아닌 편견이다.
장자를 읽고 가장 먼저 든 느낌은 “난감함”이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잠시 빌려 표현한다는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인지도 모른다. 장자에는 우화와 비유들이 가득하다. 공자가 등장할 정도로 별의 별 사람들이 등장하고 숱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가만히 읽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정도다. 주인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도 없어 보인다.
장자는 내편, 외편, 잡편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내편은 장자의 저술로, 외, 잡편은 후대의 저술로 본다. 그런 외, 잡편이 우화로 이루어져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한 반면 내가 건드린 내편은 난해한 사상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뭐 100% 이해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장자를 음미해 보려한다. 노자도 知足不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편에 속하는 2편 제물론을 중심으로 나의 장자 읽기를 풀어보겠다.
이제는 식상하기 조차한 “반잔의 물”비유를 꺼내보자. 그 반잔의 물을 보고 하는 말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물이 반 밖에 없네”라는 반응보다는 “여기 물이 반이나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암묵적인 강요도 덧붙여서 말이다. 우리는 어쩌면 물 반잔을 놓고도 사람을 나누려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자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기 물이 반 있구만...” 어떠한 가치판단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라는 장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장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여기 오이 한 접시가 가득 있다고 하자. 나같이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씻어서 아삭 깨물어 먹고 싶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다면 오이마사지를 떠올릴 테고, 달팽이를 키워 본 사람은 오이를 썰어서 달팽이 먹이로 주고 싶을 것이다. 이처럼 똑같은 오이를 두고서 사람마다의 반응이 다르다. 그런데도 장자의 말대로라면 “오이 한 접시가 있네”라고만 말하고 만다는 것인데 과연 합당한 것인가?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판단을 넘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만 바라보라는 그의 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칸트는 자신의 인식론을 기존의 인식론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유하며 말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인식론은 주어진 명백한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인식해 가는 것이었다면, 칸트의 인식론은 그냥 주어진 대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주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인식해 낸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임에도 말만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든 ‘오이의 비유’가 바로 칸트의 인식이론에 따른 것이다. 칸트는 자신의 인식이론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며 자화자찬(?) 했지만 2000여 년 전의 장자는 이런 칸트의 노력조차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 반잔의 비유’에서는 그저 “물 반잔이 있네”하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던 내 눈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칸트의 인식이론을 들먹이며 다시 생각해보니 장자의 말이 영 신통치 않아 보이는 것도 결국 나 또한 어떤 가치에 빠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된 것이다. 또한 장자와 칸트를 놓고 누구의 견해가 옳은 것인가 따지는 것마저도 장자의 입장에서는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리니... 독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 아마 장자는 독자중심의 글쓰기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
논의를 더 확장시켜보자.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가 있다. 장자는 원숭이의 비유를 들면서 따지고 이해득실이나 따지는 세계를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한 쪽에 치우치지 만도 않고,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도 않으며, 양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늘의 고름(天鈞)’에 머무는 것, ‘두 길을 걸음(兩行)’이라고 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부산하게 좇아 다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들어 연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숭이의 눈으로 보자면 두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는 줏대 없는 회색분자일 따름이고,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 같아 보인다. 참 힘든 노릇이다.
장자를 읽고 가장 먼저 든 느낌은 “난감함”이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잠시 빌려 표현한다는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인지도 모른다. 장자에는 우화와 비유들이 가득하다. 공자가 등장할 정도로 별의 별 사람들이 등장하고 숱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가만히 읽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정도다. 주인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도 없어 보인다.
장자는 내편, 외편, 잡편으로 이루어졌다. 대개 내편은 장자의 저술로, 외, 잡편은 후대의 저술로 본다. 그런 외, 잡편이 우화로 이루어져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한 반면 내가 건드린 내편은 난해한 사상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뭐 100% 이해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장자를 음미해 보려한다. 노자도 知足不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내편에 속하는 2편 제물론을 중심으로 나의 장자 읽기를 풀어보겠다.
이제는 식상하기 조차한 “반잔의 물”비유를 꺼내보자. 그 반잔의 물을 보고 하는 말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물이 반 밖에 없네”라는 반응보다는 “여기 물이 반이나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암묵적인 강요도 덧붙여서 말이다. 우리는 어쩌면 물 반잔을 놓고도 사람을 나누려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자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기 물이 반 있구만...” 어떠한 가치판단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라는 장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장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여기 오이 한 접시가 가득 있다고 하자. 나같이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씻어서 아삭 깨물어 먹고 싶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다면 오이마사지를 떠올릴 테고, 달팽이를 키워 본 사람은 오이를 썰어서 달팽이 먹이로 주고 싶을 것이다. 이처럼 똑같은 오이를 두고서 사람마다의 반응이 다르다. 그런데도 장자의 말대로라면 “오이 한 접시가 있네”라고만 말하고 만다는 것인데 과연 합당한 것인가?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판단을 넘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만 바라보라는 그의 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칸트는 자신의 인식론을 기존의 인식론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유하며 말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인식론은 주어진 명백한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인식해 가는 것이었다면, 칸트의 인식론은 그냥 주어진 대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주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인식해 낸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임에도 말만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든 ‘오이의 비유’가 바로 칸트의 인식이론에 따른 것이다. 칸트는 자신의 인식이론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며 자화자찬(?) 했지만 2000여 년 전의 장자는 이런 칸트의 노력조차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 반잔의 비유’에서는 그저 “물 반잔이 있네”하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던 내 눈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칸트의 인식이론을 들먹이며 다시 생각해보니 장자의 말이 영 신통치 않아 보이는 것도 결국 나 또한 어떤 가치에 빠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된 것이다. 또한 장자와 칸트를 놓고 누구의 견해가 옳은 것인가 따지는 것마저도 장자의 입장에서는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리니... 독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 아마 장자는 독자중심의 글쓰기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
논의를 더 확장시켜보자.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가 있다. 장자는 원숭이의 비유를 들면서 따지고 이해득실이나 따지는 세계를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한 쪽에 치우치지 만도 않고,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도 않으며, 양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늘의 고름(天鈞)’에 머무는 것, ‘두 길을 걸음(兩行)’이라고 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부산하게 좇아 다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들어 연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숭이의 눈으로 보자면 두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는 줏대 없는 회색분자일 따름이고,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 같아 보인다. 참 힘든 노릇이다.
본문내용
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내가 여기 있지만 한순간에 저기 있는 것이 가능 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자가 설마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본 제물론의 주제인 ‘제(齊)한다’는 것은 ‘하나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하나’는 전체주의적인 획일화가 아닌 다양함이 존중받고 어우러지는 하나됨을 말한다. 좁은 시야에서는 구별되어 보이는 개개의 사물들이 크게 보면 하나로 통일되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꾸 분리하고 구별해대지만, 크게 보면 모두 같다는 깨달음이다.
장자는 ‘어느 쪽이 바르게 알겠는가’ 라는 물음에서 핏발 세우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옳을 수 있는 상태를, 여희의 이야기에서는 지금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경지를, 나비의 꿈에서 가치적 편견과 주관적 독선에의 초월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로 통한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유롭게 노닐도록 두는 여유를 장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다수결을 언급하면서 장자가 현상을 탁월하게 분석했지만 대안제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장자는 이렇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자는 참으로 ‘양심 있는 개인주의자’라고 평해본다. 남을 철저히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상식의 틀을 바꾸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에게서 대자유를 느낄 수 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아옹다옹하는 우리들에게 장자가 엷은 미소로 말하는 것이 들리는 듯하다. “허허... 좀 더 너그러워 지면 될 것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본 제물론의 주제인 ‘제(齊)한다’는 것은 ‘하나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하나’는 전체주의적인 획일화가 아닌 다양함이 존중받고 어우러지는 하나됨을 말한다. 좁은 시야에서는 구별되어 보이는 개개의 사물들이 크게 보면 하나로 통일되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꾸 분리하고 구별해대지만, 크게 보면 모두 같다는 깨달음이다.
장자는 ‘어느 쪽이 바르게 알겠는가’ 라는 물음에서 핏발 세우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옳을 수 있는 상태를, 여희의 이야기에서는 지금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경지를, 나비의 꿈에서 가치적 편견과 주관적 독선에의 초월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로 통한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유롭게 노닐도록 두는 여유를 장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다수결을 언급하면서 장자가 현상을 탁월하게 분석했지만 대안제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장자는 이렇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자는 참으로 ‘양심 있는 개인주의자’라고 평해본다. 남을 철저히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상식의 틀을 바꾸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에게서 대자유를 느낄 수 있다.
달팽이 뿔 위에서 아옹다옹하는 우리들에게 장자가 엷은 미소로 말하는 것이 들리는 듯하다. “허허... 좀 더 너그러워 지면 될 것을...”
추천자료
 노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공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묵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맹자의...
노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공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묵자의 교육사상(교육철학), 맹자의... 중국 교육사상가(교육철학자) 노자와 공자, 중국 교육사상가(교육철학자) 묵자와 맹자, 중국 ...
중국 교육사상가(교육철학자) 노자와 공자, 중국 교육사상가(교육철학자) 묵자와 맹자, 중국 ... 퇴마록을 읽고 탈출기를 읽고
퇴마록을 읽고 탈출기를 읽고 가시고기를읽고
가시고기를읽고 가이아를읽고
가이아를읽고 나의_문화유산_답사기를_읽고
나의_문화유산_답사기를_읽고 아큐정전을_읽고_
아큐정전을_읽고_ [독후감] The Goal (더 골)을 읽고 난 뒤 & 더골을 읽고 인상깊었던 대목 20 가지 (엘리 ...
[독후감] The Goal (더 골)을 읽고 난 뒤 & 더골을 읽고 인상깊었던 대목 20 가지 (엘리 ... 자기창조조직읽고 서평
자기창조조직읽고 서평 [독후감] 『밀리언 달러 티켓 (Millionaire Upgrade) - 비행기에서 만난 백만장자 이야기』 ...
[독후감] 『밀리언 달러 티켓 (Millionaire Upgrade) - 비행기에서 만난 백만장자 이야기』 ... ‘나와너’를 읽고.. [서평] 나와너를읽고,재활상담과제,레포트독후감
‘나와너’를 읽고.. [서평] 나와너를읽고,재활상담과제,레포트독후감 [독후감] PR이론(복잡계 PR을 읽고) - 복잡계 PR이란 무엇인가, 복잡계 PR을 읽고 느낀점, 복...
[독후감] PR이론(복잡계 PR을 읽고) - 복잡계 PR이란 무엇인가, 복잡계 PR을 읽고 느낀점, 복...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고 - 총균쇠(총, 세균 그리고 강철)을 읽고 -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고 - 총균쇠(총, 세균 그리고 강철)을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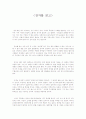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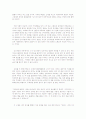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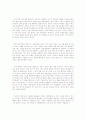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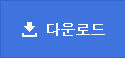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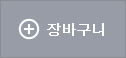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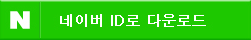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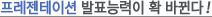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