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려시대 불교와 풍수도참사상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려시대 불교
1) 고려의 성립과 고려 전기 불교
2) 신앙결사를 중심으로 본 고려 중기 불교
3) 고려후기 불교의 흐름
2. 고려시대 천도논의로 살펴본 풍수․도참사상
1) 풍수와 풍수․도참사상
2) 풍수사상
3) 고려사회에서의 풍수․도참사상
(1) 고려 초기
(2) 고려 전반기
(3) 고려 중후반기
(4) 고려말기
Ⅲ. 결론
<참고문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려시대 불교
1) 고려의 성립과 고려 전기 불교
2) 신앙결사를 중심으로 본 고려 중기 불교
3) 고려후기 불교의 흐름
2. 고려시대 천도논의로 살펴본 풍수․도참사상
1) 풍수와 풍수․도참사상
2) 풍수사상
3) 고려사회에서의 풍수․도참사상
(1) 고려 초기
(2) 고려 전반기
(3) 고려 중후반기
(4) 고려말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양주에 남경을 세우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 해 숙종은 친히 양주해 행차하기까지 한다. 숙종 6년에는 南京開創都監(남경개창도감)을 두고 관리를 파견하여 관찰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숙종 9년에 삼각산 남쪽에 남경궁궐을 창건하고 남경을 경영하기에 이른다. 17대 인종 대에는 천도논의를 둘러싸고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 인종 6년, 묘청은 서경에 新宮을 창건할 것을 건의하였다. 묘청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인종 7년에 大花宮을 창건하게 되었고 왕은 수차례 西行하였다. 그러나 대화궁 창건 이후 오히려 災異가 속출하자, 처음 묘청을 지지하던 대부분의 관료들은 거꾸로 묘청 배척파가 되어 국왕에게 西行하지 말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묘청 대에 이르러서 풍수사상의 수준과 위상은 그 절정에 이르는데 묘청은 도선을 인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천도대상지를 묘사한 大花勢(대화세)의 논리와 八聖理論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화세가 천도대상지를 언급한 것이라면, 팔성이론은 백두산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국토재편론으로, 김위제의 저울이론이 새로이 남경을 합리화시킨 것이라면 묘청의 대화세와 팔성이론은 이에 대항하면서 서경을 중심에 세우고자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묘청의 주장은 국도인 개경의 위상을 부정하고 서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서경길지설을 내세워 묘청이 주장한 천도는 국왕의 천도의지와 권위 그리고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열세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묘청은 서경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은 곧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따라 서경길지설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묘청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大花勢로 천도지의 풍수적 조건을 제시하고 팔성이론으로 전국의 국토재편안을 제시했다는 점, 더 나아가 풍수논리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천도까지 도모했다는 점은 풍수사상에 대한 당대 자신감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3) 고려 중후반기 : 풍수도참에 의한 이궁건설기
18대 의종, 19대 명종, 23대 고종, 24대 원종의 10여 년간은 다양한 이궁건설기였다. 물론 앞 시기에도 이궁건설이 있었지만 그 차원이 달랐다. 대략 살펴보면 의종 11년 卜者 영의가 궐동에 새로 익궐을 일으키면 능히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王弟 익양후(후에 明宗)의 第宅을 빼앗아 이궁인 수덕궁을 창건하였다. 다음해에는 白州의 토산 반월강에 궁궐을 지으면 7년 안에 북로를 정복할 것이라는 太史監侯 유원도의 건의에 의해, 의종 12년 白州에 別宮인 중흥궐을 창건하고 순주하였다. 명종 4년에는 좌소 백악산, 우소 백마산, 북소 기달산 등 3개소에 연기궁궐조성관을 두어 이궁을 창건토록 하였다. 고종 4년(1217)에는 거란병의 내침으로 國都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다시 松都 지기쇠약설 및 연기설이 등장하였다. 이에 최충헌은 술사 이지식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백악의 신궐을 창건하여 국가의 위기를 타개코자 하였으며 백악은 좌소백악, 즉 지금 장단의 백학산을 말한다. 고종 21년(1234)에는 어떤 승려 도참가가 참서를 인용하여 고양주(南京)의 땅에 宮闕을 짓고 移御(이어)하면 국업이 800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高宗은 숙종 이래의 南京 구궐에 대하여 신궐을 새로 짓고 21년 7월에 내시 이백전을 시켜 移御(이어)의 대신으로 어의를 봉안하였다. 이 시기 이궁건설의 논리적 근거는 지기쇠왕설에 따른 연기궁궐 조성으로 앞 시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대상지로서 三蘇(삼소)가 등장한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다. 삼소는 좌소 백악산, 우소 백마산, 북소 기달산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다 그 지역에서는 명산으로 치부되었던 곳이다. 이병도는 고려의 삼소제는 동방 古來의 산악신앙, 삼신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三山制의 유풍으로 보았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사상이 유행하여 이것이 전통 산악사상과 결합하여 국도 주위의 三山 三蘇를 단지 神山 으로 숭배할 뿐 아니라 지리도참에 응한 길지로 중시하여 이궁건설과 순주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시기 활발한 풍수논리를 동원하며 국토경영론에 입각하여 이궁건설 및 순주를 시행하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묘청난의 영향으로 巡駐京(순주경)으로서 서경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전반적인 국세가 약해졌으며 더욱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국도 주위에 소규모의 대상지를 삼소라 하여 전통적인 산악신앙으로 합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의 전성기 대의 풍수와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논리 제시나 혹은 재정립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산악신앙을 끌어와 삼소로 합리화하여 사회발전 및 국토경영론과는 유리되면서 왜소화되었다. 이 시대의 풍수사상은 그야말로 깊고 오지인 곳에 이궁 하나를 더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동원되는 논리도 뚜렷한 것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풍수의 수준도 낮고 미신적인 성향이 짙은 시기로 도참적 성향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지기쇠왕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풍수논리가 되기도 하고, 도참이 되기도 한다. 고려전기의 지기쇠왕설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국토경영론에 입각하여 추구되었다면, 고려 중후기의 상황은 현실과 유리되고 논리적 근거도 퇴행적인 측면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지기쇠왕설을 도참적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다.
(4) 고려말기 : 풍수도참에 의한 천도 시도기
이 시기가 앞 시기와 구별되는 것은 고려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대에는 단순한 이궁건설이 아니라 주로 실제적인 천도가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공민왕은 남경으로 천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며 궁궐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이 때의 궁궐 경영이 新造인지 기존의 남경 궁궐의 사용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공민왕은 수년에 걸쳐 궁궐을 지은 뒤 공민왕 9년(1360)천도를 결행하고자 점을 쳤으나 不吉이 나오자 결국 천도를 포기하였다. 천도를 포기한 공민왕은 같은 해 7월 새로 백악에 新宮을 창건케 했다. 공민왕 10년(1363)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까지 피난 갔던 공민왕은 홍건적의 평정으로 환도하는 길에 청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읍을 강화도로
(3) 고려 중후반기 : 풍수도참에 의한 이궁건설기
18대 의종, 19대 명종, 23대 고종, 24대 원종의 10여 년간은 다양한 이궁건설기였다. 물론 앞 시기에도 이궁건설이 있었지만 그 차원이 달랐다. 대략 살펴보면 의종 11년 卜者 영의가 궐동에 새로 익궐을 일으키면 능히 기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王弟 익양후(후에 明宗)의 第宅을 빼앗아 이궁인 수덕궁을 창건하였다. 다음해에는 白州의 토산 반월강에 궁궐을 지으면 7년 안에 북로를 정복할 것이라는 太史監侯 유원도의 건의에 의해, 의종 12년 白州에 別宮인 중흥궐을 창건하고 순주하였다. 명종 4년에는 좌소 백악산, 우소 백마산, 북소 기달산 등 3개소에 연기궁궐조성관을 두어 이궁을 창건토록 하였다. 고종 4년(1217)에는 거란병의 내침으로 國都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다시 松都 지기쇠약설 및 연기설이 등장하였다. 이에 최충헌은 술사 이지식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백악의 신궐을 창건하여 국가의 위기를 타개코자 하였으며 백악은 좌소백악, 즉 지금 장단의 백학산을 말한다. 고종 21년(1234)에는 어떤 승려 도참가가 참서를 인용하여 고양주(南京)의 땅에 宮闕을 짓고 移御(이어)하면 국업이 800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高宗은 숙종 이래의 南京 구궐에 대하여 신궐을 새로 짓고 21년 7월에 내시 이백전을 시켜 移御(이어)의 대신으로 어의를 봉안하였다. 이 시기 이궁건설의 논리적 근거는 지기쇠왕설에 따른 연기궁궐 조성으로 앞 시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대상지로서 三蘇(삼소)가 등장한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다. 삼소는 좌소 백악산, 우소 백마산, 북소 기달산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다 그 지역에서는 명산으로 치부되었던 곳이다. 이병도는 고려의 삼소제는 동방 古來의 산악신앙, 삼신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三山制의 유풍으로 보았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사상이 유행하여 이것이 전통 산악사상과 결합하여 국도 주위의 三山 三蘇를 단지 神山 으로 숭배할 뿐 아니라 지리도참에 응한 길지로 중시하여 이궁건설과 순주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시기 활발한 풍수논리를 동원하며 국토경영론에 입각하여 이궁건설 및 순주를 시행하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묘청난의 영향으로 巡駐京(순주경)으로서 서경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전반적인 국세가 약해졌으며 더욱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국도 주위에 소규모의 대상지를 삼소라 하여 전통적인 산악신앙으로 합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의 전성기 대의 풍수와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논리 제시나 혹은 재정립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산악신앙을 끌어와 삼소로 합리화하여 사회발전 및 국토경영론과는 유리되면서 왜소화되었다. 이 시대의 풍수사상은 그야말로 깊고 오지인 곳에 이궁 하나를 더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동원되는 논리도 뚜렷한 것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풍수의 수준도 낮고 미신적인 성향이 짙은 시기로 도참적 성향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지기쇠왕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풍수논리가 되기도 하고, 도참이 되기도 한다. 고려전기의 지기쇠왕설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국토경영론에 입각하여 추구되었다면, 고려 중후기의 상황은 현실과 유리되고 논리적 근거도 퇴행적인 측면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지기쇠왕설을 도참적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다.
(4) 고려말기 : 풍수도참에 의한 천도 시도기
이 시기가 앞 시기와 구별되는 것은 고려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대에는 단순한 이궁건설이 아니라 주로 실제적인 천도가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공민왕은 남경으로 천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며 궁궐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이 때의 궁궐 경영이 新造인지 기존의 남경 궁궐의 사용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공민왕은 수년에 걸쳐 궁궐을 지은 뒤 공민왕 9년(1360)천도를 결행하고자 점을 쳤으나 不吉이 나오자 결국 천도를 포기하였다. 천도를 포기한 공민왕은 같은 해 7월 새로 백악에 新宮을 창건케 했다. 공민왕 10년(1363)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까지 피난 갔던 공민왕은 홍건적의 평정으로 환도하는 길에 청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읍을 강화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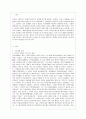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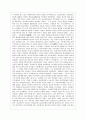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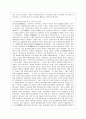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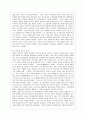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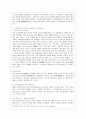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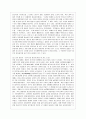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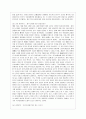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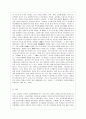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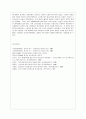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