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霞谷(하곡)鄭齊斗(정제두)의 生涯(생애)
-2.霞谷(하곡) 당시의 朝鮮(조선)의 정치현실
-3.霞谷에게 영향을 준 인물
-1)南溪(남계) 朴世采(박세채)
-明齋(명재)尹拯(윤증)
-4.交友(교우)관계에 나타난 霞谷(하곡)의 양명학적 입장
-1)誠齋(성재) 閔以升(민이승)
-2)明谷(명곡) 崔錫鼎(최석정)
-3)鄭景由(정경유)
- 기타 인물들
-5.霞谷(하곡)의 思想(사상)
-理氣論(이기론)
-心性論(심성론)
-6.결론
-2.霞谷(하곡) 당시의 朝鮮(조선)의 정치현실
-3.霞谷에게 영향을 준 인물
-1)南溪(남계) 朴世采(박세채)
-明齋(명재)尹拯(윤증)
-4.交友(교우)관계에 나타난 霞谷(하곡)의 양명학적 입장
-1)誠齋(성재) 閔以升(민이승)
-2)明谷(명곡) 崔錫鼎(최석정)
-3)鄭景由(정경유)
- 기타 인물들
-5.霞谷(하곡)의 思想(사상)
-理氣論(이기론)
-心性論(심성론)
-6.결론
본문내용
발전하는 것이다.
3)理氣 개념을 통해 본 良知 - 陰陽 二氣의 자연스런 능력 陰陽 二氣로 드러나는 生命 力의 능동성과 관련한 현상 모두가 良知良能에 해당한다.
4)仁義禮智 가운데 智와 유사 - 智는 仁義禮와 마찬가지로 本性이자 本體이며 大本이고, 良知는 作用이며 동시에 本體가 된다.
5)良知는 단순히 智識知覺과 달리 실천과 하나로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으며 외부가 아닌 인간 내면의 良知가 主體的 能動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며 當爲性으로 파 악됨 끝없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生生不息) 창조적인 知이다.
6)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으로서의 良知 양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善의 실현이며 良知良能이란 내 마음 속의 善의 원리이며 맹자가 말한 性善에 해당함, 이는 仁과 같은 개념이며 德의 고유한 능력인 明覺의 기능을 통해 밖을 향해 막힘없이 실천으로 드러나 는 것이지 수양이나 외부의 자극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心性과 良知의 관계
1)性이 良知 良知는 하늘이 준 天賦的 能力으로서의 明德 = 性卽理로서의 眞理이다.
2)마음의 本體가 능히 앎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사람의 生理 全體를 이름한 것이다.
3)良知와 心의 관계
- 마음의 고유한 능력은 앎(知) = 良知의 知 = 생각하는(思) 능력이다.
-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은 理이다.
- 눈귀코입 등의 감각은 心이 외물에 대응 작용할 수 있게 촉발 기초가 되며 心은 내면의 理로 대상을 전환시키며 이 경우 理의 내용은 善이 된다.
4)良知의 출발은 善이며 그 지향점도 善이다.
惻隱之心도 양지이고 惻隱之心의 본체도 양지임(良知의 體用一元적 입장)
-良知의 體用
1)體로서의 良知는 性卽理의 眞理에 해당하고, 用으로서의 良知는 心卽理의 生理에 해당 한다.
2)良知 體用 일원을 주장 “體를 가리켜서 良知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마음의 本體이며, 未發之中이 이것입니다, 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으니, 知善知惡이 이것입 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知이며 分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良知라고 해도 좋습니다.”(答閔誠齊書, 33-34p)
3)良知의 體와 用의 구분 (閔以升에게 보낸 良知體用圖)
- 良知의 體 : 心之性, 心之本然, 未發之中, 四德(仁義禮智)
- 良知의 用 : 心之情, 心之發, 四端(惻隱羞惡辭讓是非), 七情(喜怒哀懼愛惡欲)
良知의 本體는 性이자 眞理이고, 良知의 作用은 心이자 生理이다.
性도 良知이고 心도 良知면서 良知가 體用으로 나뉘는 까닭은 善惡의 문제이다.
(양명과 달리 理를 物理-生理-眞理와 같이 구조적으로 나누고, 양지를 體用으로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 양명학의 任情縱欲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4)良知가 선악에 의해 體用으로 나뉘어도 良知를 하나로 보는 까닭
理氣를 중층구조로 이해하면서도 다시 一元的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의 절대善을 인정하고 그 외곽에 善惡의 共存을 인정하면서도 중심과 외곽의 一元化로 善 실현의 當爲性을 확보하기 위이다.
-良知의 體用과 善惡
1)心性情의 관계
心은 性情을 兼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때 兼한다는 의미는 通涉이나 主宰의 의미 가 아니며 性情은 결코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통해 性情의 一元的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心性情 모두를 一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心性情 모두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心의 體用, 性과 情, 良知의 體와 用으로 구분되는 이유와 善惡의 문제
- “無善無惡이 心之體이다.”(傳習錄 下)
- “心體의 無善惡은 太極이 無極이 되는 것이다.”(存言 中 303p)
< 無極은 만물의 중심인 마음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 가치개념으로 구체화되기 이 전의 자리이며 太極은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대응하여 드러나는 단초(실마리)를 가치개념화한 것>
∴ 善惡의 共存은 마음속의 理가 드러나 쓰이기 시작한 이후의 문제이며, 慾心에 근거 한 氣의 작위적인 움직임에 의해 惡이 생기는 것, 마음속의 理가 드러나 쓰이는 부 분이 良知의 작용이며 이 부분이 良知體用圖의 ‘心之發,’로 표현된다.
3)四端七情이 배속되어 있는 ‘良知의 用’ 부분과 善惡의 공존문제 私慾의 개입 여부
- “惻隱羞惡辭讓是非 의 心은 性이지만, 過不及이 있게 되는 것은 私가 가리기 때 문이다. 喜怒哀樂의 情또한 性이지만, 中節한 것도 있고 不中節한 것도 있는 것은 慾이 끼어들어간 때문이다.(存言 中 312p)
- “喜怒哀樂이 氣를 따르면 포악해지기 쉬우니, 이것이 바로 私慾客氣이다. 惻隱과 羞 惡가 理가 되는 것은 안 드러나기 쉬우니, 이것이 本心天理이다.~.”(存言 上 294p)
4)善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님
- “善과 惡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 本然之理를 따르는 것을 善이라 하고 氣에 흔들려서 작용하는 것을 惡이라고 한다. 행동이 비록 善하더라도 진실로 氣에 흔들린 것이 있 다면 善의 본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善도 고정된 어떤 것만을 가지고 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理를 따르는 것을 가지고 至善이라 하고 性善이라고 할 뿐이니, 실 제로 善이란 고정된 이름이 없다.”(存言 中 306p)
6.결론:
이상으로 霞谷(하곡) 鄭齊斗(정제두)의 사상과 연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하곡은 출신 성분으로는 사촌형이 왕의 부마였고, 스승은 小論(소론)의 영수이자, 노론의 尤庵(우암)의 제자들에게서 학문함으로써 양명학을 함에도 절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문난적으로 지적 받은 양명학을 함에서 하곡은 동문과 스승으로부터 버림 받으면서도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학문함을 통해 한국양명학을 전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강화도에서 江華(강화)학파를 형성하여 朝鮮(조선)양명학의 맥을 이어 가게 만들었다. 鄭齊斗(정제두)를 통해 드러나는 양명학은 實心(실심)에 근거를 하여 성리학과 조선후기 實學(실학)의 태동을 이어주는 架橋(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들의 후예들은 조선후기 일제 치정 하에 독립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백암 박은식이나 정인보 등으로 나타나며, 끝까지 실심을 잃지 않고 마음에 입각한 양명학자로서의 지조를 지킨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3)理氣 개념을 통해 본 良知 - 陰陽 二氣의 자연스런 능력 陰陽 二氣로 드러나는 生命 力의 능동성과 관련한 현상 모두가 良知良能에 해당한다.
4)仁義禮智 가운데 智와 유사 - 智는 仁義禮와 마찬가지로 本性이자 本體이며 大本이고, 良知는 作用이며 동시에 本體가 된다.
5)良知는 단순히 智識知覺과 달리 실천과 하나로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으며 외부가 아닌 인간 내면의 良知가 主體的 能動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며 當爲性으로 파 악됨 끝없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生生不息) 창조적인 知이다.
6)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으로서의 良知 양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善의 실현이며 良知良能이란 내 마음 속의 善의 원리이며 맹자가 말한 性善에 해당함, 이는 仁과 같은 개념이며 德의 고유한 능력인 明覺의 기능을 통해 밖을 향해 막힘없이 실천으로 드러나 는 것이지 수양이나 외부의 자극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心性과 良知의 관계
1)性이 良知 良知는 하늘이 준 天賦的 能力으로서의 明德 = 性卽理로서의 眞理이다.
2)마음의 本體가 능히 앎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사람의 生理 全體를 이름한 것이다.
3)良知와 心의 관계
- 마음의 고유한 능력은 앎(知) = 良知의 知 = 생각하는(思) 능력이다.
-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은 理이다.
- 눈귀코입 등의 감각은 心이 외물에 대응 작용할 수 있게 촉발 기초가 되며 心은 내면의 理로 대상을 전환시키며 이 경우 理의 내용은 善이 된다.
4)良知의 출발은 善이며 그 지향점도 善이다.
惻隱之心도 양지이고 惻隱之心의 본체도 양지임(良知의 體用一元적 입장)
-良知의 體用
1)體로서의 良知는 性卽理의 眞理에 해당하고, 用으로서의 良知는 心卽理의 生理에 해당 한다.
2)良知 體用 일원을 주장 “體를 가리켜서 良知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마음의 本體이며, 未發之中이 이것입니다, 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으니, 知善知惡이 이것입 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知이며 分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良知라고 해도 좋습니다.”(答閔誠齊書, 33-34p)
3)良知의 體와 用의 구분 (閔以升에게 보낸 良知體用圖)
- 良知의 體 : 心之性, 心之本然, 未發之中, 四德(仁義禮智)
- 良知의 用 : 心之情, 心之發, 四端(惻隱羞惡辭讓是非), 七情(喜怒哀懼愛惡欲)
良知의 本體는 性이자 眞理이고, 良知의 作用은 心이자 生理이다.
性도 良知이고 心도 良知면서 良知가 體用으로 나뉘는 까닭은 善惡의 문제이다.
(양명과 달리 理를 物理-生理-眞理와 같이 구조적으로 나누고, 양지를 體用으로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 양명학의 任情縱欲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4)良知가 선악에 의해 體用으로 나뉘어도 良知를 하나로 보는 까닭
理氣를 중층구조로 이해하면서도 다시 一元的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의 절대善을 인정하고 그 외곽에 善惡의 共存을 인정하면서도 중심과 외곽의 一元化로 善 실현의 當爲性을 확보하기 위이다.
-良知의 體用과 善惡
1)心性情의 관계
心은 性情을 兼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때 兼한다는 의미는 通涉이나 主宰의 의미 가 아니며 性情은 결코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통해 性情의 一元的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心性情 모두를 一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心性情 모두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心의 體用, 性과 情, 良知의 體와 用으로 구분되는 이유와 善惡의 문제
- “無善無惡이 心之體이다.”(傳習錄 下)
- “心體의 無善惡은 太極이 無極이 되는 것이다.”(存言 中 303p)
< 無極은 만물의 중심인 마음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 가치개념으로 구체화되기 이 전의 자리이며 太極은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대응하여 드러나는 단초(실마리)를 가치개념화한 것>
∴ 善惡의 共存은 마음속의 理가 드러나 쓰이기 시작한 이후의 문제이며, 慾心에 근거 한 氣의 작위적인 움직임에 의해 惡이 생기는 것, 마음속의 理가 드러나 쓰이는 부 분이 良知의 작용이며 이 부분이 良知體用圖의 ‘心之發,’로 표현된다.
3)四端七情이 배속되어 있는 ‘良知의 用’ 부분과 善惡의 공존문제 私慾의 개입 여부
- “惻隱羞惡辭讓是非 의 心은 性이지만, 過不及이 있게 되는 것은 私가 가리기 때 문이다. 喜怒哀樂의 情또한 性이지만, 中節한 것도 있고 不中節한 것도 있는 것은 慾이 끼어들어간 때문이다.(存言 中 312p)
- “喜怒哀樂이 氣를 따르면 포악해지기 쉬우니, 이것이 바로 私慾客氣이다. 惻隱과 羞 惡가 理가 되는 것은 안 드러나기 쉬우니, 이것이 本心天理이다.~.”(存言 上 294p)
4)善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님
- “善과 惡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 本然之理를 따르는 것을 善이라 하고 氣에 흔들려서 작용하는 것을 惡이라고 한다. 행동이 비록 善하더라도 진실로 氣에 흔들린 것이 있 다면 善의 본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善도 고정된 어떤 것만을 가지고 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理를 따르는 것을 가지고 至善이라 하고 性善이라고 할 뿐이니, 실 제로 善이란 고정된 이름이 없다.”(存言 中 306p)
6.결론:
이상으로 霞谷(하곡) 鄭齊斗(정제두)의 사상과 연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하곡은 출신 성분으로는 사촌형이 왕의 부마였고, 스승은 小論(소론)의 영수이자, 노론의 尤庵(우암)의 제자들에게서 학문함으로써 양명학을 함에도 절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문난적으로 지적 받은 양명학을 함에서 하곡은 동문과 스승으로부터 버림 받으면서도 끝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학문함을 통해 한국양명학을 전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강화도에서 江華(강화)학파를 형성하여 朝鮮(조선)양명학의 맥을 이어 가게 만들었다. 鄭齊斗(정제두)를 통해 드러나는 양명학은 實心(실심)에 근거를 하여 성리학과 조선후기 實學(실학)의 태동을 이어주는 架橋(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들의 후예들은 조선후기 일제 치정 하에 독립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백암 박은식이나 정인보 등으로 나타나며, 끝까지 실심을 잃지 않고 마음에 입각한 양명학자로서의 지조를 지킨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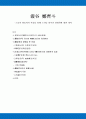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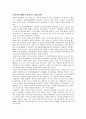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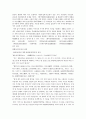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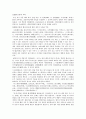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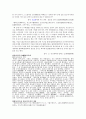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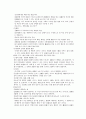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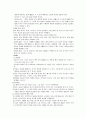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