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하곡학의 연원과 양명학 수용
2. 한국 양명학의 태두 하곡 정제두
Ⅱ. 양명학의 성립과 치양지론의 문제점
III. 양지론의 전개양상
Ⅳ. 양명학의 한국적 변용--양지체용도 분석을 중심으로--
Ⅴ. 하곡양명학 사상의 동아시아적 위치
Ⅵ. 맺음말
<참고문헌>
1. 하곡학의 연원과 양명학 수용
2. 한국 양명학의 태두 하곡 정제두
Ⅱ. 양명학의 성립과 치양지론의 문제점
III. 양지론의 전개양상
Ⅳ. 양명학의 한국적 변용--양지체용도 분석을 중심으로--
Ⅴ. 하곡양명학 사상의 동아시아적 위치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실한 해·달·별들(日月列宿)의 질서를 바로잡는 꿈의 체험이나 인간의 마음(본성)의 본래적 자연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타자와의 일체감(만물일체의 마음)이 마침내 행위와 실천을 드러내게 되는 [추선부(鰍昺賦)]가 중국 양명학의 만물일체론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또 일본 양명학의 경우에도 시처위(時處位)론과 권도(權道)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토오쥬나 구마자와 반쟌(熊澤蕃山), 그리고 이른바 \'오오시오 헤이하찌로오(大鹽平八郞)의 반란\'으로 유명한 오오시오 츄사이(大鹽中齋), 李卓吾(贄)의 사상에서 감명을 받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서 처럼 여전히 실천적 행동적 성향은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그런데 하곡의 양지체용론을 통해서 표현된 만물일체론은 중일의 그것과 달리, 단지 소박하고 안정된 체계로서 모색되고 있다. 이것은 앞선 설명들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양지체용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성정체용합일적 사유에 의해 양지를 이해하고 있음으로 이것이 [양지에 관한 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지의 체]와 [양지의 용]은 [심지성]과 [심지정]의 밑에 그 수반적 부수적인 위치로서 그 영역이 마련되어 양지론과 그에 기초한 만물일체론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역동적으로 파악되고 논의되기 보다는 정적이고 안정된 체계로서 밖에 설명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곡은 치양지 해석에 있어서 [양지에 이른다(至)]고 해석함으로써 일본의 토오쥬와 해석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하곡의 경우 양지를 체와 용으로 구분해 봄으로써 결국 양지의 체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토오쥬는 양지를 체와 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지를 인격신과 결부시켜서, 지금 그대로 완성된(當下現成)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치양지는 양지 즉 절대적인 인격신에 이른다는 의미가 되어 양자 사이에는 그 의미 내용상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하곡의 양명학 사상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生理]론 같은 것이 있으나, 이것이 하곡의 특징있는 사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일의 양명학자들의 사상과도 비교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 우리는 하곡의 양지체용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양명학 사상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윤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자리매김을 시도해 보았다. 하곡의 양지체용론은 어떤 형태로든 양지를 승인하고 그것을 중추로 인간의 자기완성 능력,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학내부에서 전승되는 성선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그는 유교적 윤리도덕체계를 중시했던 학자였으며, 그러한 틀 속에서 착실히 양명학 사상도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중국, 일본 양명학에서 보여지는 삼교합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양명학을 전개하도록 만들었던 점이기도 하다.
흔히 종래의 연구에서, 하곡의 <家法>에 근거하여 그가 [철저한 신분주의자]였으며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하여 그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창조적 행동가일 수 없다]는 지적으로 그의 사상적 한계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종래 이와같이 하곡 사상의 사회성을 소박하게 [당시의 상황],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사상적 풍토에 의한 제약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그의 사상적인 문제를 너무 간단히 사상이 생기한 당시 사회라는 기준(틀)에 전가시켜 버리는 것은 아마도 소극적인 평가 방법이라 해야할 것이다. 차라리 이것을 우리는 하곡의 사상 자체의 내적인 발전과정에 입각해서 착실히 구해 보는 이른바 적극적인 평가방법을 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즉, 그의 양지체용론을 단서로 이해해 본다면, 이미 논의되었듯이, 왕양명의 심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양지의 혼륜일체성, 완전성, 주관성 내지 주체적 능력의 선천성에 대한 과잉강조-을 탈피하고 그것을 체와 용이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춤으로써 체제교학(주자학)과도 연계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는, 말하자면 양명학 전개상의 일단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 점이 중일 양명학과 비교해 볼 때, 그 한국적 변용이 보여주는 특징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분제 고수에 대한 자유 혹은 자주라는 서양 근대적인 평가의 렌즈를 통해서 하곡을 단순히 [철저한 신분주의자]로만 상정해버린다면 그는 결국 조선시대의 체제교학인 주자학의 개량주의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곡 사상의 실학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마저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동시에 [하곡학]이 주자학과의 대립 속에서 이룩해 낸 사상적 기능이나 의의도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의 학문이 우세한 주자학적 학문 분위기 속에서 영위되었다고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사상을 귀중물로서 미화 또는 과장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 하곡 사상에 대한 고정된 정의를 내세우고 개개의 사실을 그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하곡이 그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못했던가, 그렇다면 또 그러했던 그 사상적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객관적 비판작업을 거쳐 다양한 각도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하곡학]의 제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顧炎武, {日知錄}, 臺灣商務印書館, 人人文庫18
[明史], {二十五史}48/49, 藝文印書館
王守仁, {王陽明全集}, 上海:古籍出版社, 1992
王心齋, {重鐫心齋王先生全集} 日本 內閣文庫所藏, 萬歷年間
梁汝元, {何心隱集}, 北京:中華書局, 1960
陸?基, {三魚堂全集}, 上海:掃葉山房, 宣統3年
李贄, {焚書}, 北京:中華書局, 1959
程滯·程顥, {二程集}2, 北京:中華書局, 1981
鄭齊斗, {霞谷全集}, 서울:여강출판사, 1988
朱熹, {朱子語類}2, 北京:中華書局, 1986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臺北: 大化書局, 民國74
崔鳴吉, {遲川集}, 韓國文集叢刊89
黃梨洲, {明儒學案}, 北京:中華書局, 1985
마지막으로, 하곡은 치양지 해석에 있어서 [양지에 이른다(至)]고 해석함으로써 일본의 토오쥬와 해석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하곡의 경우 양지를 체와 용으로 구분해 봄으로써 결국 양지의 체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토오쥬는 양지를 체와 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지를 인격신과 결부시켜서, 지금 그대로 완성된(當下現成)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치양지는 양지 즉 절대적인 인격신에 이른다는 의미가 되어 양자 사이에는 그 의미 내용상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하곡의 양명학 사상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生理]론 같은 것이 있으나, 이것이 하곡의 특징있는 사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일의 양명학자들의 사상과도 비교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 우리는 하곡의 양지체용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양명학 사상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윤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자리매김을 시도해 보았다. 하곡의 양지체용론은 어떤 형태로든 양지를 승인하고 그것을 중추로 인간의 자기완성 능력,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학내부에서 전승되는 성선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그는 유교적 윤리도덕체계를 중시했던 학자였으며, 그러한 틀 속에서 착실히 양명학 사상도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중국, 일본 양명학에서 보여지는 삼교합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양명학을 전개하도록 만들었던 점이기도 하다.
흔히 종래의 연구에서, 하곡의 <家法>에 근거하여 그가 [철저한 신분주의자]였으며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하여 그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창조적 행동가일 수 없다]는 지적으로 그의 사상적 한계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종래 이와같이 하곡 사상의 사회성을 소박하게 [당시의 상황],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사상적 풍토에 의한 제약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그의 사상적인 문제를 너무 간단히 사상이 생기한 당시 사회라는 기준(틀)에 전가시켜 버리는 것은 아마도 소극적인 평가 방법이라 해야할 것이다. 차라리 이것을 우리는 하곡의 사상 자체의 내적인 발전과정에 입각해서 착실히 구해 보는 이른바 적극적인 평가방법을 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즉, 그의 양지체용론을 단서로 이해해 본다면, 이미 논의되었듯이, 왕양명의 심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양지의 혼륜일체성, 완전성, 주관성 내지 주체적 능력의 선천성에 대한 과잉강조-을 탈피하고 그것을 체와 용이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춤으로써 체제교학(주자학)과도 연계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는, 말하자면 양명학 전개상의 일단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 점이 중일 양명학과 비교해 볼 때, 그 한국적 변용이 보여주는 특징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분제 고수에 대한 자유 혹은 자주라는 서양 근대적인 평가의 렌즈를 통해서 하곡을 단순히 [철저한 신분주의자]로만 상정해버린다면 그는 결국 조선시대의 체제교학인 주자학의 개량주의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하곡 사상의 실학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마저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동시에 [하곡학]이 주자학과의 대립 속에서 이룩해 낸 사상적 기능이나 의의도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의 학문이 우세한 주자학적 학문 분위기 속에서 영위되었다고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사상을 귀중물로서 미화 또는 과장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 하곡 사상에 대한 고정된 정의를 내세우고 개개의 사실을 그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하곡이 그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못했던가, 그렇다면 또 그러했던 그 사상적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객관적 비판작업을 거쳐 다양한 각도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하곡학]의 제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顧炎武, {日知錄}, 臺灣商務印書館, 人人文庫18
[明史], {二十五史}48/49, 藝文印書館
王守仁, {王陽明全集}, 上海:古籍出版社, 1992
王心齋, {重鐫心齋王先生全集} 日本 內閣文庫所藏, 萬歷年間
梁汝元, {何心隱集}, 北京:中華書局, 1960
陸?基, {三魚堂全集}, 上海:掃葉山房, 宣統3年
李贄, {焚書}, 北京:中華書局, 1959
程滯·程顥, {二程集}2, 北京:中華書局, 1981
鄭齊斗, {霞谷全集}, 서울:여강출판사, 1988
朱熹, {朱子語類}2, 北京:中華書局, 1986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臺北: 大化書局, 民國74
崔鳴吉, {遲川集}, 韓國文集叢刊89
黃梨洲, {明儒學案}, 北京:中華書局, 1985
키워드
추천자료
 사회복지와 기능주의 이론
사회복지와 기능주의 이론 성리학의 역사와 전개과정
성리학의 역사와 전개과정 한국에서 종교의 의미-기독교의 입장에서 무교와 유교
한국에서 종교의 의미-기독교의 입장에서 무교와 유교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서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서 ( 중소기업경영론 )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A+ 완성형
( 중소기업경영론 )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A+ 완성형 [프랑스문화] 『프랑스의 철학교육과 현대미술의 기원(사실주의,낭만주의,인상주의)』에 대하여
[프랑스문화] 『프랑스의 철학교육과 현대미술의 기원(사실주의,낭만주의,인상주의)』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장애인자활]장애인자립생활의 개념과 철학, 장애인자립생활의 등장배경, 장애인...
[장애인복지][장애인자활]장애인자립생활의 개념과 철학, 장애인자립생활의 등장배경, 장애인... 이윤택 오구, 죽음의 형식 연극 분석
이윤택 오구, 죽음의 형식 연극 분석 시장의 철학에 대해 설명
시장의 철학에 대해 설명 프랑크푸르트학파
프랑크푸르트학파  [기업 경영시스템][호텔기업 경영시스템][한국기업 경영시스템][미국기업 경영시스템][중국기...
[기업 경영시스템][호텔기업 경영시스템][한국기업 경영시스템][미국기업 경영시스템][중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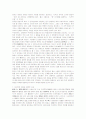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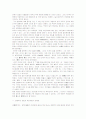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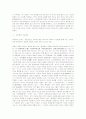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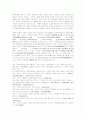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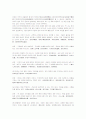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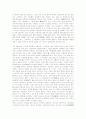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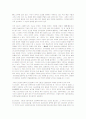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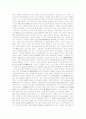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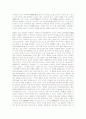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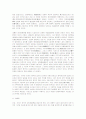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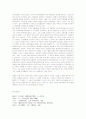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