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소론에 속했던 까닭에 그의 학문은 당시의 사상풍토, 정치권의 구도 속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자손이나 인척들에게 가학으로 계승되었다.
그의 양지 체용론은 어떤 형태로든 양지를 승인하고 그것을 중핵으로 하여 인간의 자기 완성 능력,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양지 체용론은 유학 내부에서 전승되어 온 성선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유교적 윤리 도덕 체계를 중시한 학자였으며, 그 틀 안에서 착실히 양명학 사상을 모색한 사람이었다. 이는 그의 사상이 중국이나 일본의 양명학에서 보이는 三敎 합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양명학을 전개하도록 만든 동인이기도 하였다. 정제두의 양지 체용론이 왕수인의 심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양지의 혼륜 일체성, 완전성, 주관성 또는 주체적 능력의 선천성에 대한 과잉 강조 따위-을 탈피하고자 하여 나온 산물이라는 것, 아울러 양지를 체와 용이라는 합리적 틀 안에서 이해함으로 해서 체제 교학(주자학)과도 연계될 수 있는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 등 양명학 전개 과정에서 이뤄 낸 일단의 발전적 측면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점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양명학과 비교하여 그 한국적 변용을 보여 주는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나 \'자주\'와 같은 평가 렌즈를 통해 정제두가 서양식의 근대화에 접근하지 못했다거나 \'철저한 신분주의자\'였다고만 규정해 버린다면, 그는 결국 조선시대 체제 교학이었던 주자학의 개량을 외친 한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곡학\'이 주자학과의 대립 속에서 이룩해 낸 사상적 기능이나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의 양명학이 전반적인 주자학 분위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개되었다는 점만을 과장하여 무조건 미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몇 권의 책으로 정제두의 사상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제두는 우리 나라 양명학의 집대성자 임은 분명할 것이다. 또한 양명학의 시초인 왕수인과는 조금 다른 즉 우리 나라 자체의 특성이 담긴 양명학을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상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반대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다. 정제두의 양명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룩되었다. 그의 사상을 하나의 작은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의 양지 체용론은 어떤 형태로든 양지를 승인하고 그것을 중핵으로 하여 인간의 자기 완성 능력,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양지 체용론은 유학 내부에서 전승되어 온 성선론을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유교적 윤리 도덕 체계를 중시한 학자였으며, 그 틀 안에서 착실히 양명학 사상을 모색한 사람이었다. 이는 그의 사상이 중국이나 일본의 양명학에서 보이는 三敎 합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유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양명학을 전개하도록 만든 동인이기도 하였다. 정제두의 양지 체용론이 왕수인의 심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양지의 혼륜 일체성, 완전성, 주관성 또는 주체적 능력의 선천성에 대한 과잉 강조 따위-을 탈피하고자 하여 나온 산물이라는 것, 아울러 양지를 체와 용이라는 합리적 틀 안에서 이해함으로 해서 체제 교학(주자학)과도 연계될 수 있는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 등 양명학 전개 과정에서 이뤄 낸 일단의 발전적 측면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점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양명학과 비교하여 그 한국적 변용을 보여 주는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나 \'자주\'와 같은 평가 렌즈를 통해 정제두가 서양식의 근대화에 접근하지 못했다거나 \'철저한 신분주의자\'였다고만 규정해 버린다면, 그는 결국 조선시대 체제 교학이었던 주자학의 개량을 외친 한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곡학\'이 주자학과의 대립 속에서 이룩해 낸 사상적 기능이나 의의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의 양명학이 전반적인 주자학 분위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개되었다는 점만을 과장하여 무조건 미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몇 권의 책으로 정제두의 사상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제두는 우리 나라 양명학의 집대성자 임은 분명할 것이다. 또한 양명학의 시초인 왕수인과는 조금 다른 즉 우리 나라 자체의 특성이 담긴 양명학을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상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반대적인 사상이 있을 수 있다. 정제두의 양명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룩되었다. 그의 사상을 하나의 작은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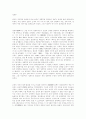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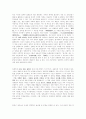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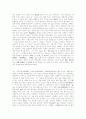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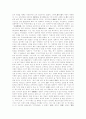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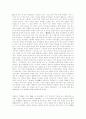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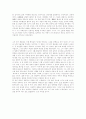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