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게 있어 행위하는 몸은 그 자체로 주체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 몸이 세계와 몸 밖에 있는 다른 실체, 원인 또는 작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반면 푸코에게서의 몸은 행위하는 ‘것’이지만 어떤 구조에 의해 종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조 속의 주체로 위치한다. 이러한 종속, 곧 구조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는 의도적인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의 섬세한 규율기술과 훈육기술이다.
메를로퐁티가 세계를 획득한다고 여겼던 습관은 사실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습관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는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그의 몸에는 습관의 형태로 권력이 투여된다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가 이해한 습관대로라면 우리는 습관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인 주체로 서게 된다. 그런데 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에 적합한 능력을 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규율과 훈육이 몸에 각인됨으로써 그를 규율 권력의 구조에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고 한 푸코의 주장과 접합될 가능성은 없는가?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습관은 세계에의 존재가 그 몸틀을 통해 확장된 것이며 이러한 습관은 지향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확장하는 세계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며 존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주체는 다시금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확립하기에 이른다. 일종의 구조화된 존재가 스스로 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메를로퐁티는 어떤 행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주목한 푸코의 이론은 메를로퐁티와 푸코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푸코는 규율되었기에 의도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서 규율된 의미, 곧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다만 그렇다면 규율과 훈육이 내재화된 몸은 어떤 성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대목은 오히려 푸코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메를로퐁티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규율되는 우리 몸은 사실 훈련의 요소가 이미 항상 내재되어 있는 몸이다. 그렇기에 규율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규율의 내용 내지는 요소는 본래 주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규율은 능동적인 과정으로 역전된다. 따라서 수동적인 뉘앙스가 강했던 푸코의 규율 이론은 메를로퐁티와 만나게 되면 능동적인 뉘앙스로 바뀌게 된다. 또한 그 요소가 주체에게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동원된 요소들은 그 상황을 주체의 방향으로 획득시킨다. 세계를 획득하는 것이라던 습관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를 획득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몸이 갖는 유용성은 증대된다. 그것이 바로 길들임 내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개념은 서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라, 『몸 주체 권력』, 이학사, 2011.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동녘, 2013.
메를로퐁티가 세계를 획득한다고 여겼던 습관은 사실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습관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는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그의 몸에는 습관의 형태로 권력이 투여된다고 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가 이해한 습관대로라면 우리는 습관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능동적인 주체로 서게 된다. 그런데 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에 적합한 능력을 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규율과 훈육이 몸에 각인됨으로써 그를 규율 권력의 구조에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고 한 푸코의 주장과 접합될 가능성은 없는가?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습관은 세계에의 존재가 그 몸틀을 통해 확장된 것이며 이러한 습관은 지향성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확장하는 세계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며 존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주체는 다시금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확립하기에 이른다. 일종의 구조화된 존재가 스스로 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메를로퐁티는 어떤 행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주목한 푸코의 이론은 메를로퐁티와 푸코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푸코는 규율되었기에 의도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서 규율된 의미, 곧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다만 그렇다면 규율과 훈육이 내재화된 몸은 어떤 성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대목은 오히려 푸코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메를로퐁티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규율되는 우리 몸은 사실 훈련의 요소가 이미 항상 내재되어 있는 몸이다. 그렇기에 규율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규율의 내용 내지는 요소는 본래 주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규율은 능동적인 과정으로 역전된다. 따라서 수동적인 뉘앙스가 강했던 푸코의 규율 이론은 메를로퐁티와 만나게 되면 능동적인 뉘앙스로 바뀌게 된다. 또한 그 요소가 주체에게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동원된 요소들은 그 상황을 주체의 방향으로 획득시킨다. 세계를 획득하는 것이라던 습관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를 획득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몸이 갖는 유용성은 증대된다. 그것이 바로 길들임 내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개념은 서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라, 『몸 주체 권력』, 이학사, 2011.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철학, 동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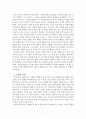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