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ase.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2). 하자 없는 의사표시
2. 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종류
3. 선의의 제 3자의 의의
4. 관련판례
Application.
Conclusion.
참고문헌.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2). 하자 없는 의사표시
2. 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종류
3. 선의의 제 3자의 의의
4. 관련판례
Application.
Conclus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2항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X를 선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제1설에 따르면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고 경과실도 없는”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X는 평소 서완석교수가 어음거래를 잘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X는 경과실이 아닌 그보다 과실이 큰 중과실이 있으므로 Y는 제3자인 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 또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제 2설에 따르면 선의에 관한 의미를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의 의미로 해석하여, 하자있는 어음행위를 취소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X는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X는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자 있는 어음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설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하여 어음소지인X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은 어음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해 인적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사례에서 X는 Y를 해할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Y는 X에게 어떠한 항변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악의의 항변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악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시기는 어음을 취득 한 때에 결정되며 위 사례에서 어음소지인X는 서완석 교수에게 어음을 교부받을 때에 항변이 절단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 및 어떠한 경위로 어음이 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으므로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Conclusion.
위 사례에서 어음소지인X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Y는 어음소지인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즉 어음행위의 있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음의 유통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음행위에 있어서 그 거래의 안정성도 중요하므로 ‘중과실’이 있는 제3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X가 어음발행인Y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X는 서완석교수가 평소에 어음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음행위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어음소지인X는 어음수취인A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진위여부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음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무지한 경우가 많다. 설령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어음면상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완전하게 충족되어 있으므로, 어음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음행위시 어음이 진의의 의사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비진의 의사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과실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X가 경과실에 해당하면 선의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 107조 2항에 의해 Y는 항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설출판사, 1996
먼저 제1설에 따르면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고 경과실도 없는”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X는 평소 서완석교수가 어음거래를 잘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X는 경과실이 아닌 그보다 과실이 큰 중과실이 있으므로 Y는 제3자인 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 또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제 2설에 따르면 선의에 관한 의미를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의 의미로 해석하여, 하자있는 어음행위를 취소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X는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X는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자 있는 어음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설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하여 어음소지인X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은 어음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해 인적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사례에서 X는 Y를 해할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Y는 X에게 어떠한 항변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악의의 항변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악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시기는 어음을 취득 한 때에 결정되며 위 사례에서 어음소지인X는 서완석 교수에게 어음을 교부받을 때에 항변이 절단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 및 어떠한 경위로 어음이 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으므로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Conclusion.
위 사례에서 어음소지인X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Y는 어음소지인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즉 어음행위의 있어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어음의 유통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음행위에 있어서 그 거래의 안정성도 중요하므로 ‘중과실’이 있는 제3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어음소지인X가 어음발행인Y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X는 서완석교수가 평소에 어음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음행위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어음소지인X는 어음수취인A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진위여부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음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무지한 경우가 많다. 설령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어음면상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완전하게 충족되어 있으므로, 어음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음행위시 어음이 진의의 의사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비진의 의사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과실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X가 경과실에 해당하면 선의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 107조 2항에 의해 Y는 항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설출판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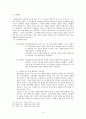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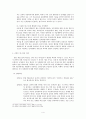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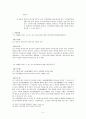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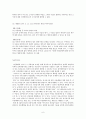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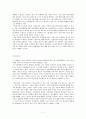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