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입장이 있는 게 사실이나, 반대로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부의 축적을 이상으로 한 평민적 현실관의 입장이라 해도 놀부와 같은 악덕 치부 행위가 찬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흥부와 놀부의 성격과 행동이 대립, 상반의 관계에 있어 흥부의 무능이 부정됨에 따라 놀부의 적극성이 긍정되고 있다는 논리는 이 작품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 질서와 도덕률을 중시하고 이를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한 타당성을 잃고 만다.
흥부는 긍정적 인물이고 놀부는 부정의 대상이라는 전제 밑에 작자의 관점과 현실 인식의 태도를 살피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웃음의 질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소론이 작품 평가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작품에 나타난 웃음의 성격 규명은 작품 생성의 동기에서 혹은 형상화의 경로에서 또는 문학적 효용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병폐, 추악한 인간성을 통렬하게 공격하여 웃음을 통하여 교정, 교화하려는 풍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대외적 목적이 없는 해학과 구분된다.
풍자와 해학을 구별할 때 비판 정신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가 문제된다. 비판이 부정적인 판단에 이르면 풍자가 되고 긍정에 이르면 해학이 된다. <흥부전>의 웃음이 풍자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현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고정화하고 있느냐가 천명되어야 할 것이고, 악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선으로 인식되는 작자의 긍정적 태도 여부가 해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풍자는 악을 공격하는 방편이나 놀부의 과장된 악에 대한 공격 그 자체가 흥부의 선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법이 될 수 있고, 흥부의 표면적인 결함에 대한 폭로 등은 작자의의 대상에 대한 친애의 역설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 풍자가 논리적 측면에서는 사악에 대한 공격, 부정의 한 양식이지만, 감정의 측면에서는 분노의 문학이고 증오의 문학이다. 그 분노가 격하면 격할수록 풍자의 강도가 있기 마련이고, 이 격정이 형상화의 노력 속에서 풍자의 효과가 생성된 것이다.
부정이 긍정과 상호 연계성을 갖는 것처럼 분노나 증오가 애정의 부정적 표현이라는 심리적 측면도 인정된다.
“흥뷔 하릴업셔 질방거러 쥬니 놀부 짊어지고 가며 화초을 생각하여 화초 〃 〃 〃 며 가더니 개천 건너 뛰다가 이져바리고 생각되 간 초인가 하며 집으로 오니\"(京板, p.18)
흥부의 집에서 화초장을 빼앗아 지고 가는 놀부의 탐욕이 증오의 대상이나 그의 우졸한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풍자문학은 형상적으로 부정의 문학이지만 작자가 추구하는 것은 긍정이다. 작자의 긍정 곧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장해 요인을 적발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풍자문학이라 할 수 있다. 작자는 그의 이상 추구에 모순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를 시정하려 한다.
그렇다면 <흥부전>의 작자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해명됨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면모가 확인될 것이다. <흥부전>은 봉건적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대체되던 시기의 사회를 현실로 인식하고, 이를 병적으로 유도한 놀부를 부정하여 공동체의 윤리와 연대감을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적응을 이상으로 한 작품이다.
이익 사회적 가치 체계, 화폐와 물질이 도덕에 앞선 가치로 추구되면서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로 창출되는 수요가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총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관점과 달리 검소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이라는 최소한의 틀에 맞추어 버린 중세적 유교 정신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침체의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을 경시하고 경제활동을 천시한 지도적 양반계층이 염원하고 있었던 건 유교적 계급주의였다.
이렇듯 양반이 경제활동을 천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는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촌 공동체의 질서와 융화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질서와 규범의 파괴자 놀부와 같은 인간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윤리는 효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유교의 계급주의 교민역속(敎民易俗) 등 민풍 확립을 위한 향약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의 이윤 추구성이 악으로 간주되고, 소극적인 근검절약과 신분에 따른 소비의 억제 등 중세 양반 지도층의 이와 같은 복고주의가 긍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흥부 안해 는 말이 애고 여봅쇼 부졀업시 청렴마오 안재 단표 쥬린 염치 십조사하였고 백이숙제 쥬린 염치 청루쇼년 우어시니 부졀업신 청렴 말고져 자식덜 굼겨 죽이게시니 아자반네 집 가서 이 되나 벼가 되나 어더옵쇼”(京板, p.4).
흥부 아내의 입을 통해 흥부의 무능한 청렴이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흥부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는 이미 비생산적이고 무기력한 인물이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놀부는 단순히 구시대의 윤리 규범이나 집단적 질서의 파괴자로서만 지탄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탐욕과 불량한 치부 행위 때문에 선량하게 살려 한 흥부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로 인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놀부가 흥부의 가족을 내쫓는 사건을 살펴보자.
“놀부 심새 무지여 부모 성젼 분재젼답을 홀노 차지하고 흥부갓치 어진 동생을 구박하여 건너 언덕 밋해 내떠리고 가며 조롱하고 드러가며 비양니 엇지아니 무지리”(京板, p.1).
여기에서 놀부의 이익 추구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돈의 축적을 위해서 정제(政祭)의 도리도 어기고 조선(祖先)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족 의식조차 저버린 위인이다.
공동체의 유대는 보통 혈연에 의해서 얽힌 가족 성원이 가장의 통제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에서 유지된다. 놀부는 유산을 아우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 점은 고려 이후의 상속제도가 용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노비로서 양반을 모칭(冒稱)한 전력을 갖고 있다.
“샹젼을 모르고 거만니 져런 놈은 매로 쳐
흥부와 놀부의 성격과 행동이 대립, 상반의 관계에 있어 흥부의 무능이 부정됨에 따라 놀부의 적극성이 긍정되고 있다는 논리는 이 작품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 질서와 도덕률을 중시하고 이를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한 타당성을 잃고 만다.
흥부는 긍정적 인물이고 놀부는 부정의 대상이라는 전제 밑에 작자의 관점과 현실 인식의 태도를 살피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웃음의 질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소론이 작품 평가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작품에 나타난 웃음의 성격 규명은 작품 생성의 동기에서 혹은 형상화의 경로에서 또는 문학적 효용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병폐, 추악한 인간성을 통렬하게 공격하여 웃음을 통하여 교정, 교화하려는 풍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대외적 목적이 없는 해학과 구분된다.
풍자와 해학을 구별할 때 비판 정신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이가 문제된다. 비판이 부정적인 판단에 이르면 풍자가 되고 긍정에 이르면 해학이 된다. <흥부전>의 웃음이 풍자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현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고정화하고 있느냐가 천명되어야 할 것이고, 악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선으로 인식되는 작자의 긍정적 태도 여부가 해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풍자는 악을 공격하는 방편이나 놀부의 과장된 악에 대한 공격 그 자체가 흥부의 선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법이 될 수 있고, 흥부의 표면적인 결함에 대한 폭로 등은 작자의의 대상에 대한 친애의 역설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 풍자가 논리적 측면에서는 사악에 대한 공격, 부정의 한 양식이지만, 감정의 측면에서는 분노의 문학이고 증오의 문학이다. 그 분노가 격하면 격할수록 풍자의 강도가 있기 마련이고, 이 격정이 형상화의 노력 속에서 풍자의 효과가 생성된 것이다.
부정이 긍정과 상호 연계성을 갖는 것처럼 분노나 증오가 애정의 부정적 표현이라는 심리적 측면도 인정된다.
“흥뷔 하릴업셔 질방거러 쥬니 놀부 짊어지고 가며 화초을 생각하여 화초 〃 〃 〃 며 가더니 개천 건너 뛰다가 이져바리고 생각되 간 초인가 하며 집으로 오니\"(京板, p.18)
흥부의 집에서 화초장을 빼앗아 지고 가는 놀부의 탐욕이 증오의 대상이나 그의 우졸한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풍자문학은 형상적으로 부정의 문학이지만 작자가 추구하는 것은 긍정이다. 작자의 긍정 곧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장해 요인을 적발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풍자문학이라 할 수 있다. 작자는 그의 이상 추구에 모순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를 시정하려 한다.
그렇다면 <흥부전>의 작자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해명됨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면모가 확인될 것이다. <흥부전>은 봉건적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대체되던 시기의 사회를 현실로 인식하고, 이를 병적으로 유도한 놀부를 부정하여 공동체의 윤리와 연대감을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적응을 이상으로 한 작품이다.
이익 사회적 가치 체계, 화폐와 물질이 도덕에 앞선 가치로 추구되면서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로 창출되는 수요가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총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관점과 달리 검소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이라는 최소한의 틀에 맞추어 버린 중세적 유교 정신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침체의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산업을 경시하고 경제활동을 천시한 지도적 양반계층이 염원하고 있었던 건 유교적 계급주의였다.
이렇듯 양반이 경제활동을 천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는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촌 공동체의 질서와 융화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질서와 규범의 파괴자 놀부와 같은 인간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윤리는 효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유교의 계급주의 교민역속(敎民易俗) 등 민풍 확립을 위한 향약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의 이윤 추구성이 악으로 간주되고, 소극적인 근검절약과 신분에 따른 소비의 억제 등 중세 양반 지도층의 이와 같은 복고주의가 긍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흥부 안해 는 말이 애고 여봅쇼 부졀업시 청렴마오 안재 단표 쥬린 염치 십조사하였고 백이숙제 쥬린 염치 청루쇼년 우어시니 부졀업신 청렴 말고져 자식덜 굼겨 죽이게시니 아자반네 집 가서 이 되나 벼가 되나 어더옵쇼”(京板, p.4).
흥부 아내의 입을 통해 흥부의 무능한 청렴이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흥부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는 이미 비생산적이고 무기력한 인물이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놀부는 단순히 구시대의 윤리 규범이나 집단적 질서의 파괴자로서만 지탄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탐욕과 불량한 치부 행위 때문에 선량하게 살려 한 흥부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로 인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놀부가 흥부의 가족을 내쫓는 사건을 살펴보자.
“놀부 심새 무지여 부모 성젼 분재젼답을 홀노 차지하고 흥부갓치 어진 동생을 구박하여 건너 언덕 밋해 내떠리고 가며 조롱하고 드러가며 비양니 엇지아니 무지리”(京板, p.1).
여기에서 놀부의 이익 추구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돈의 축적을 위해서 정제(政祭)의 도리도 어기고 조선(祖先)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족 의식조차 저버린 위인이다.
공동체의 유대는 보통 혈연에 의해서 얽힌 가족 성원이 가장의 통제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하는 관계에서 유지된다. 놀부는 유산을 아우에게도 나누어주지 않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 점은 고려 이후의 상속제도가 용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노비로서 양반을 모칭(冒稱)한 전력을 갖고 있다.
“샹젼을 모르고 거만니 져런 놈은 매로 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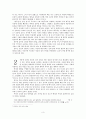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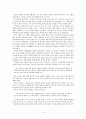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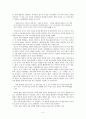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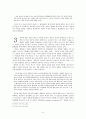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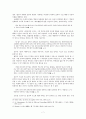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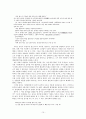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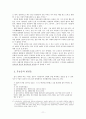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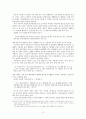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