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종전에는 이러한 필수공익사업 대한 강제중재를 인정했으나 이는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의해서 2006년에 새로 도입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고용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일부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 및 폐지될 경우에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적 안전 및 공둥의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파업비용을 감소와 공익을 위해서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및 대상자와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혹은 그 일방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과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대체고용제도 역시 파업비용을 감소와 공익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대체근로를 파업참가 근로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가경제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체근로는 쟁위행위 기간중에만 가능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엘림, 윤예림 공저,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연합뉴스, ‘<초점(焦點)> 「무노동 부분임금」 재연(再燃)의 배경’, 1993. 06. 22
※ 참고문헌
· 김엘림, 윤예림 공저,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연합뉴스, ‘<초점(焦點)> 「무노동 부분임금」 재연(再燃)의 배경’, 1993.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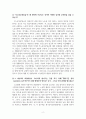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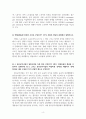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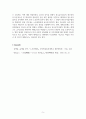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