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음 갔을 때 역에서 내려 이곳 저곳을 다녀보면서 천천히 그 도시의 윤곽을 익혀간다. 처음부터 역 주변의 모든 길을 샅샅이 알아 가면서 그 도시 전체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역 주변의 작은 골목이 어떻게 생겼건 상관 않고 대로를 따라 이리 저리 다니다 보면 중앙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중앙로를 따라 좀 더 작은 길을 알게 되고 또 이 작은 길을 따라 가다보면 샛길도 알아 나중엔 택시 기사가 되어도 좋을 만큼 길을 훤히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익히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들면 누구나 제풀에 지치게 되고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한 번쯤 해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힘든 일은 기피하게 된다.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십 년을 해야 할 것인데 어릴 때부터 지치게 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익히고 내일은 반드시 잊어버려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많은 교육자들과는 다른 발상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컸다.
나는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그래서 각종 교외(校外) 경시대회를 이런 추억 만들기에 활용했다. 교외 경시대회에 아이들을 따라간 것은 물론 흔하디 흔한 어린이 그림대회에도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갔다. 읍내 어린이 그림대회는 물론 군(郡)대회, 시(市)대회, 그리고 포항 MBC가 주최하는 동해지구 어린이 그림대회에도 단골 손님이 되다시피 한 해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가 다섯이니 누가 가도 꼭 한 아이는 이런 대회에 나갔으니 남이 보기엔 무슨 대회 관계자 같았을 것이다. 그 날은 우리 식구가 모두 소풍가는 날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사가곤 하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던 동생들도 꼭 따라갔고 휴일이면 모두 가기를 즐겼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시와 시조를 줄줄 외우고 다녔다. 그 중에서도 이은상 선생님의 ‘가고파’란 시를 특히 좋아했다. 시조 몇 수도 멋있게(?) 외우고 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시를 좋아하면서도 한 수의 시도 제대로 지어보지는 못했다. 애는 많이 써 보았다. 그런데도 지어놓고 보면 ‘시’가 아니었다. 그래서 시인을 가장 존경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래 전에 대교육자이자 아동문학가이신 이오덕 선생님이 쓰신 ‘일하는 아이들’이란 책을 친구로부터 선물 받아 읽어보고는 시(詩)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로이 들었고 어쩌면 나도 시를 쓸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늦게 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시 몇 편을 같이 썼다. 여기 아들과 함께 쓴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시인지 장난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시(?)를 지으면서 그럴 수 없이 행복했고 아들도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아들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덥더라. 하늘엔 해 뿐이더라”고 말했다. 아들은 온몸에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날은 과연 더운 날이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의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의 그 말 때문이었다. 덥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적어도 나는 아들의 이 말을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을 얼음 같은 지하수로 목욕시키고 시원한 방바닥에 누워서 아들과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여름 매미 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메웠다. 제목은 ‘한여름’ 우리는 이렇게 시를 썼다.
한여름
해는 하늘을 다 차지하고
우리 동네는
매미 소리가 다 차지했다.
이 석 줄이 우리가 지은 시의 전부다. 그러나 나는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시를 사랑하고 올해 대학(서울의대 예과 1년)에 들어간 아들도 아빠와 같이 쓴 이 시를 되뇌며 행복해 하고 있다.
다음의 이 시도 어느 가을날 아들과 같이 쓴 시다.
가을 마당 소야 니는 심심해서 우예 노노?
우리는 심심하면 테레비 본다
소야 니는 우리가 테레비가?
그래 이 놈아
소 텔레비전도 너거고
할매 텔레비전도 너거다
할머니 말씀
이것이 시가 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들과 함께 쓴 이 시들을 아직까지도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보다 더 좋아한다.
복습보다도 예습이 효과적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학교 수업만큼 중요한 일이 학생에게 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모는 엉뚱하게 과외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 원인을 나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무조건 여러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며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인가.
나의 결론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습은 공부를 다 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음날 수업 중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공부할 내용 가운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깨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체크(check)해 가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을 미리 공부해 가라는 ‘예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안이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혼자 배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남의 말 몇 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 것을 온종일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해 가라는 말 대신 내일 배울 부분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check)해 가라는 말로 바꾸었다. 적어도 “네가 성적을 올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일러주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공부할 어려운 것들을 체크해 가는 것이 나중 시험기간에 밤샘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나의 비교우위론(?)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성적이 좀 좋았던 것은 이 예습이 한몫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끝)●
나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익히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들면 누구나 제풀에 지치게 되고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한 번쯤 해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힘든 일은 기피하게 된다.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십 년을 해야 할 것인데 어릴 때부터 지치게 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익히고 내일은 반드시 잊어버려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많은 교육자들과는 다른 발상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컸다.
나는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그래서 각종 교외(校外) 경시대회를 이런 추억 만들기에 활용했다. 교외 경시대회에 아이들을 따라간 것은 물론 흔하디 흔한 어린이 그림대회에도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갔다. 읍내 어린이 그림대회는 물론 군(郡)대회, 시(市)대회, 그리고 포항 MBC가 주최하는 동해지구 어린이 그림대회에도 단골 손님이 되다시피 한 해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가 다섯이니 누가 가도 꼭 한 아이는 이런 대회에 나갔으니 남이 보기엔 무슨 대회 관계자 같았을 것이다. 그 날은 우리 식구가 모두 소풍가는 날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사가곤 하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던 동생들도 꼭 따라갔고 휴일이면 모두 가기를 즐겼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시와 시조를 줄줄 외우고 다녔다. 그 중에서도 이은상 선생님의 ‘가고파’란 시를 특히 좋아했다. 시조 몇 수도 멋있게(?) 외우고 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시를 좋아하면서도 한 수의 시도 제대로 지어보지는 못했다. 애는 많이 써 보았다. 그런데도 지어놓고 보면 ‘시’가 아니었다. 그래서 시인을 가장 존경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래 전에 대교육자이자 아동문학가이신 이오덕 선생님이 쓰신 ‘일하는 아이들’이란 책을 친구로부터 선물 받아 읽어보고는 시(詩)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로이 들었고 어쩌면 나도 시를 쓸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늦게 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시 몇 편을 같이 썼다. 여기 아들과 함께 쓴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시인지 장난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시(?)를 지으면서 그럴 수 없이 행복했고 아들도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아들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덥더라. 하늘엔 해 뿐이더라”고 말했다. 아들은 온몸에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날은 과연 더운 날이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의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의 그 말 때문이었다. 덥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적어도 나는 아들의 이 말을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을 얼음 같은 지하수로 목욕시키고 시원한 방바닥에 누워서 아들과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여름 매미 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메웠다. 제목은 ‘한여름’ 우리는 이렇게 시를 썼다.
한여름
해는 하늘을 다 차지하고
우리 동네는
매미 소리가 다 차지했다.
이 석 줄이 우리가 지은 시의 전부다. 그러나 나는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시를 사랑하고 올해 대학(서울의대 예과 1년)에 들어간 아들도 아빠와 같이 쓴 이 시를 되뇌며 행복해 하고 있다.
다음의 이 시도 어느 가을날 아들과 같이 쓴 시다.
가을 마당 소야 니는 심심해서 우예 노노?
우리는 심심하면 테레비 본다
소야 니는 우리가 테레비가?
그래 이 놈아
소 텔레비전도 너거고
할매 텔레비전도 너거다
할머니 말씀
이것이 시가 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들과 함께 쓴 이 시들을 아직까지도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보다 더 좋아한다.
복습보다도 예습이 효과적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학교 수업만큼 중요한 일이 학생에게 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모는 엉뚱하게 과외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 원인을 나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무조건 여러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며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인가.
나의 결론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습은 공부를 다 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음날 수업 중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공부할 내용 가운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깨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체크(check)해 가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을 미리 공부해 가라는 ‘예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안이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혼자 배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남의 말 몇 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 것을 온종일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해 가라는 말 대신 내일 배울 부분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check)해 가라는 말로 바꾸었다. 적어도 “네가 성적을 올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일러주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공부할 어려운 것들을 체크해 가는 것이 나중 시험기간에 밤샘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나의 비교우위론(?)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성적이 좀 좋았던 것은 이 예습이 한몫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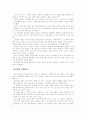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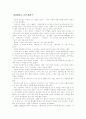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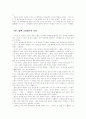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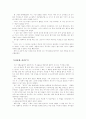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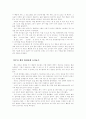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