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언어 문제의 본질
3. 언어 문제의 해결 방법 - 파사와 현정
⑴ 파사즉현정의 경우
⑵ 현정즉파사의 경우
4. 화두(話頭)를 통한 파사현정의 실현
⑴ 화두란 무엇인가
⑵ 화두에서의 파사와 현정
5. 좋은 선학을 위하여
2. 언어 문제의 본질
3. 언어 문제의 해결 방법 - 파사와 현정
⑴ 파사즉현정의 경우
⑵ 현정즉파사의 경우
4. 화두(話頭)를 통한 파사현정의 실현
⑴ 화두란 무엇인가
⑵ 화두에서의 파사와 현정
5. 좋은 선학을 위하여
본문내용
깨달음은 말 아래[언하]의 깨달음이다.
선원(선원)에서 스승이 학인을 지도하는 경우는 주로 두 경우가 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행하는 시중(시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상당설법(상당설법)이 하나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별적 문답을 통한 가르침이 하나이다. 시중은 주로 올바른 지견(지견)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치에 맞게 설득하거나 잘못된 공부에 대한 비판이 그 내용을 이루며[설명서],
) 시중이 때로 경전(經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른 지견을 설명하고 잘못된 공부를 비판하는 비교적 긴 설법(說法)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교학적 체계적 이론인 것은 아니다. 시중이건 개별문답이건 목적은 오로지 견성(見性)의 체험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설법(對衆說法)이라하더라도 설명의 이론적 완결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직설(直說)과 은유(隱喩)를 섞고 경전(經典)과 예화(例話)를 인용하며 오직 사견(邪見)을 부수고 정견(正見)으로 이끄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설명이 경전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이론적 관점이 아닌 체험자 자신의 견처(見處)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개별적 문답은 학인의 물음에 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인심을 직지하거나 학인의 사념(사념)을 부수어주는 예리한 지적이 그 내용을 이룬다[구체적 도구].
따라서 선 공부에서 언어의 쓰임을 정리하면, ①선체험을 묘사하고 설명하여 듣는 사람에게 선체험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고 동일한 체험으로 이끌어 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②화두처럼 언어를 선체험을 가져오는 직접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에 관한 학문적 논의 즉 선학(선학)을 함에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의 본질이 체험이고 선의 언어가 체험으로 이끄는 설명이나 도구라면, 선학도 체험으로 이끄는 효용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선학의 일차적 요건으로 무엇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학은 선의 체험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어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학은 이론적 체계화 보다는 체험적 사실의 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체험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해내야 한다. 그 다음 기술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는 추측이나 가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에 이용하는 이론적 틀은 반드시 교학의 이론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학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만약 파악된 사실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으로 그쳐야지 설명을 위한 설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의 언어가 그렇듯이 선학도 방편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학은 늘 실험적 입장―방편의 입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험에 관한 기술과 설명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떤 설명도 체험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체험과 언어를 설명한 필자의 이 글도 선학으로서 하나의 실험이요 모색이다.
) 참고로 이 글의 실험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오늘날 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살펴본다면, 대강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敎)와 선(禪)의 관계 속에서 선을 교학적 틀 속에서 혹은 틀을 빌려 해석하는 경우로서, 교의 입장에서 선과의 일치를 주장하는 경우[敎禪一致]와 선의 입장에서 교와의 일치를 주장하는 경우[禪敎一致]의 둘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교를 불어(佛語)로 선을 불심(佛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의 선학이다. 이 선학은 규봉종밀(圭峰宗密)과 보조지눌(普照知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불교철학의 틀 속에서 선을 해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선을 불교철학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② 선어록과 자신의 실천에 근거하여 전통적 교학과는 다른 새로운 선의 이론을 만드는 경우이다. 조선조 말의 선승 백파긍선(白坡亘璇)이 저술한 『선문수경(禪門手鏡)』에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교학에 의지하지 않고 선사들의 설법과 실천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밝히려는 것이므로, 선학(禪學)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나 백파긍선의 경우 조사선(祖師禪)·여래선(如來禪)·의리선(義理禪)이라는 틀 속에서 이론적 체계의 완결성을 추구하다보니 너무나 도식적으로 선을 설명함으로써,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실천적 효용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③ 선의 체험으로서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어떤 학문적 논의도 거부하는 입장으로서, 선방에서 정진하는 납자(衲子)들 사이에 이러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입장은 애초에 선학을 거부하므로 선학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④ 선문답과 화두 등의 선어(禪語)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경우로서, 현대의 선 연구자들 사이에 보이는 태도이다. 이들은 선의 무역사적(無歷史的) 초월적 체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선서(禪書)의 문헌학적 사실이나 선승(禪僧)들의 시대적 사회적 역할과 그 배경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서의 해석이 상식적이고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선어록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은 있지만, 선의 본질인 체험을 무시하고 선을 지식활동(知識活動)의 일종으로 규정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들의 학문은 선학이라기 보다는 선문헌 혹은 선승과 관련한 고증학(考證學)·사회학(社會學)·역사학(歷史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4가지의 입장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시도한 분석은 ②의 입장에서 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필자는 백파와 같은 태도로 선어록과 선의 실천만을 기초로 하여 선을 설명해본 것이지, 『선문수경』에 나타난 백파의 이론을 따른 것은 아니다. 필자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견성(見性)이라는 선의 체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당장 견성으로 이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선과 선공부를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見解)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선원(선원)에서 스승이 학인을 지도하는 경우는 주로 두 경우가 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행하는 시중(시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상당설법(상당설법)이 하나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별적 문답을 통한 가르침이 하나이다. 시중은 주로 올바른 지견(지견)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치에 맞게 설득하거나 잘못된 공부에 대한 비판이 그 내용을 이루며[설명서],
) 시중이 때로 경전(經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른 지견을 설명하고 잘못된 공부를 비판하는 비교적 긴 설법(說法)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교학적 체계적 이론인 것은 아니다. 시중이건 개별문답이건 목적은 오로지 견성(見性)의 체험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설법(對衆說法)이라하더라도 설명의 이론적 완결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직설(直說)과 은유(隱喩)를 섞고 경전(經典)과 예화(例話)를 인용하며 오직 사견(邪見)을 부수고 정견(正見)으로 이끄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설명이 경전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이론적 관점이 아닌 체험자 자신의 견처(見處)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개별적 문답은 학인의 물음에 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인심을 직지하거나 학인의 사념(사념)을 부수어주는 예리한 지적이 그 내용을 이룬다[구체적 도구].
따라서 선 공부에서 언어의 쓰임을 정리하면, ①선체험을 묘사하고 설명하여 듣는 사람에게 선체험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고 동일한 체험으로 이끌어 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②화두처럼 언어를 선체험을 가져오는 직접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에 관한 학문적 논의 즉 선학(선학)을 함에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의 본질이 체험이고 선의 언어가 체험으로 이끄는 설명이나 도구라면, 선학도 체험으로 이끄는 효용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선학의 일차적 요건으로 무엇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학은 선의 체험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어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학은 이론적 체계화 보다는 체험적 사실의 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체험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해내야 한다. 그 다음 기술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는 추측이나 가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에 이용하는 이론적 틀은 반드시 교학의 이론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학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만약 파악된 사실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으로 그쳐야지 설명을 위한 설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의 언어가 그렇듯이 선학도 방편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학은 늘 실험적 입장―방편의 입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험에 관한 기술과 설명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떤 설명도 체험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체험과 언어를 설명한 필자의 이 글도 선학으로서 하나의 실험이요 모색이다.
) 참고로 이 글의 실험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오늘날 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살펴본다면, 대강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敎)와 선(禪)의 관계 속에서 선을 교학적 틀 속에서 혹은 틀을 빌려 해석하는 경우로서, 교의 입장에서 선과의 일치를 주장하는 경우[敎禪一致]와 선의 입장에서 교와의 일치를 주장하는 경우[禪敎一致]의 둘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교를 불어(佛語)로 선을 불심(佛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의 선학이다. 이 선학은 규봉종밀(圭峰宗密)과 보조지눌(普照知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불교철학의 틀 속에서 선을 해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선을 불교철학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② 선어록과 자신의 실천에 근거하여 전통적 교학과는 다른 새로운 선의 이론을 만드는 경우이다. 조선조 말의 선승 백파긍선(白坡亘璇)이 저술한 『선문수경(禪門手鏡)』에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교학에 의지하지 않고 선사들의 설법과 실천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밝히려는 것이므로, 선학(禪學)이라는 명칭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나 백파긍선의 경우 조사선(祖師禪)·여래선(如來禪)·의리선(義理禪)이라는 틀 속에서 이론적 체계의 완결성을 추구하다보니 너무나 도식적으로 선을 설명함으로써,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실천적 효용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③ 선의 체험으로서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어떤 학문적 논의도 거부하는 입장으로서, 선방에서 정진하는 납자(衲子)들 사이에 이러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입장은 애초에 선학을 거부하므로 선학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④ 선문답과 화두 등의 선어(禪語)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경우로서, 현대의 선 연구자들 사이에 보이는 태도이다. 이들은 선의 무역사적(無歷史的) 초월적 체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선서(禪書)의 문헌학적 사실이나 선승(禪僧)들의 시대적 사회적 역할과 그 배경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서의 해석이 상식적이고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선어록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은 있지만, 선의 본질인 체험을 무시하고 선을 지식활동(知識活動)의 일종으로 규정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들의 학문은 선학이라기 보다는 선문헌 혹은 선승과 관련한 고증학(考證學)·사회학(社會學)·역사학(歷史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4가지의 입장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시도한 분석은 ②의 입장에서 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필자는 백파와 같은 태도로 선어록과 선의 실천만을 기초로 하여 선을 설명해본 것이지, 『선문수경』에 나타난 백파의 이론을 따른 것은 아니다. 필자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견성(見性)이라는 선의 체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당장 견성으로 이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선과 선공부를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見解)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추천자료
 [사회대]-한국의 절하는 법과 국제 에티켓
[사회대]-한국의 절하는 법과 국제 에티켓 초등 4학년 영어 4단원 what time is it 세안 지도안
초등 4학년 영어 4단원 what time is it 세안 지도안 (남정현론) 남정현의 소설을 통해 알아본 현실인식
(남정현론) 남정현의 소설을 통해 알아본 현실인식 [예술과 철학] 현대 영화 이론 요약 및 정리 자료
[예술과 철학] 현대 영화 이론 요약 및 정리 자료 [독서감상문] 완두콩
[독서감상문] 완두콩 사교육 경감방안으로서의 EBS 교육방송에 관하여
사교육 경감방안으로서의 EBS 교육방송에 관하여 호모에티쿠스
호모에티쿠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우수 사례 고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우수 사례 고찰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5단원 01 글의 짜임 예상문제
[과외]중학 국어 1-2학기 기말 5단원 01 글의 짜임 예상문제 역사이해
역사이해 [중세][문학][철학][농업][봉건제][중세의 문학][중세의 철학][중세의 농업][중세의 봉건제]...
[중세][문학][철학][농업][봉건제][중세의 문학][중세의 철학][중세의 농업][중세의 봉건제]... 이청준 작가 연구 - 그가 꾸는 말의 꿈
이청준 작가 연구 - 그가 꾸는 말의 꿈 [상징주의미술][서양미술][미술의 기능][미술과 건축][미술과 수학][상징주의 미술의 특징][...
[상징주의미술][서양미술][미술의 기능][미술과 건축][미술과 수학][상징주의 미술의 특징][... [자연과학] 폐렴(pneumonia) [분석/조사]
[자연과학] 폐렴(pneumonia) [분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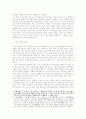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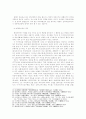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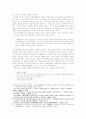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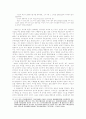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