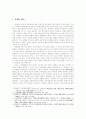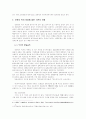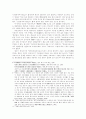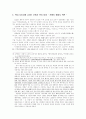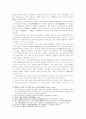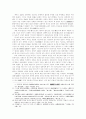목차
1. 문제의 제기
2. 선원사 위치 비정에 대한 기존의 견해
2-1) 지산리 현발굴터
2-2) 선행리 충렬사 앞터
3. 역대 지리지에 나타난 선원사 위치 비정: 선행리 충렬사 뒤편
4. 고려 당대의 기록에 나타난 선원사 위치 비정
4-1) 강화도성의 화산(花山)
4-2) 충렬사 인근
5. 결론 및 향후의 과제
2. 선원사 위치 비정에 대한 기존의 견해
2-1) 지산리 현발굴터
2-2) 선행리 충렬사 앞터
3. 역대 지리지에 나타난 선원사 위치 비정: 선행리 충렬사 뒤편
4. 고려 당대의 기록에 나타난 선원사 위치 비정
4-1) 강화도성의 화산(花山)
4-2) 충렬사 인근
5. 결론 및 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행촌거사 해운당일세
) 岩嶢金壁鎖嵐光 八部龍天信渺茫 獨有小窓堪靜坐 杏村居士海雲堂(李穡, 「重過禪源寺途中望海雲堂」 『牧隱藁』 詩藁 권4; 『韓國文集叢刊』3, 570쪽)
행촌 이암이 선원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선원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위 시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1-3구는 이암이 거처하고 있는 곳과 그 곳에서의 전망을 묘사한 듯 한데 이암의 거처가 강화부 안산인 화산 인근인지, 현발굴지인 지산리 인근인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4구의 행촌(杏村)과 해운당(海雲堂)의 위치가 파악되면 선원사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다.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은 선원면 선행리(仙杏里)다. 자연 이암(李 )의 자호(自號)인 행촌(杏村)
) 杏花가 화산에 피었다는 얘기는 달전 스님의 시에도 보인다. 다만 여기의 화산이 강화부 안산인 화산인지 아니면 지산리의 화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花山하면 강화부 안산인 花山을 의미한다.
花山往事有誰知 今古興亡似奕碁 王輦行街渾作畝 珠簾深巷半成池 斬新楊柳幾多屋 依舊杏花三兩枝 細數盈虛春夢裏 只堪大笑不堪悲(「釋達全, 次韻李正言混花山懷古」 『東文選』 권14)
과 부합된다. 그리고 해운당은 이암이 머물렀던 처소인데 이색이 쓴 이암선생의 묘지명에 의하면 선원사 경내에 있었다. 다음은 묘지명의 일부이다.
선생은 선원사의 식영노인과 더불어 방외의 친구가 되어 절 내에 당을 짓고 당호를 해운당이라 하였다. 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하였는데 선원사에 이르러 식영노인과 도를 논하다 문득 돌아갈 일을 잊어버렸으니 아량이 이와 같았다.
) 與禪源息影老人 爲方外友 築堂寺中 扁曰海雲 扁舟往還 至輒忘歸 盖其雅量如此 杏村其自號也(李穡,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地銘幷序」 『牧隱藁』 文藁 권17; 『韓國文集叢刊』5, 147-148쪽)
행촌 이암과 교분을 나누었던 식영노인은 『동문선』에 글이 실릴 만큼 당대의 뛰어난 고승이었다.
) 행촌과 식영노인의 교분은 及菴 閔思平(1295-1359)의 『及菴詩集』(『韓國文集叢刊』3, 76쪽)에도 나타나 있다. 식영노인은 보각국사 혼수(混修, 1320-1392)가 31세 되던 해 선원사에서 『능엄경』을 가르쳐 주었고(謁息影鑑和尙于禪源 學楞嚴 深得其髓; 權近,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幷序」 『陽村集』 권37; 『韓國文集叢刊』6, 328쪽) 나옹 혜근(1320-1376)에게 배우기도 했다.(一旦去而從懶翁遊 久之似有得也 將有以質之翁而翁逝矣 息庵遑遑焉欲遍走乎諸方; 李崇仁, 「送息庵遊方序」 『東文選』 권88). 東文選』에 실린 식영암의 글로 「劒說」(권97)·「菊坡說」(권97)·「 庵禪翁木苽木杖說」(권97)·「丁侍者傳」(권101)·「聞大駕還國祝上疏」(권111)·「誕生元子祝上疏」(권111)·「星變消除疏」(권111)·「復禪源寺疏」(권111)·「元子上朝祝壽齋疏」(권111)·「聞化平院君承詔上都祝疏」(권111)등이 있다.
이암은 선원사에서 식영노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불경을 사경
) 烏頭容可白 俗眼豈終靑 遙 明窓下 焚香寫佛經 (李穀, 「寄李杏村」 『稼亭集』권 18); 『韓國文集叢刊』3, 210쪽). 이암은 수선사 제13세 국사인 大禪師 覺儼(1270-1355)의 內姪이기도 하다.(內姪杏村侍中 爲今之名宰相; 李達衷, 「高麗覺眞國師碑銘幷序」 『霽亭集』 권3; 『韓國文集叢刊』3, 291쪽)
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해운당에서 배를 타고 선원사를 왔다 갔다 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 맞는 지세는 화산의 남쪽이다. 화산과 혈구산을 따라 내려 온 2개의 물줄기가 선원사를 지나 한줄기로 모아져 강화해협으로 나간다. 선원사가 폐사된 이후 들어선 충렬사도 똑 같은 지형지세다. 그리고 이암이 정좌하고 있는 암벽의 작은 창[小窓]과 해운당은 옆으로 누운 Y자 위편에 자리하고 있으니 바로 화산의 남록이다.
이상 이색의 시 1-3구는 해운당이 위치한 화산과 해운당에서 바라본 전망을 음었으며, 4구는 해운당의 위치가 선원사
) 선원사의 지형지세를 「禪源寺淸遠樓」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不費登攀自 然 四郊爲圃海爲川 蒲帆朝過有情吹 棟晩生何處煙 野抱山還山抱野 天呑水亦水呑天 般般形勝誰家具 榧兀明窓有 禪(釋達全, 『東文選』 권14)
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색의 시와 이암의 묘지명의 내용은 앞서 향토사가들이 충렬사 인근을 선원사지라고 주장할 때 제시했던 문헌사료이다. 3장과 4-1)절에서 선원사의 위치를 충렬사 뒤편으로 비정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색의 시와 이암묘지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았다.
4. 결론 및 향후의 과제
선원사의 위치에 대해서 그간 현발굴터라는 견해와 충렬사 인근이라는 설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다. 현발굴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문헌검토를 소홀히 했고, 충렬사 앞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고려 당대의 기록을 소홀히 하였다. 본고는 역대 지리서에 대한 분석과 고려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 선원사의 위치를 비정해 보았다. 그래서 선원사는 강화도성의 화산 남쪽인 충렬사 인근, 더 구체적으로 충렬사 뒤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충렬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문헌의 입장에서 충렬사 일대를 선원사지로 비정해 보았지만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고학적 입장에서 선원사의 위치가 비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고를 작성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한 간략한 조사 결과 불타서 녹아내려 뭉그러진 기와, 구들장 및 고임돌, 청자편, 다듬은 돌 등을 다수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현발굴지의 성격을 선원사지로만 규정하여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 아니라 강화도성의 편제라는 큰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가궐터에서 대불정오성도량이 열렸기 때문에 가궐에 절의 요소가 가미될 수 있고, 아니면 절터라면 가궐과 사찰의 조영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려대장경을 조판한 선원사지의 위치 비정문제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판당이나 판본의 문제, 해인사로 이송된 경위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제문제들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岩嶢金壁鎖嵐光 八部龍天信渺茫 獨有小窓堪靜坐 杏村居士海雲堂(李穡, 「重過禪源寺途中望海雲堂」 『牧隱藁』 詩藁 권4; 『韓國文集叢刊』3, 570쪽)
행촌 이암이 선원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선원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위 시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1-3구는 이암이 거처하고 있는 곳과 그 곳에서의 전망을 묘사한 듯 한데 이암의 거처가 강화부 안산인 화산 인근인지, 현발굴지인 지산리 인근인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4구의 행촌(杏村)과 해운당(海雲堂)의 위치가 파악되면 선원사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다.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은 선원면 선행리(仙杏里)다. 자연 이암(李 )의 자호(自號)인 행촌(杏村)
) 杏花가 화산에 피었다는 얘기는 달전 스님의 시에도 보인다. 다만 여기의 화산이 강화부 안산인 화산인지 아니면 지산리의 화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花山하면 강화부 안산인 花山을 의미한다.
花山往事有誰知 今古興亡似奕碁 王輦行街渾作畝 珠簾深巷半成池 斬新楊柳幾多屋 依舊杏花三兩枝 細數盈虛春夢裏 只堪大笑不堪悲(「釋達全, 次韻李正言混花山懷古」 『東文選』 권14)
과 부합된다. 그리고 해운당은 이암이 머물렀던 처소인데 이색이 쓴 이암선생의 묘지명에 의하면 선원사 경내에 있었다. 다음은 묘지명의 일부이다.
선생은 선원사의 식영노인과 더불어 방외의 친구가 되어 절 내에 당을 짓고 당호를 해운당이라 하였다. 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하였는데 선원사에 이르러 식영노인과 도를 논하다 문득 돌아갈 일을 잊어버렸으니 아량이 이와 같았다.
) 與禪源息影老人 爲方外友 築堂寺中 扁曰海雲 扁舟往還 至輒忘歸 盖其雅量如此 杏村其自號也(李穡,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地銘幷序」 『牧隱藁』 文藁 권17; 『韓國文集叢刊』5, 147-148쪽)
행촌 이암과 교분을 나누었던 식영노인은 『동문선』에 글이 실릴 만큼 당대의 뛰어난 고승이었다.
) 행촌과 식영노인의 교분은 及菴 閔思平(1295-1359)의 『及菴詩集』(『韓國文集叢刊』3, 76쪽)에도 나타나 있다. 식영노인은 보각국사 혼수(混修, 1320-1392)가 31세 되던 해 선원사에서 『능엄경』을 가르쳐 주었고(謁息影鑑和尙于禪源 學楞嚴 深得其髓; 權近,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幷序」 『陽村集』 권37; 『韓國文集叢刊』6, 328쪽) 나옹 혜근(1320-1376)에게 배우기도 했다.(一旦去而從懶翁遊 久之似有得也 將有以質之翁而翁逝矣 息庵遑遑焉欲遍走乎諸方; 李崇仁, 「送息庵遊方序」 『東文選』 권88). 東文選』에 실린 식영암의 글로 「劒說」(권97)·「菊坡說」(권97)·「 庵禪翁木苽木杖說」(권97)·「丁侍者傳」(권101)·「聞大駕還國祝上疏」(권111)·「誕生元子祝上疏」(권111)·「星變消除疏」(권111)·「復禪源寺疏」(권111)·「元子上朝祝壽齋疏」(권111)·「聞化平院君承詔上都祝疏」(권111)등이 있다.
이암은 선원사에서 식영노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불경을 사경
) 烏頭容可白 俗眼豈終靑 遙 明窓下 焚香寫佛經 (李穀, 「寄李杏村」 『稼亭集』권 18); 『韓國文集叢刊』3, 210쪽). 이암은 수선사 제13세 국사인 大禪師 覺儼(1270-1355)의 內姪이기도 하다.(內姪杏村侍中 爲今之名宰相; 李達衷, 「高麗覺眞國師碑銘幷序」 『霽亭集』 권3; 『韓國文集叢刊』3, 291쪽)
하기도 하였다. 이암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해운당에서 배를 타고 선원사를 왔다 갔다 했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 맞는 지세는 화산의 남쪽이다. 화산과 혈구산을 따라 내려 온 2개의 물줄기가 선원사를 지나 한줄기로 모아져 강화해협으로 나간다. 선원사가 폐사된 이후 들어선 충렬사도 똑 같은 지형지세다. 그리고 이암이 정좌하고 있는 암벽의 작은 창[小窓]과 해운당은 옆으로 누운 Y자 위편에 자리하고 있으니 바로 화산의 남록이다.
이상 이색의 시 1-3구는 해운당이 위치한 화산과 해운당에서 바라본 전망을 음었으며, 4구는 해운당의 위치가 선원사
) 선원사의 지형지세를 「禪源寺淸遠樓」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不費登攀自 然 四郊爲圃海爲川 蒲帆朝過有情吹 棟晩生何處煙 野抱山還山抱野 天呑水亦水呑天 般般形勝誰家具 榧兀明窓有 禪(釋達全, 『東文選』 권14)
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색의 시와 이암의 묘지명의 내용은 앞서 향토사가들이 충렬사 인근을 선원사지라고 주장할 때 제시했던 문헌사료이다. 3장과 4-1)절에서 선원사의 위치를 충렬사 뒤편으로 비정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색의 시와 이암묘지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았다.
4. 결론 및 향후의 과제
선원사의 위치에 대해서 그간 현발굴터라는 견해와 충렬사 인근이라는 설이 꾸준히 대립되어 왔다. 현발굴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문헌검토를 소홀히 했고, 충렬사 앞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고려 당대의 기록을 소홀히 하였다. 본고는 역대 지리서에 대한 분석과 고려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 선원사의 위치를 비정해 보았다. 그래서 선원사는 강화도성의 화산 남쪽인 충렬사 인근, 더 구체적으로 충렬사 뒤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충렬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문헌의 입장에서 충렬사 일대를 선원사지로 비정해 보았지만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고학적 입장에서 선원사의 위치가 비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고를 작성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한 간략한 조사 결과 불타서 녹아내려 뭉그러진 기와, 구들장 및 고임돌, 청자편, 다듬은 돌 등을 다수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현발굴지의 성격을 선원사지로만 규정하여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 아니라 강화도성의 편제라는 큰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가궐터에서 대불정오성도량이 열렸기 때문에 가궐에 절의 요소가 가미될 수 있고, 아니면 절터라면 가궐과 사찰의 조영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려대장경을 조판한 선원사지의 위치 비정문제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판당이나 판본의 문제, 해인사로 이송된 경위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제문제들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